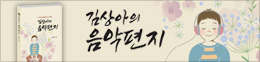엄마는 31살에 내가 돌도 안 되던 해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밥그릇 하나라도 줄이라”는 삼촌의 뜻에 쫓아 언니를 일찍 시집보내곤 철모르는 우리 3남매를 데리고 시골에서 아글타글 고된 일을 하시면서 눈물겨운 나날을 보내었다.
세월이 흘러 1957년 큰 오빠가 연변1중에 입학하였다. 학비와 숙사비도 마련해야 했지만 이불도 큰 문제꺼리였다. 우리집 형편에서 새 이불을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엄마는 말없이 이불 한 채를 뜯어 씻고 끓이고 바래워* 다듬질하였다. 방치돌*에 두드리고 대명대*에 담아 다듬은 덕분인지 눈같이 하얀 이불은 웃었다.
오빠는 엄마의 정성이 슴배인* 이불짐을 지고 도시로 떠났다. 집에는 이불 한 채만 달랑 남았다. 둘째오빠와 나, 엄마, 우리 셋은 이불 한 채에 발을 넣고 서로 변두리에서 자야만 했다. 혹 일요일 큰 오빠가 집에 오는 날이면 우리 집은 활기에 차 넘쳤다. 우리 형제들은 따뜻한 화로불 주위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 감자도 구워먹고 옥수수알도 튀겨먹으면서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큰 오빠의 학교생활이야기에 아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워댔다.

그리곤 이불 하나에 네 식구가 네모서리에서 누워 잤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다. 그래도 우리 남매는 항상 믿고 의지할 엄마가 있어서 좋았고 늘 힘이 되었다. 희미한 등잔불아래 문창지도 윙윙 노래하고 우리도 조잘조잘 웃음꽃을 피워 엄마의 얼굴도 밝았다.
그 시절엔 검은 천으로 바지 하나 해 입자고 해도 가둑나무잎*을 한 가마 삶다가 그물에 흰 광목을 넣어 끓이면 검은 천이 되여 그것으로 옷을 해 입던 시절이라 꽃천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가난한 우리는 근본생각도 못 했고 이불은 더 말할 나위도 못 되었다.
몇 년이 지나갔다. 둘째오빠가 고중에 입학하였다. 고마운 동네분들이 솜표*며 천표*를 가져왔다.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이 고마운 분들의 마음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가마니를 짜서 판 돈으로 새 이불 하나를 더 만들어 큰 오빠에게 주고 큰 오빠의 이불을 또 정성껏 다듬질하여 둘째 오빠에게 주었다. 오빠네들은 이불짐을 메고 장춘으로 용정으로 떠나갔다. 엄마는 억척스레 일했지만 오빠네의 학교식비도 보내기 힘들었다. “가난한집 아이 철이 일찍 든다.”고 오빠들은 담요도 없었지만 투성질 한마디도 없었다.
그 후 큰 오빠의 졸업과 동시에 내가 또 이불짐을 메고 대학교에 갈 차례가 되였다. 엄마의 눈에는 기쁨의 이슬이 맺혔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벌써 너 차례구나. 녀자애는 담요두 있어야겠는데…”하면서 천쪼각들을 무어 보기 좋게 큼직한 담요 하나를 만들어 집의 한 채밖에 없는 이불과 함께 나의 짐을 꾸려주셨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만 혼자서 이불도 없이…”
”“엄만 집이여서 아무거나 걸치고 가마목에서 자면 되지. 큰 오빠두 졸업이니 이젠 좀 나아질 거다. 좀만 더 견디거라.”
나는 “엄마…”하곤 서럽게 소리 내어 흐느끼었다. 나는 보따리를 헤쳐 담요를 꺼내어 기어이 엄마 앞에 밀어놓곤 “엄마의 첫이불”하고 눈물범벅인 얼굴로 해시시 웃어 엄마의 입가에도 웃음이 있었으나 얼굴에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네가 시집갈 땐 모본단이불 두 채를 해주마. 엄만 약속한다.”하시면서 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엄마는 썰렁한 오막살이에서 이불도 없이 담요 하나를 덮고 칠성별*을 시계로 삼으시며 억척스레 일하셨다. 후일 큰 오빠는 북경의 중국과학원에, 둘째 오빠는 성소재 징츼대학교 교수로 나도 고향에서 중학교 고급교사가 되었다.
엄마도 나와 한 모본단이불* 약속을 지켰고 우리 집의 옛말 같은 이불이야기도 막을 내렸다. 나는 지금도 고운 이불을 덮을 때면 엄마의 그 시절 그 아픔을 그려본다.
나는 매번 세탁기에 빨래를 할 때면 한겨울에도 마을 앞 동구 밖의 도랑물에서 방치질 하던 엄마의 방치소리가 들려오는 듯하고 눈물 젖은 엄마의 얼굴… 이불 다듬는 엄마의 방칫돌... 엄마의 대명대… 윤디* 등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참, 오늘은 너무 좋구나..”하면서 웃기도 한다.
연변에서만 쓰이는 낱말 풀이
1. 바래워 : 햇빛에 쪼여 하얗게 색이 바라게 하여
2. 방치돌 : 빨래방망이돌
3. 대명대 : 이불 안 같은 것을 다듬는 도구
4. 슴배인 : 베어든(어머니 정성이 베인)
5. 가둑나무잎 : 떡갈나무, 도토리나무잎
6. 솜표ㆍ천표 :솜과 천을 살 수 있는 표
7. 모본단이불 : 비단이불
8. 칠성별 : 북두칠성
9. 윤디 : 인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