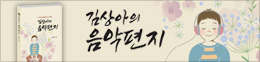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우리문화신문=석화 시인] 설핏 잠들었다가 깨고보니 외로운 등불이 왜 벌써 일어나느냐는듯 나를 빤히 내려다본다. 나는 어지러이 널부러져있는 책들을 보며 픽 웃어버린다. 이게 벌써 한두날도 아니고 거의 한달째 계속되는 일상이다. 자다말다 깨서는 책 보고 보다가는 자고...
그러니까 그게 지난해 12월 12일이였구나. 널 대련에 미술공부시키느라 데려다준 날이 바로 그날이였지. 나는 눈을 집어뜯으며 다시 안경너머로 폰에 저장된 날자를 확인해본다. 네가 없는 이 한달동안 엄마는 너의 방에서 맴돌았단다. 매일 시집들을 찾아 읽고 시도 써보면서. 겨울의 긴긴밤을 지새운적은 그 얼마였던가. 지금도 이 글을 쓰노라니 또 너희들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우리 함께 대학입시를 향해 손잡고 달리던 날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나. 오, 맞다. 네가 고중2학년이 된 다음부터였지.

저녁마다 젊은 청춘에 쏟아지는 잠을 쫓느라 커피를 타 마시기도 하고 그 추운 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기도 하며 넌 그야말로 공부에 온 정력을 쏟고 있었지. 그러는 너를 지켜보다가 난 감기 걸린다고 창문 닫으라고 소리쳤지. 그러면 잠들어 공부 못하면 엄마가 책임지겠는가 하는 너의 날카로운 대답질이 들려오고. 우린 그렇게 서로 신경이 곤두서있었으니깐.
맨날 남들처럼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널 동무하면서 좀 일찍 자라고 잔소리인들 얼마나 했겠니. 그러다가도 내가 오히려 잠들었다가 깨서 보면 항상 넌 불을 켜놓은채로 옹송그린채 새우잠을 자고 있었지. 안스러운 생각에 이불이라도 살며시 덮어주려고 하면 어느새 발딱 일어나 다시 공부에 달려들던 너의 모습
나는 오늘도 네가 쓰던 방을 둘러본다. 벽지에 락서해놓은 공부계획들, 영어단어들, 수학공식들 넌 어릴 때부터 량태머리(갈래머리) 소녀를 그리기 좋아했지. 공부할 때 쓰던 흑판에 지금도 그려져있는 저 량태머리 소녀는 너를 닮았구나.
하긴 너의 오빠방은 더욱 가관이지. 네 오빠가 좋아하는 졸라맨 그림과 그 그림에 어울리는 문구들. 실로 정리되지 않은 개구쟁이 침실 그대로였지.
그리고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 또또의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남겨져있구나.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새 벽지로 갈았을 것이지만 난 이런 우리집이 좋아. 이런 글자들에서, 그림들에서, 락서들에서 너희들 냄새가 나는 걸 이 엄만 느끼거든.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걸 어떡해. 어릴 때부터 난 너희들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싶었고 좀 더 많은걸 알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너희들한테 주는 선물은 책이 많았지.
그 덕에 너희들은 책과 씨름하며 자라야 했고. 언제 봐도 외국이나 외지나 갔다 올 때 나의 짐은 태반이 너희들 책이었지.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 책에 극성이었냐구? 한 가지 비밀을 말해줄게.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사실 엄만 어릴 때 그토록 읽고 싶은 책들을 하나도 읽지 못했어.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공부만 하라고 일체 과외독서를 금지시킨 탓이었지. 난 그게 지금도 속에 내려가지 않거든. 보고 싶은 책을 욕심껏 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이지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라는 걸 이 엄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하긴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책 부럼 없이 보며 자랐지.
아아 이제 벌써 새벽 네시구나. 창밖을 보니 아직도 온통 어둠의 나락이구나. 밤하늘에서는 별 서너 개가 눈을 슴벅슴벅하며 나를 보고 있겠지. 저 별들도 밤새 자지 못해 무척 곤한가봐.
널 두고 떠나오던 날 네가 눈물을 훔치면서 내가 탄 차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꿀쩍거리던 그 모습이 어제처럼 생생한데 벌써 한 달이 흘렀구나. 열일곱 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이 엄마품을 떠난 적 없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사실 이 엄마도 그날 너를 떼여놓고 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널 곁에 끼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겠니? 너도 작은 엄마의 품을 떠나 저 창공을 훨훨 날아예며 너의 꿈을 활짝 펼쳐야 하지 않겠니? 세상은 저렇게 넓고 너를 반겨줄 세상은 그토록 다채롭지 않느냐?
오늘 엄마가 간다. 장춘에서 만나 우리 그동안의 회포를 실컷 풀어보자꾸나.
내 딸 힘내거라! 이 엄만 그렇게 믿고 싶구나. 그리고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승벽심이 강하기로 이름난 이 엄마의 딸이 아니니?
자, 이제 잠간이라도 눈을 붙여야겠구나. 그럼 12시에 만나기로 하고 먼저 필을 놓겠다.
우리 딸 사랑한다.
우리 딸 항상 파이팅!
2017년 1월 12일 새벽 4시 20분을 향해 달려가는 시계바늘을 쥐고
엄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