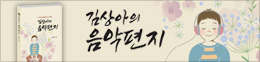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우리문화신문=유광남 작가] 후회가 엄습했다. 늙은 어부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었다. 그냥 화총을 입에 물고 격발 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준사는 처절한 통증을 잊기 위해서는 다시 죽는 방법을 떠올렸다. 하지만 두 팔은 묶여있었고 입에는 혀를 깨물어 자결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 놓았다. 원한다고 자결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적들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네 명의 일본 수병이 나타났다. 그들은 잠시 정신을 차린 준사를 목격하고는 혀를 찼다.
“정신력을 높이 살만하구나. 그러나 깨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준사는 입을 열어서 대꾸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다만 눈빛으로 항의하는 정도였다. 그들은 즉각 준사의 다리에 감겨진 붕대를 들척였다. 그들의 손이 준사의 절단되어 버린 다리에 닿자 엄청난 고통이 뼈마디를 통하여 엄습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아프지만 참아라. 죽는 것보단 낫겠지.”
수병들은 준사의 몸과 다리를 각기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봉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갈고리처럼 생긴 바늘이 너널거리는 살점을 파고들어서 어떤 형식도 없이 피부와 피부를 누비고 다녔다.
“왁!”
준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다시 혼절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통은 멈추지 않고 그의 무의식속에서 지독한 아픔으로 공존했다. 혼미한 준사의 동공위로 애처로운 동공이 하나 더 겹쳐졌다. 준사는 그 눈동자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하다고 느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촉촉하게 젖어 애절하다는 것이었다. 준사는 아득한 적막 속에서 그것의 주인공이 사야가 김충선의 시선임을 기억해 냈다.
“끝났어. 이제.”
“무라야마의 솜씨가 제법이야.”
“돼지곱창을 꿰매던 실력이 어디가나.”
일본 수병들이 준사의 잘려진 다리 봉합을 막 끝냈을 그때, 기괴한 눈빛이 그들의 등 뒤에서 작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고들 했다.”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네 명의 일본 수병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소리쳤다.
“웬 놈이냐?”
“친구를 찾으러 왔다.”
사야가 김충선의 칼이 번개처럼 사선으로 떨어지며 수병 한 명을 어깨부터 가슴까지 내리 베었다. 동시에 그의 발은 다른 수병의 사타구니를 걷어찼으며 빙글 몸을 돌려서 칼을 또 한 명의 수병에 목을 찔러서 관통시켰다.
“끄윽! 억.”
“살려줘.”
세 명을 단 숨에 제압하고 사야가 김충선은 다시 마지막 등을 보이며 달아나려는 남은 수병의 목덜미를 갈로 비스듬히 후려 갈겼다. 핏줄기가 뿜어지면 떨어진 수급이 바닥으로 굴렀다. 실로 빠른 시간에 벌어진 참상이었다. 세 명의 일본 수병은 각기 몸과 목이 분리되거나 목이 관통 되고, 어깨와 가슴이 베어져서 죽었다. 다만 사타구니를 걷어차인 수병만이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다.
“널 죽이지 않은 연유를 아느냐?”
일본 수병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구루시마의 대장선에 적이 침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지만 목전의 사태는 살벌하기 그지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