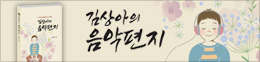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우리문화신문=김영자 작가] “집”이란 가족의 보금자리이고, “집”이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행복의 요람일 것이다. “집”이란 엄마한테선 남편이고 우리에겐 “집”이란 곧 부모이지, 아버지 없는 우리집은 집 기둥이 뭉텅 끊어진 집이어서 쓸쓸한 기운이 꽉 차 있었다한다.
아버지가 온 집안의 병을 혼자 걷어 가지고 저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간 며칠 뒤였단다. 8살짜리 큰오빠가 깍재(갈퀴)로 검불을 끌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허약한 엄마는 연 며칠 울다보니 더욱 수척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란다. 그런데 돌도 채 안 되는 어린 내가 먹구살겠다고 허둥지둥 기어가서 엄마 가슴만 허비더란다. 엄마가 밀치면 또 후둘후둘 기어가선 젖무덤에 매달려 울더라는구나! 엄마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린 것은 울어대고…… 엄마는 기가 막혀 죽그릇을 들고 온 시동생보고 이렇게 말하더란다.
“저앨 한족집에라두 주기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시동생은 억이 막혀 말도 못하였다는구나! 그 뒤 며칠은 시동생만 오면 “애를 데려 가자는 집 없소?”하고 엄마가 자꾸 물었단다.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단다. 아침부터 가을바람에 검은 구름이 막 밀려오고 당장 큰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단다. 큰오빠는 바삐 불 땔나무를 안아 들이느라 분주히 돌아치고 언니는 나에게 죽물을 먹이고 있었단다. 그런데 면목 없는 늙은 아주머니가 시동생과 함께 집에 와서 “애기를 데려가겠으니 이후에 다시 시끄럽게 찾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포대기에 애를 싸더란다.
엄마는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보고만 있더란다. 그 아주머니가 애를 업고 집문을 나서는데 언니는 울면서 “엄마!”를 부르며 막 흔들더란다. 어느새 그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나섰는데 어린 내가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이었던지 포대기 속에서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어대더란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그 처량한 울음소리에 엄마는 와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나 놀라 비칠거리며온 돌을 살펴보곤 문을 박차고 맨발로 뛰쳐나갔단다.
“안 되오, 안 되오, 못 가져가요. 내 아이를…… 새원이, 그 애를 돌려주오.”

이러면서 엄마는 손을 저으며 통곡하시더란다. 삼촌이 돌아보니 그 광경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란다. 엄마는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비칠거리며 통곡하시고 어린 조카들도 엄마 따라 울더란다. 그 아주머닌 뒤를 흘끔 보곤 그냥 돌아서 가려 하는데 삼촌이 길을 막고 돌아서게 하여 그 아주머닌 욕하면서 포대기에서 애를 와락와락 풀어놓곤 “사람을 얼리는가?” 하면서 횡덩그레 문도 안 닫고 가더란다.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에 밀려오던 검은 구름은 후둑후둑 눈물이 되여 뚝뚝 떨어지더란다. 엄마의 울음소리에 하늘도 기가 막혀 울어버리고 말더란다. 늦가을의 쓸쓸한 비눈물은 점점 흐느끼면서 주룩주룩 흘러내리더란다. 하늘은 이렇게 흐느끼면서 눈물을 쏟고 엄마는 나를 품에 껴안은 채 “내가 널 어떻게……” 하시면서 목 놓아 울고 언니 오빠들도 엄마 주위에서 엉엉 울어 버리고…… 삼촌도 멍하니 선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고……
“형수, 내가 잘못했으꾸마. 형님, 내가 형님께 죄를 졌소.”하시면서 꿇어앉더란다. 부연 하늘에선 여전히 슬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세상모르는 나는 엄마 품에서 엄마를 말그럼히 쳐다보곤 그래도 곱게곱게 샐쭉 웃어주더란다. 그 웃음에 엄마도 안도의 숨을 쉬고 언니는 제꺽 나를 받아 업어 주었단다. 그리고 큰 오빠는 죽사발을 찾아 나에게 먹이면서 “야, 많이 먹구 애먹이지 말아라. 엄만 아프시단다.”
그 말에 나는 마치 알기라도 한듯 오빠보고 또 살짝 웃어 엄마가 내 머리를 어루 쓸어주시더란다. 하늘의 쓸쓸한 눈물은 약 한 시간가량 주룩주룩 흐르더니 구름 속에서 붉은 해가 빠끔히 머리를 내밀며 우리집을 비추어 주더란다. 엄마의 병이 나을 때까지 언니는 늘 나를 업고 큰가마 뚜껑에 엎드려 자면서도 나를 늘 자기 잔등에서 내리우지 않더란다. 누가 와서 또 안아라도 갈 가봐……
따스한 햇살은 날마다 문창지를 뚫고 들어와 엄마에게 인사했고 그 햇빛이 약이 되어 엄마도 언니, 오빠도 모두 차츰씩 병이 나아져 정부에선 우리집의 새끼줄경계선을 치우셨단다. 정부에서 파견되어온 위문단도 쌀을 가져오고 마을에서도 한집 한집 매일 우리집을 방문하면서 이일저일 방조해 주더란다.
큰언니와 큰오빠두 오래간만에 책보를 안고 웃음 띤 얼굴로 학교에 갔다는구나! 부러져 비뚤어 가던 우리집은 엄마가 아빠 몫까지 두 몫을 담당하여 일어서기 시작하였단다. 늘 별을 시계로 삼아 일어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정부와 마을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는구나! 나도 언니 오빠들의 사랑 속에서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귀여운 막내둥이로 자라나 큰 오빠는 가끔씩 “요걸 그때 정말 그 집에서 가져 갔더면 어쨌겠니?” 하여 나는 오빠 목에 매달려 응석을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다.
지금도 가을철이면 가끔씩 내리는 궂은비에 엄마가 들려주던 “하늘도 울더란다.”던 그때 이야기는 내 머리에서 메아리친단다. 이렇게 자란 내가 그 뒤 중학교의 고급교원까지 되였구나! 이 모두는 엄마의 사랑의 힘이 아니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