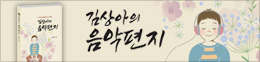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민속음악에 있어서 최고의 미적 가치는 즉흥성이란 이야기, 그런데 악보화 되는 전승과정에서 즉흥성이 배제되기 시작하며 과거와 같은 명인 명창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고향임의 판소리 완창무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완창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력관리, 목청 관리, 전체 사설의 암기, 고저, 장단, 연기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특히 사설의 이면을 살려내는 능력은 오랜 기간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란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는 고수(鼓手)의 역할이 판소리 공연, 특히 완창 발표회의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청중의 호응이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판소리의 완창 공연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완창 이전의 판소리 공연 형태는 대부분이 토막소리였다. 토막소리란 전체가 아닌, 어느 한 부분의 소리를 말한다. 가령, <춘향가>와 같이 긴 이야기 가운데 <적성가> 대목이나, <천자풀이> 대목, <이별가> 대목, <옥중가>나 <박석고개> 대목과 같이 창자가 즐겨 부르는 대목, 또는 객석의 요청에 의해 부르는 한 부분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흔히 한 대목의 소리는 보통 10~20분 이내의 소리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북을 치는 고수도 한 사람이다. 그러나 완창 공연에서는 짧은소리라고 해도 2시간이 넘고, 긴소리는 8시간 이상이 소요되기에 1인의 고수로는 감당이 어려운 것이다.
흔히 명창의 역할은 어렵고, 고수의 역할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리꾼 옆에 앉아서 북만 쳐주면 되는 역할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무대의 바닥 한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장시간 북을 친다는 역할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절대 아니다. 또한, 고수의 역할이란 것이, 장단을 정확하게 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고수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반주 역할이기에 무엇보다도 장단을 ‘정확’하게 쳐야 한다는 점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확’이라는 의미가 계산기나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수치(數値)상의 정확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가령, 여유 있게 뻗고 있는 대목에서 박자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끊어 버리거나, 또는 숨이 다 한 소리를 더 이상 기다리는 정확은 의미가 없는 정확이라 할 것이다. 소리 속을 훤하게 꿰고 있으면서 창자(唱者)의 넘치고 모자라는 부분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융통성 있는 ‘능력상의 정확’이 고수에겐 전제되어야 한다.

오래전 서울에서 열린 스포츠대회 기념 음악회에, 명창 박동진이 국악관현악단의 반주로 <심청가> 한 대목을 불렀다. 무대를 나오며 못마땅해하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수십 명 단원들의 협연보다도 고수 한 사람의 반주가 더 소리하기 편했기 때문이다.
장단의 정확성 못지않게 중요한 조건으로는 강약(强弱)의 조화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통머리를 사정없이 강렬하게 내려쳐야 할 대목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울려 줄 대목인가? 하는 점을 자연스럽게 구별해 주어야 명고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처럼 정확성과 강약의 조화를 살린다고 해서 모두가 유명 고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 위에 더 중요한 요소로 적절한 추임새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임새란 소리 중간, 또는 구절 끝에서 <얼씨구>, <잘한다>, <으이>, <좋지>, <~치>, <좋다>, <~타> 등의 흥을 돋우는 조흥사(助興詞)인데, 이를 적절히 구사하여 창자의 기를 살려주고, 흥을 돋워주면서 호흡을 맞춰주어야 명고수(名鼓手)로 대접받는다.
이처럼 소리판의 성공 여부는 바로 고수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일고수이명창(一鼓手二名唱), 곧 첫째가 고수요, 둘째가 명창이라는 용어가 오래전부터 소리판에 전해 오고 있지 않은가!
40여 년 전에 들었던 재미있는 추억담이 있다.
당시 YMCA 일산대회에 관여했던 나는 박동진 명창과 김득수 명고수를 초청해 판소리 감상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명창과 고수를 소개하였고, 고수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고수(一鼓手) 이명창(二名唱)이라는 이야기를 끌어들였다. 그런데 김득수 고수는 “그게 이제는 <일청중(一聽衆), 이고수(二鼓手), 삼명창(三名唱)>이란 말로 바뀌었다.”라고 전해 주는 것이었다. 곧 첫째는 청중의 호응이나 태도이고, 둘째가 고수의 역할, 셋째가 명창이라는 말이다. 완전한 역설임에도 불구하고, 거슬리지 않는 것이다.

소리꾼이 있어서 북을 쳐주는 고수가 존재하는 것이오, 이 두 사람의 시연이 있어서 이를 보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리판이 꾸며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그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고수보다도 청중들의 호응, 반응이 있어야 소리꾼이 소리를 잘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옳은 말이다. 구경꾼 없는 야구경기나 축구 경기를 상상해 보라. 소리를 듣고자 모여든 청중이 존재하기에 연희자들이, 그리고 공연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어서 지금도 잊히지 않고 있다.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