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상아 음악칼럼니스트]
간밤에 흰눈이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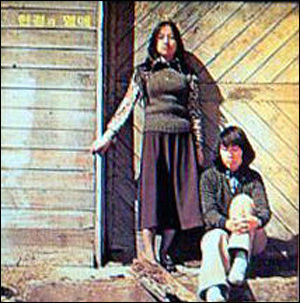
▲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음반
가지엔 눈꽃이 폈네요
참 예쁘네요
간밤에 흰눈이 왔어요
가지엔 눈꽃이 폈네요
참 예쁘네요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참 예쁘네요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참 예쁘네요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모두 다 즐거운 노래를
다같이 노래를 불러요
참 예쁘네요"
“참 예쁘네요” 가운데서
강원도 산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다. 예전에는 더욱 그랬다. 동짓달이면 벌써 외부세계와 왕래가 단절되는 마을이 수두룩했다. 강원도의 눈은 내렸다하면 한 길이 넘기가 일쑤였다. 이듬해 봄까지 꼼짝없이 마을 안에 갇혀 겨울을 나야 했다.
남정네들은 새끼를 꼬거나 돗자리 짜기, 소쿠리 만들기로 하루를 보냈다. 어쩌다 무리지어 나가는 사냥은 비길 데 없이 재미있는 놀이였다. 아낙네들은 엿을 고거나 콩나물을 기르며 명절준비를 하였다. 그렇게 단조로운 산골마을에 어쩌다 이야기꾼이라도 찾아들면 마을사람들은 반색으로 모셨다.
텔레비전이 귀하던 시절,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에서 이야기꾼의 존재는 오늘날로 치면 저널리스트요,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바깥세상의 소식을 한아름 안고와 들려주는가 하면, 역사와 고전, 신파극까지 걸쭉한 입담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다. 그런 이야기꾼이 마을에 나타나면 마을에선 놓아 주지를 않는다. 없는 살림이지만 이집 저집에서 며칠씩 번갈아가며 정성으로 모셨고 밤이면 동네사람들이 이야기꾼이 묵는 사랑방으로 몰려들었다. 이야기꾼의 보따리는 마치 화수분과 같아서 풀고 또 풀어도 마르지를 않는다.
초저녁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부터 아녀자들이 좋아하는 신파극으로 이어지다가, 강냉이 술이 몇 순배 돌고 난 한밤중이면 남정네들만 남아서 뭐가 그리도 우스운지 웃음 터지는 소리가 눈 내리는 밤하늘로 퍼져 나간다.
달빛을 등에 업은 초가지붕엔 백설기 같은 흰 눈이 쌓이고, 겨울밤도 이야기에 홀려 사랑문에 귀를 기울이던 그 정겨운 모습은 산골마을에도 텔레비전이 보급되자 사라진 뒤 화석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가요 연구가들은 1929년에 나온 <낙화유수>를 우리나라 최초의 유행가로 꼽는다. 당시 중앙보육학교에 다니던 동요가수 이정숙이 불렀다. 최초의 유행가전문 가수는 1930년에 <봄노래 부르자>로 데뷔한 채규엽이고, 여가수로는 1932년에 <황성의 적>을 부른 이애리수를 유행가전문 가수의 효시로 꼽는다.
그 뒤 3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 가요는 세대 간의 경계가 없이 창작되었다. 그러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더니 1960년대 말부터는 확실한 경계가 생겨,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음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군의 미8군 무대 출신가수들과 대학가에서 주로 활동하던 포크가수들이 음반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기존의 트로트와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현경과 박영애에서 성을 뺀 <현경과 영애>는 서울 미대 재학생들로 결성되어, 1971년부터 맑고 고운 노래로 학생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음반데뷔는 몇 해 미루어져 74년에 이루어졌고 <참 예쁘네요>는 그들의 첫 음반 수록곡이다.
한국방송디스크자키협회 감사, 전 한국교통방송·CBS 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