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앞에서 <운담풍경-雲淡風輕>이라는 단가를 소개하였는바. 이 노래는 노랫말이나 가락들이 친숙해서 비교적 널리 불리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단가는 중국 관련의 인물이나 풍경을 끌어다가 노랫말로 쓰는 데 반해.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다는 점, 그 내용은 날씨 좋은 한낮에, 수레에 술을 싣고, 꽃과 버들을 따라 앞내 모래섬으로 내려가며 좌우의 풍경들을 노래한다는 점, 끝맺음은 역시, “거드렁 거리고 놀아 보자.”와 같이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자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기회에는 ‘장부가(丈夫歌)’라는 단가를 소개한다.
장부란 장성한 남자를 일컫는 말이고, 이 노래를 <불수빈(不須嚬)>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그 뜻은 “웃지 말라”는, 곧 젊었다고 해서 백발을 비웃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전에는 “여보아라 소년들아, 이내 말을 들어 보소.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그 아니 가련한가?”로 불렀는데, 이를 신재효가 고쳤다고 한다.
이 노래의 중심 내용은 인생의 덧없음, 곧 인상무상(人生無常)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중국 고대의 요(堯), 순(舜), 우(禹), 탕(湯)임금으로부터 역대 유명한 성현(聖賢)이나 군자(君子), 그리고 문장가나 재사(才士), 또는 이름난 명장(名將)이나 충신, 열사나 호걸, 미희(美姬)나 미인(美人)들의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어서 실감이 나기도 한다. 세상을 움직이던 그들도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무상을 실감 나게 해주는 노래인데, 그 시작은 다음과 같다.
“어화 청춘, 소년님네, 장부가(丈夫歌)를 들어보소.
국내 청년 모아다가 교육계에 넣어두고, 각종 학문 교수하여 인재 양성하는 것도 장부의 사업이요, 천리(千里)준총(駿驄) 바삐 몰아, 칠척장검(七尺長劍) 손에 들고, 백만대병 지휘하여 통일천하 하는 것도 장부의 사업이라. <장부가>로 노래하니, 뜻이 깊고 애가 타서 가슴이 답답, 목마르다. 뒷동산 지는 꽃은 명년삼월 다시 피되,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청춘 어려워라. 개벽(開闢) 후에 내린 사적, 역력히 들어보소.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맹안증정주자는 도덕이 관천하사, 만고성현 일렀건만, 미미한 인생들이 저 어이 알아보리. (가운데 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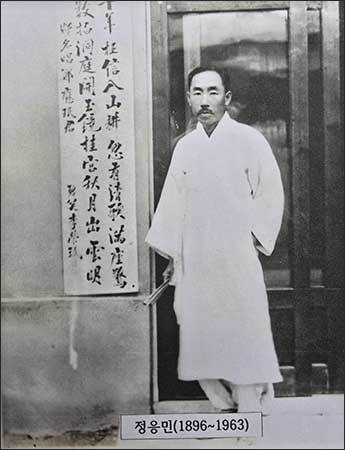
여기 나오는 요순우탕(堯舜禹湯)은 태평성대를 이룬 요 임금, 순 임금, 우왕, 탕왕을 말하며, 문무주공(文武周公)은 문왕과 무왕, 주공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또한 공맹안증정주자(孔孟顔曾程朱子)는 도덕과 문장에 정통한 대 성인들로 유교, 유학의 공자를 비롯하여 맹자, 안자, 증자, 정자, 주자 등을 가리키는 이름들이다. 이 유명한 대 유학자들을 만고의 성현으로 칭송해 왔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뒤로 이어지는 노랫말이다.
동남제풍(東南祭風) 목우유마(木牛流馬),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 전무후무(前無後無) 제갈공명(諸葛孔明), 난세간웅(亂世奸雄) 위왕조조(魏王曹操) 모연추초(慕煙秋草) 처량하고, 사마천(司馬遷)과 한퇴지(韓退之)와 이태백과 두목지(杜牧之)는 시부중(詩賦中)에 문장이요, 월서시(越西施)와 우미인(虞美人)과 왕소군(王昭君)과 양귀비(楊貴妃)는 만고 절색이었건만, 황량(荒凉)고총(孤冢)되어있고, 팔백장수 팽조수며 삼천갑자 동방삭도 차일시(此一時)며 피일시(彼一時)라. 안기생 적송자는 동해상의 신선이라 일렀건만, 말만 듣고 못 보았네, <아서라. 풍백(風伯)붙인 몸이 아니 놀고 무엇하리.>
위 노랫말 가운데 동남제풍(東南祭風) 목우유마(木牛流馬)란 표현은 제갈 양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빌고, 나무로 우마(牛馬)를 만들어 수레를 끌게 하는 등, 천문과 상통하고 풍수지리에 밝은 신통력으로 난세의 간사한 영웅, 조조의 군사들을 대패시켜 마치 그의 모습이 저녁연기처럼, 또는 가을의 시들어가는 풀처럼 처량하다는 표현이다.

이어지는 사마천(司馬遷), 한퇴지(韓退之), 이태백, 두목지(杜牧之) 등은 이름난 시인이며 문인(文人)을 끌어들였고, 그 뒤로 만고의 절색(絶色)으로 유명했던 월서시(越西施), 우미인(虞美人), 왕소군(王昭君), 양귀비(楊貴妃) 등, 이 4인의 유명한 미인들도 지금은 모두 황량고총(荒凉孤冢), 곧 쓸쓸하고 외로운 무덤이 되어있다고 노래한다.
월서시(越西施)는 월(越)나라의 서산(西山) 밑에 살던 시(施)라는 이름을 지닌 미인으로 외모가 출중해서 오(吳)와 월(越)이 서로 패권을 다툴 때, 오왕을 유혹했던 미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미인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서도 항우가 우미인의 이름만을 불렀다는 여인이다. 또한, 궁녀였던 미색, 왕소군은 원제(元帝)가 비(妃)를 선발할 당시, 그의 눈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화공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그의 참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 뒤에 발탁이 되었고 그 바람에 화공은 벌을 받게 된 것으로 유명하다.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해 온 팔백장수 팽조수나, 삼천갑자 동방삭도 지나고 보니 잠깐의 시간을 살았을 뿐이고, 안기생 적송자도 동해상의 신선이라 일렀건만, 그렇다는 말만 들었을 뿐, 모두가 잠시 한 때였다는 점을 실토하고
있다.
<아서라. 풍백(風伯)붙인 몸이, 아니 놀고 무엇 하리.>
마지막 종지구가 짧기만 한, 인생길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