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단가로 부르는 소동파의 전 적벽부(前赤壁賦)를 소개하였는 바, 유배된 그가 적벽강에서 배를 띄워 놀이 할 때의 흥취, 주변의 경치와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패한 조조(曹操)를 떠올리며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내용이 인상적이며 특히, 우주와 자연의 무궁함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끝나는 구는 서망하구(西望夏口) 동망무창(東望武昌) 산천이 상유하야 울울창창 허였으니 맹덕(孟德)이 패한 데로구나.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로 마무리하고 있으나, 핵심적 내용은 그 뒤로 이어지는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각기 주인이 있으니, 내 소유가 아니면 취하지 말아야 하지만, 강 위에 불어오는 청풍(淸風), 산 사이의 명월(明月)은 이를 취하여도 금하는 이가 없으며, 조물주의 무궁무진한 보고(寶庫)라는 이야기도 소개하였다.
이번 주에는 <장부한(丈夫恨)>이라는 단가를 소개한다.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대장부의 한(恨)을 소리로 나타내고 있는 단가다. 주된 내용은 남자로 태어나 뛰어난 명승고적(名勝古蹟)들을 두루 돌아보고, 고금(古今)의 영웅들이나 열사, 문장가나 충신, 그리고 미인 미녀들과 경치 좋은 곳에서 자리를 같이하며 산해(山海)의 진미(珍味)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마음껏 즐기다가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 꿈을 너무나 아쉬워하며 붙인 이름이 곧, 대장부(大丈夫)의 한(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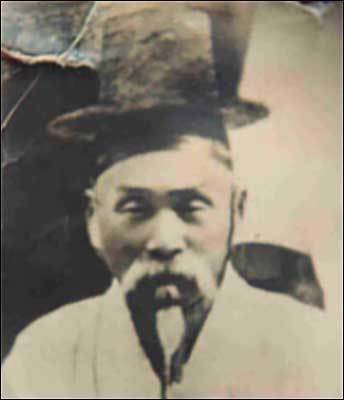
이 노래 역시, 사설의 내용을 보면 앞서 소개한 대부분의 단가에 나오고 있는 산의 이름이나, 강의 빼어난 경관들, 그리고 만리장성을 비롯하여 아방궁(阿房宮), 백이숙제, 봉황대(鳳凰臺), 황금대(黃金臺), 한무제(漢武帝) 때의 천추유적(千秋遺跡)과 선인장(仙人掌), 승로반(承露盤) 등등, 유명 고적(古跡)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장주(莊周) 호접(胡蝶)이나 요 임금 때의 유명한 현신들이었다고 전해오는 고(皐)ㆍ요(僥)ㆍ직(稷)ㆍ설(契)을 비롯한 영웅, 호걸들의 이름도 상당수 출현하고 있어서 고대의 역사나 당시의 인물들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다.
앞의 장주 호접이란 ‘장주가 나비인가? 나비가 장주인가?’ 하는 말이다.
옛날 장주라는 사람이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비천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인접국의 제왕들이 그를 모셔 백금(百金), 천금(千金)으로 정승을 청했으나, 그는 끝까지 이를 사양하고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유되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꿈을 깬 뒤에는 다시 장주가 되었으니, ‘장주가 나비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주인가?’ 하는 말이 전해 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단가에는 으뜸 미색으로 알려진 매희(妹姬)라든가, 하희(夏姬), 서시(西施), 당(唐) 명황의 양귀비(楊貴妃), 식(息)부인, 채문희, 오강낙루(烏江落淚)의 주인공, 우미인(虞美人)의 이름도 보여서 유명 여인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도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는 외양(外樣)의 미모는 특출했으나, 마음씨가 곱지 못한 요화(妖花)들로 알려진 달기(妲己)나 포사(褒姒)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도 보여 흥미롭다.

이 단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장부 허랑(虛浪)하여 부귀공명을 하직하고,
삼척동(三尺童-어린 동자) 일 필려(一匹驢-당나귀 한 마리)로 승지 강산을 유람할 제, 진시황 고국지(古國趾)와 만리장성 아방궁(阿房宮)과 봉황대(鳳凰臺), 황금대(黃金臺-연 임금이 대를 쌓아 천금을 두고 천하의 어린 선비들을 맞이했다는 곳)며 한무제(漢武帝) 천추유적(千秋遺跡) 선인장(仙人掌) 승로반(承露盤-감로주를 받기 위한 그릇)과 오수당월노채송(吳隨唐越魯蔡宋) 도읍터를 다 본 후에, 강산이 기진하되, 호흥(豪興)이 상존하여 옥란간에 높이 올라 인호상이자작(引壺觴而自酌-술 따라 주는 사람 없이 혼자 마신다는 뜻)후, 한단(邯鄲-조나라의 수도) 침(枕) 돋우 베고, 장주호접(莊周胡蝶) 잠깐 되니, 꿈이 또한 생시 같이 우수(右手)를 높이 들어 소상 반죽 둘러 짚고, 녹수청산(綠水靑山) 들어가니, 산용수세(山容水勢)도 좋거니와 초목 무성 아름답다. (중간 줄임)
“백옥반(白玉盤-옥쟁반), 경골준(鯨骨樽-고래뼈로 만든 술단지)에 제일 산채(山菜) 불로초(不老草)며 일등 해물 설리어(雪裏漁-추운 강물속의 깨끗한 물고기)를 가득히 담아놓고, 좌상에 앉은 손께 순배 없이 권할 적에, 전계어부 애내성에 남가일몽(南柯一夢-꿈과 같은 한때의 부귀영화) 흩어지니 어화 애달프도다. 대장부 평생 뜻을 꿈에도 못 이루어 긴 한숨, 짧은 탄식, 어느 때나 그쳐 볼거나. (다음주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