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처녀에는 총각무, 부끄럽다 홍당무, 여덟아홉 열무,
입맞췄나 쪽무, 이쪽저쪽 양다리무, 방귀뀌어 뽕밭무,
처녀팔뚝 미끈무, 물어봤자 왜무, 오자마자 가래무,
정들라 배드렁무, 첫날신방 단무, 단군기자 조선무,
크나마나 땅다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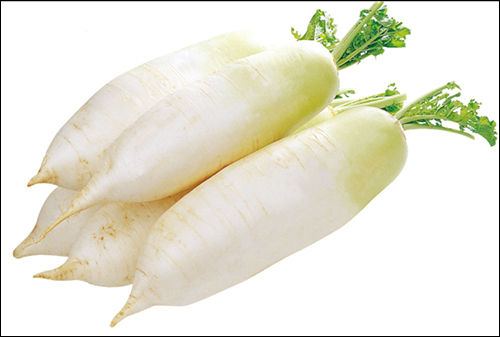
이는 무 밭에서 두 편으로 갈라 무를 뽑으며 부르던 무타령입니다. 무는 배추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푸성귀(채소)입니다. 무는 철 따라 김치로 담가 먹습니다만 김치 말고도 국이나 조림, 나물, 생채감으로 많이 쓰며, 예전에 겨울철에 채소가 귀할 때에는 무를 말려 두었다가 장아찌나 나물을 만들고, 무청도 말려서 시래기나물을 해 먹었습니다.
《세종실록》 18(1436)년 윤6월 29일 기록에 세종이 "무는 구황(救荒)에 있어 크게 유리한 점이 있는 식물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1묘(畝, 논밭 넓이의 단위로 30평 곧 약 99.174㎡) 땅에 이를 심으면 1천 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무를 구황작물(흉년에 쌀보리 대신 먹을 수 있는 작물)로 본 것이지요. 참고로 예전 여성들은 두 갈래로 갈라진 무가 가장 인기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무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를 ”다산채(多産菜)“라고도 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