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
국어사전에서 찾은 ‘명품(名品)’의 정의다. 아무래도 요즘 많이 쓰이는 쪽은 후자다. 백화점 문을 열자마자 명품관으로 달려가는 것이 유행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명품은, 그 자체로 뛰어나기도 하지만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물건’에 가깝다. 그냥 휙 보고 지나가기보다, 생활 속에서 곁에 두고 썼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다.
이 책, 《생활명품》의 지은이 최웅철은 예(藝)와 맛의 고장 전주에서 종가의 장손으로 우리 문화를 흠뻑 느끼며 자랐다. 한옥에서 한지와 나무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마루와 구들을 놀이터 삼아 놀았다. 전주에서 규모가 큰 한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 덕분에 맛있는 우리 먹거리도 많이 맛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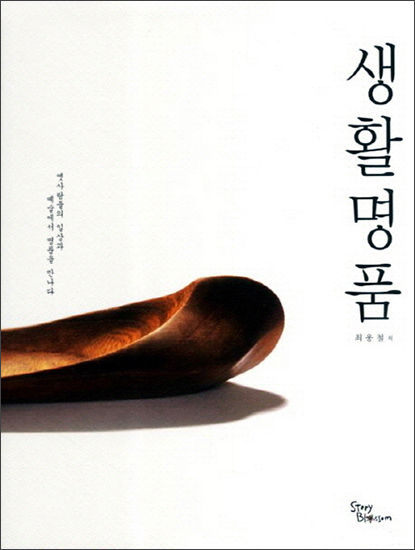
지은이는 그 시절이 자신을 지탱하는 그리움이고, 양분이고, 열정이라고 회고한다. 그래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한 나머지, 우리 문화의 미감과 매력을 차곡차곡 담은 책 한 권을 펴냈다. 그가 엄선한 한국의 공예와 회화, 건축, 음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문화에 담긴 멋과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공감을 자아낸 한국의 대표 명품 세 가지를 골라보았다.
# 사방탁자
필자는 한국 고가구의 매력을 대표하는 으뜸 가구로 사방탁자를 꼽는다. 사방탁자를 방에 두면, 탁자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된다. 사방탁자의 단순하면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품, 절제된 듯하면서도 꽉 찬 존재감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다.

사방탁자가 100여 년을 넘겨도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는 비결은 치밀한 ‘연귀짜임’이다. 보통 모서리를 45도로 자르는 짜임을 연귀짜임이라 하는데, 못 하나 박지 않고 접착제로 붙이지도 않고 나무를 정밀하게 잘라 맞물리도록 만든 덕분에 사방탁자 또한 뒤틀리거나 터지는 법이 없다. 지은이의 표현대로 ‘엉성해 보이지만 치밀하고,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다.
(p.55-56)
사방탁자는 요즘의 가구들과 어우러져도 전혀 튀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다. 사방탁자의 아름다움은 바로 단순함의 미학이다. 그 이름대로 사방이 트인 채로 층층이 몇 개의 선반만 놓여 있고, 경우에 따라 서랍을 넣거나 문짝을 달았다. 복잡한 구조나 장식 없이 어찌 보면 앙상한 뼈대만 있는 가구. 그런데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품이 있다. 좁은 방 안에 놓아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매력이다. 옛집의 사랑방들은 꽤 협소했기 때문에 사방탁자는 막힌 데도 없고 모양새도 간결하게 만들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했다.
# 한지
한지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문에 창호지로 발랐을 때다. 한옥의 창과 문에 발린 한지는 가히 우리 생활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지은이는 한지의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반투명성’에 주목한다. 한지의 반투명성은 유리창과 달리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방안을 가려 사생활을 보호해주지만, 그렇다고 답답하게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 시선은 가리면서도 공기와 빛을 막지 않는 한지의 성격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리면서도 드러내는’ 한지의 반투명성이 우리 문화의 멋스러운 지점이다.
(p.70-71)
시선은 가리면서도 공기와 빛을 막지는 않는 한지의 성격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반투명성의 문화를 상징한다. … 이런 한지의 이중성은 가리면서도 통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기며,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는 상반된 모습들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이중성을 멋지게 이용할 줄 알았던 우리네 사람들이 있다. 창을 열고 바깥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또 때로는 창을 닫은 채 한지를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과 햇빛을 즐기고 창에 드리워지는 나무 그림자까지 즐길 줄 알았던 옛사람들. 가림과 드러냄의 미학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살아갔던 그들의 지혜와 멋스러움에 찬사를 보낸다.
#책거리
‘책거리’, 혹은 ‘책가도’라 불리는 그림은 책을 비롯해 벼루, 먹, 필통, 연적, 종이 등 선비들이 애용하는 물건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조선 정조 때 크게 유행해 당시 양반집 사랑방에는 어김없이 책거리 병풍이 놓여 있었다.

그 이전에도 책거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책거리 그림에 일관된 시점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부분이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림은 대부분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대상이 그려져 있으나, 책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본 모습을 하나의 화면에 펼쳐놓았다. 옛사람들이 원근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물을 가장 좋은 위치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 사물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사람의 옆모습과 앞모습을 한꺼번에 그린 피카소의 화법과도 흡사하다. 지은이는 피카소보다 이삼백 년을 앞선 현대적인 그림을 그렸던 선조들의 천재성을 극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현대 미술의 화법을 수백 년 먼저 구사할 정도로 혁신적이었던 책거리는 오늘날까지 많이 전해지지 못했고, 지금 남아있는 책거리는 대부분 19세기 이후 그려진 것이다.
지은이는 그 까닭이 민화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지 못하고, 민화를 그리고 즐길 만한 독창성과 감각은 있었으되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킬 줄 아는 혜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씁쓸해한다. 지은이 본인도 오래전 전주 본가의 한옥을 보수할 때 벽장에 붙어 있던 민화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모두 버린 적이 있다고 후회한다.
아무리 멋지고 빼어난 문화도 그 값어치를 알아보는 이가 없으면 그만 퇴색하고 만다. 문화는 만드는 이와 보는 이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합작품이다. 지금도 우리 문화 가운데 알아봐 주는 이가 없어 무심한 눈길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 문화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낮은 안목의 소유자라고 폄훼할 생각은 없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면 서양문화 못지않은 매력이 많은데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문화의 값어치를 널리 알리는 이 책이 절판되어 버린 것도 아쉽다. 앞으로 이런 책이 더욱 많이 출간되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아는 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부터 부단히 공부하고 안목을 높여, 우리 문화의 매력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