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시선사에서 한국 대표 서정시 100인선을 내며 61번째로 박수중 시인의 시집 《규격론(規格論)》을 펴냈습니다. 시선사에서는 기획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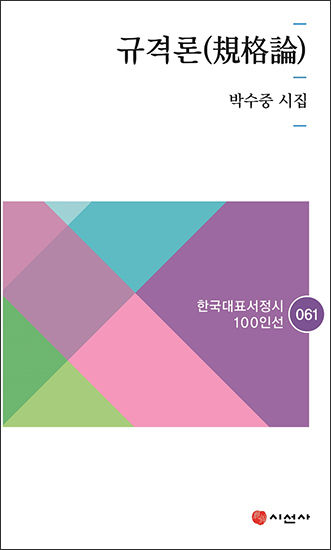
“한국의 현대시는 독자와의 소통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시인만 남아 있고 독자는 멀어져간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는 좋은 작품을 향유하고 감상해야 할 문학의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시선사는 이를 바로잡고 시인과 독자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한국 대표 서정시 100인선을 기획하였다.”
공감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월간중앙에 글을 연재한 인연으로, 그 후 월간중앙을 구독하고 있는데, 월간중앙에서는 잡지의 처음에 매번 시 한 편을 싣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시심(詩心)이 메말라서인지, 공감되는 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는 왜 이리 어렵지?’ 하며 툴툴댄 적이 있었는데, 시선사에서 저 같은 독자들을 생각하여 이런 기획을 하였군요.
박수증 시인은 제 고교, 대학 선배입니다. 광복 전 해인 1944년에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이시지요. 서울법대를 나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학의 길로 나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들게 하지요? 예! 박 선배는 금융 투자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외환코메르츠투신운용(주) 사장을 끝으로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미네르바」로 등단하셨습니다. 아마 그전부터 문학의 꿈을 키우면서 습작을 해오시다가, 2010년에 정식으로 등단하시지 않았을까요?
박 시인은 지금까지 《꿈을 자르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등 5편의 시집을 내셨는데, 이번 시집은 시선사의 기획 취지에 맞추어 그동안 쓰신 시 중에서 67편의 시를 엄선하여 이 시집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제목이 《규격론(規格論)》이라고 하니까, 무슨 논문 제목 같기도 하네요. 보통 시집에 실리는 시들 가운데 하나의 시 제목을 시집 제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규격론》도 그 안에 실린 시 ‘규격론’을 시집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규격론’은 인간이 개를 사랑한다면서도 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개를 재단(裁斷)하는 풍조를 비판한 시입니다. 시 일부를 인용해볼까요?
...
주인은 나를 목욕시킨 뒤 내 피부를스님의 독두(禿頭)처럼 깨끗이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붉고 푸른 그러나 나에게는
옥죄기만 하는 죄수복을 입혔다.
먹는 것은 정체불명의 알약이었고
늘 같은 것이었다
...
그들에게 재롱을 소모할 때를 빼고는
나는 거의 골방 구석에 갇혀 지냈다
...
그렇게 두 살쯤 나이를 먹자
주인은 나의 생식기를 제거해 버렸다
저 심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울부짖고 싶었지만
성대는 이미 절제(切除)되어 있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개의 분노가 시에서 느껴집니까? 개의 분노도 분노이지만 그러한 개에 감정 이입된 박 시인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박 시인은 남의 처지는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현대사회에 대해 죽비를 들고자, ‘규격론’을 시집 제목으로 하신 모양입니다. 박 시인은 이런 분노를 규격화된 식물에서도 느끼며, 이를 ‘신(新)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시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수한 꽃 몇 종류와 야생 풀들이 동거하는
초여름 한강 고수부지 화단
전동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 요란하다
전체를 입체 사각형으로
보기 좋게 단장하는 거라는데
아주 고르게 깨끗이 수평으로
팔
다리 머리 없이 무차별로 잘라내고 있다
이런 들꽃 종류와 잡초류는
몸이 반 이상 잘려도 잘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글쎄 살기는 산다고 쳐도
다 불구자 아닌가
높이가 들쑥날쑥하고 옆으로 뻗더라도
그냥 온전하게 내버려두면
그 화단은 쓸모가 없고 보기 싫어질까
불어오는 미풍(微風)에 물어보고 싶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아시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침대에 눕히고 키가 커서 침대를 벗어나는 몸 부분은 잘라버리고, 또 키가 작으면 억지로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맞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 시인은 요란하게 예초기가 돌아가는 화단을 보며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떠올리고 시를 쓰셨군요.
한편 시집 끝에는 ‘시간의 틈새에 끼어’라는 시인의 산문도 실려있습니다. 박 시인은 《규격론》 시집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마지막에 산문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산문에서 시인은 먼저 미식축구에서 쿼터백도 감지하지 못하는 공간을 블라인드 사이드(blind side)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의 사각지대인데 시간에도 이를테면 상실되어 지워진 사각시점(死角時點)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시의 출발점이다....... 나의 시에서 그 사각시점을 부단히 탐구하는 것이 기억과 무의식이다..... 진실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끊임없는 기억의 촉수로 사각시점의 상상을 더듬는다. 그리고는 실패한다. 기억과 상상으로 메꾸어지지 않는 시간의 공백은 끝없는 기다림이다. 그리하여 시는 늘 미완성이다.
그러시군요. 그런 시인의 생각이 들어있는 시 가운데서 ‘그 방(房)’이라는 시를 음미해봅니다.
그 방은 혼자 있었다
나가이(長居) 운동장 둘레의 숲속
시간이 머물러 있는
어느 삭정이 같은 골목을 접어들면
가을 풍경 속 햇빛처럼
그 모습이 빗살무늬로 떠올랐다
측백나무가 있는 마당을 돌아 들어가면
기다림이 고여 있는 흙바닥과
생채기투성이의 쪽마루,
대나무잎 푸른 냄새가 묻어나는
다다미방 하나가
덩그라니 놓여 있었다
방 끝에는 빈 하늘이 한 장 걸려 있고
햇살이 비치면 고운 먼지가
빛의 띠를 이루며
퇴색(退色)한 시간 속을 부유하고 있었다
그 방구석에는 더듬이가 긴 곤충들과
기억의 파편들이
희미한 그림자로 웅크리고 있었다
박시인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일본 나가이에 머물렀던 모양이군요. 아마 오래된 어느 시점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곳에 머물던 그 방! 그 방의 풍경이 아스라이 떠오르면서 시인은 그 기억의 파편들로 시를 쌓아올렸군요. 또한 박 시인은 산문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고도의 지능이 장착된 로봇이 애인까지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시간의 틈새에 끼어 시의 모습은 어찌해야 할지 하는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은 인간의 기억도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 지식뿐 아니라 감성과 정서도 빅데이터 등으로 처리하고 가공 활용하는 날이 오고 있다. 아울러 뇌과학도 같이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기억도 입체화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인간의 감정 정서가 어떻게 변용하는지 시의 세계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중간 줄임) 이제 시간의 틈새에 끼어 자연의 섭리조차 낯설어지고 시의 서정성도 재정립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다.
그렇지요. 저는 검색할 줄만 알지 사색할 줄 모르는 요즘 세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인간 노예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시인은 앞으로의 시의 세계에 대해 이런 걱정을 하시는군요. 이런 디지털 세상도 화두로 놓은 시인이니, 박 시인의 시에 이에 관한 시가 없을 수 없겠지요. 정보저장장치인 클라우드에 관해 쓴 시 ‘클라우드 방식으로’의 일부를 인용해봅니다.
기억은 구름(cloud)으로 저장되는 것
너는 13층에 맨발로 웅크리고 있다
로그인하면 너는 0.1초만에 나타난다
우리는 함께 무너져 본 적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겐 구름도 사치
헤어질 때 내밀었던 너의 손목이
구름에 매달려 있다
눈먼 도시가 구름 속으로 쫓아온다
(중간 줄임)
구름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파편으로 흩어지는 기억들
우리는 압축된다
시멘트의 서정은 쇠창살처럼 쩔그렁거리며
표정을 수집한다
우리는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 기억도 관리되고 통제된다는데, 구름(클라우드) 속의 나의 기억을 다시 꺼내면, 그건 온전한 나의 기억일까? 시인의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으로 전이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전에 《박제》라는 시집을 저에게도 주셔서 잘 보았는데, 이번에도 《규격론》 시집을 주셔서 한국대표 서정시의 세계를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규격에 얽매이지 않는 시의 세계를 계속 우리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시란 이런 것이다’라는 새로운 이정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