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장상훈)은 경상권 49개 시군구 116개 마을의 마을신앙을 조사하고 기록한 《한국의 마을신앙》 경상권 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충청권과 전라ㆍ제주권에 이어 3번째로 펴낸 이 보고서는, 예로부터 공동체의 결속과 공동체 문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경상도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을의 오랜 전통과 약속을 이어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경상권에서 전승되는 마을신앙의 유래와 다양한 모습은 물론 마을제의의 과정과 의의까지 생생하게 담고자 했다. 특히 산과 바다, 넓은 들이 어우러진 경상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등 인문환경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경상권 마을신앙의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목된다.
• 제1권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1
• 제2권 경상북도2
• 제3권 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1
• 제4권 경상남도2
□ 114명의 연구자가 참여관찰로 기록한 1,678쪽의 경상도 마을신앙 이야기
1,678쪽의 보고서, 1,418장의 사진, 114명의 조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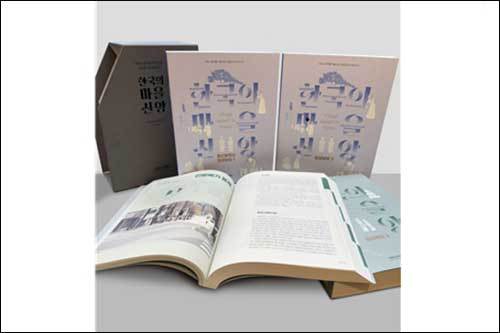
한국에서 경상도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처럼 경상권 마을신앙 조사보고서의 분량도 상당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권역별 마을신앙 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114명의 조사자가 116개 마을을 찾아 제의의 장면을 기록했다. 경상권 마을에서는 대부분 정월대보름에 마을제의를 지내기에 한 명의 조사자가 여러 제의에 참관하여 마을신앙을 기록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만의 관계망을 활용해 많은 지역 민속연구자가 박물관 연구자와 함께 동시에 경상도 전역의 정월대보름 마을신앙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고갯길 따라 한참 산을 올라야 마주할 수 있는 산신당에서 엄숙하게 지내는 마을제의는 물론, 어촌마을의 풍어제와 별신굿, 높은 건물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열리는 축제 형식의 마을제의도 놓치지 않고 담고 있다. 조사자와 마을주민이 한마음으로 기록한 6,300여 매의 원고지 높이만큼 경상권 마을신앙 이야기의 깊이도 깊고 흥미로울 것이다.
□ 동제? 당산제? 동신제? 경상도에서는 마을제사를 뭐라고 부를까?
마을제의를 부르는 말은 지역마다 다르다. 마을마다 수호신이 다르고 마을신이 거처하는 장소도 달랐기 때문이다. 오늘날 행정편의에 따라 새롭게 구획된 행정구역과 달리 예로부터 한 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은 마을제의를 같이 지내는지 여부였다. 실제 바로 옆 마을이라도 마을제의의 이름이 달랐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3개 마을이 각각 천제, 동제, 동신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고, 경남 고성군에서도 3개 마을이 각각 은정자동신제, 동제, 마장군제라고 불렀다. 마을제의의 이름은 물론, 마을에 모시는 신의 이름도 신체 형상도 마을마다 달랐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경상권 마을제의의 주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경상권 마을제의의 이름과 신격, 신체 그리고 제의방식이 어떤지 궁금하다면!! 이 보고서의 「조사개요」를 보면 알 수 있다.

□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부활하는 마을신앙
경상권 마을신앙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마을제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거나 복원된 마을이 많았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결속이 단단했던 자연마을이 행정구역 개편과 도시개발로 해체되고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며 제의가 중단되거나 단절된 마을이 많았다. 그러나 마을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시 제의를 지내는 마을을 여러 곳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제의의 재개와 복원은 제의의 형식과 규모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한밤에 엄숙하게 지내던 제의가 마을주민과 외지인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함께 즐기는 큰 축제로 변화된 것이다. 또한 새롭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으로 확대된 마을도 여러 곳 찾아볼 수 있었다. 제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겹게 음식을 나누거나, 풍물을 울리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의 마을제의 역시 공동체를 통합하고 마을의 전통을 지켜가고자 하는 마을의 약속일 것이다.
□ 우리 동네의 마을신앙이 궁금한가?
마을제의에 참여해 보거나 구경이라도 해 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앞 아름드리 느티나무나 커다란 돌 앞에서 사람들이 함께 절을 하는 모습을 대중매체나 사진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신앙은 마을마다 다르다. 마을 신의 이름부터 제의의 준비과정과 제물, 소원을 빌거나 제의 뒤 마을행사까지 마을만의 풍습과 규범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전국을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마을신앙 조사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전국의 여러 마을을 찾아 마을신앙의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긴다면, 마을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을신앙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마을신앙의 내력을 살피고 복원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꼼꼼히 기록한 마을신앙 보고서는 지역 민속 연구의 기초자료이자 우리 민속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24년 경상권에 이어 2025년 강원권, 2026년 서울ㆍ경기권 마을신앙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펴낸 보고서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www.nfm.go.kr)에서 원문을 내려받아 읽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