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양병완 기자] “판소리”라는 말은 판놀음에서 부르는 소리(노래)를 말한다. 옛날 문헌에는 이러한 의미의 판소리를 잡가(雜歌), 타령(打令), 창가(唱歌), 극가(劇歌), 본사가(本事歌)등으로 표현하였다. “판놀음”이란 원래 넓은 마당을 놀이판으로 하여 판을 짜서 놀이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판놀음에는 판소리, 풍물굿, 줄타기, 소고놀이, 춤, 염불 등인데 판놀음으로 놀 때는 “판”자(字)를 붙여서 판소리, 판굿, 판줄, 판소고, 판춤, 판염불이라고 불렀다. 판소리는 원래 창우(唱優), 광대(廣大)등으로 부르던 소리와 재담(才談)과 춤과 곡예를 연희(演戱)하던 “노릇바치”가 부르는 소리에서 나온 말이다.
“노릇바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광대 역시 그 솜씨에 따라서 소리광대, 대광대, 줄광대, 어릿광대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판소리는 여기에서 소리광대를 가리킨다. 본래 광대(廣大)는 첩리(帖裏)에 초립(草笠)을 쓰나 소리광대는 두루마기에 갓을 썼고 명창으로 뽑히게 되면 판소리 창(唱)옷에 통영갓을 쓰기도 하였다. 판소리는 가객(歌客) 한 사람이 긴 서사적(敍事的)인 사설을 “아니리(대화체의 말), 소리(판소리), 발림(몸짓)”으로 연출하는 극적인 음악의 하나를 말하며 고수(鼓手) 한 사람이 가객(소리꾼)의 왼쪽에 비스듬하게 앉아서 소리북으로 북 장단을 치면서 장단을 받쳐 준다.

▲ 김세종제 판소리학술대회에서 판소리를 부르는 김수연 명창
판소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文獻)으로는 영조 30년(1754년) 유진한(柳振漢)이 펴낸 《만화집(晩華集)》 가운데 춘향가이다. 그러나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戱)”라는 말이 초선 초기(初期)부터 판놀음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판소리를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판소리 여섯 마당만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윤달선(尹達善)이 펴낸 《광한루악부(廣寒樓樂府)》에 보면
“아국창우지희(我國倡優之戱)
일인립일인좌이립자창(一人立一人坐而立者唱)
좌자이고절지(坐者以鼓節之)
범잡가십이강향낭(凡雜歌十二腔香娘)
가즉일야(歌卽一也)”
라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면 판소리에는 원래 열 두 마당이 있었던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판소리 열 두 마당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 정노식이 쓴 《조선창극사》에는 “가짜 신선타령” 대신 “숙영낭자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흥미롭다. 조선 중기(中期)까지만 해도 판소리는 서민들의 판놀음 가운데 다른 놀이에 끼어서 연출 되었다. 그러므로 서민들의 생활 감정에 알맞은 이야기들이 여러 갈래의 판소리로 짜여 공연 되었다.
탈출구가 없었던 시절에 서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수많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판소리가 점진적으로 상류층의 방안 놀이로 변모하게 되면서 인기가 양분될 수밖에 없었다. 상류층으로 옮겨진 판소리는 계속하여 발전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판소리는 쇠퇴되어 도태되고 말았다. 지금은 적벽가, 수궁가,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변강쇠가, 여섯 마당만 전승되어 공연되어 지고 있다.

▲ 판소리 동편재 연주 모습
조선 판소리는 원래 열 두 마당이었다. 지금은 여섯 마당만 전해지고 있다. 판소리 열두마당을 적어 보면 첫 번째 적벽가(화용도), 두 번째 수궁가(별주부가, 토끼타령), 세 번째 춘향가(성춘향가), 네 번째 흥부가(박타령), 다섯 번째 심청가(심봉사 타령), 여섯 번째 변강쇠 타령(가루지기 타령), 일곱 번째 배비장 타령(애랑가), 여덟 번째 옹고집 타령(옹고집가), 아홉 번째 장끼 타령(까투리 타령), 열 번째 강릉매화 타령(매화가), 열 한 번째 무숙이 타령(왈자 타령), 열 두 번째 가짜 신선타령(가짜 신선가)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는 모르나 지금은 여섯바탕 소리만 전하여 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궁리 끝에 2002년 7월 18일 국립 국악원 국악교육 연구논문 공모 부분에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잃어버린 판소리 여섯 마당 복원(復元)에 관한 연구(硏究)(The Research of Sixth-Madang Restored on Lost Pansori in Korea) - 동편제 판소리 순창(淳昌) 지역(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라는 논문(論文)을 제출(提出) 하였다.
심사과정에서 보기 좋게 탈락하고 말았다. 예상된 결과였다. 본인의 얄팍한 판소리 상식으로 도전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악 전문가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했다. 판소리 논문을 감투욕심이 나서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해서 제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조용히 넘어 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악 전문가들이 어느 때인가는 잃어버린 판소리 여섯 마당을 복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다. 쉬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잃어버린 여섯 마당의 판소리를 복원하여 주실 것을 판소리 애호가의 한사람으로서 확신하고 있다. 늦지 않도록 독려하는 마음에서 논문을 제출하였다. 물론 잘 알지도 모르는 미천한 사람이, 판소리 눈 대목 하나 제대로 똑 소리 나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논문을 제출하였으니 눈밖에 밀려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하여 공연되는 무대가 많이 나타났다. 소리 광대에 의하여 흥행되어지는 판소리가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었다. 유진한의 “만화집(晩華集)”에 의하면 18세기에 이미 춘향가(春香歌)가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송만재의 “관우희(觀優戱)”에 의하면 19세기 중엽에 “춘향가” “심청가” “박 타령” “토끼 타령” “적벽가” “배비장전” “강릉매화 타령” “옹고집전” “변강쇠 타령” “장끼타령” “무숙이 타령” “가짜 신선타령”등 열 두 마당의 판소리가 형성되어 공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판소리는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판소리의 삼 요소를 제대로 갖춘 완성도가 높은 판소리만 여섯 마당이 전하여 오고 있다. 이것을 가인(歌人) 신재효 선생께서 판소리 사설(辭說)을 정리(整理)하여 이론적(理論的)으로 확립(確立)시켜 놓았다.
판소리는 18세기의 영조, 정조시대에 우춘대 명창, 하한담 명창, 최선달 명창이 적극적으로 활동 하였다. 19세기 전에는 권삼득 명창, 모흥갑 명창, 송흥록 명창 등 여러 명창이 새롭게 나타나서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내용(內容)의 사설(辭說)과 판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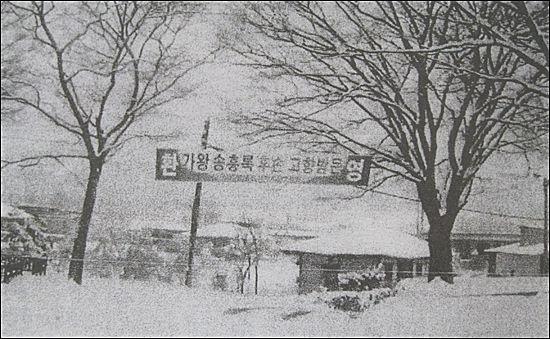
▲ 송흥록 명창 마을
노랫말과 가락을 새롭게 짜고 구성하여 부른 대목을 “더늠”이라고 하는데 이들 더늠 가락은 후대의 명창들에 의하여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판소리에는 지역적으로 특징을 나타나게 된다. 섬진강 동쪽 남원과 운봉, 구례, 고창 흥덕, 순창을 중심으로 하는 동편제(東便制) 판소리와, 서쪽과 남쪽지역인 전남 광주, 보성 나주, 완도, 진도, 해남을 중심으로 서편제(西便制) 판소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동편제와 서편제를 혼합한 소리인 충청도 지역 판소리가 중고제(中古制)로 발달하게 되었다.
고종 무렵인 19세기 후반에는 김세종 명창, 김정근 명창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명창들이 활동 하였으며 이때부터 후학들에게 전수(傳受)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말 조선의 판소리는 기본적인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말 때 호남지방과 충청지방에서 활동하던 기악 명인들은 시나위 가락과 판소리의 가락을 악기의 리듬에 실어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산조(散調)란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의 순서대로 3-6개의 판소리 장단에 판소리 선율을 얹어서 연주하는 독주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산조는 “가야금 산조”와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해금 산조”를 탄생시킨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쟁 산조” “피리 산조” “호적 산조”도 연주 되고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피리 산조나 호적(새납, 날라리, 태평소) 산조를 단독으로 공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산조는 어느 장단이나 반드시 고수(鼓手)의 장구 장단이 뒤따라야만 한다. 산조를 맨 처음 연주한 악기는 가야금인데 조선시대 말기에 “김창조(金昌祖,1865-1929) 명인”이 제일 맨 처음 창작 발표를 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한숙구 명인의 가야금 병창,” “백낙준 명인은 거문고 산조” 한숙구 명인, 박종구 명인은 해금 산조“를 창작하고 구성하여 공연하였다. 이시기에 각각 독특한 산조를 창작하고 연주하여 많은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산조는 지역에 따라서 사사계보(師事系譜)에 따라서 여러 개의 유파로 나누어 전수되었다.
조선시대 말기에 “심방곡(心方曲)”이라는 곡이 공연 된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조와 덧붙여 비슷한 말이 가야금, 해금, 대금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방곡(心方曲)은 때로는 “시나위”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 시나위라는 말은 신라 시대의 “사뇌(詞腦)” “사내(思內)”가 변한 것이다. 이것은 “향토(鄕土) 소리” 또는 “향악(鄕樂)”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의미의 산조는 “심방곡(心方曲)” 또는 “신방곡(神房曲)”이라는 의미로 널이 쓰였다.

▲ 대금산조를 연주하는 이생강 명인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서남 지역의 무가(巫歌) 선율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기의 산조곡을 가리키게 되었다. 대금, 해금, 피리, 장 , 징 등으로 합주를 하던 시나위를 제외하고 공연하였던 시나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와 조(調)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여 연주를 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와 같이 악기로 판소리 선율을 연주하던 것으로 “봉장취”라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소리들은 즉흥적인 선율이 많았다. 이것이 발전하여 현재의 산조가 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사당패가 출현하여 전승되는 선소리 “산타령‘은 조선 말기에 전문적인 소리꾼 집단에 의하여 공연 되었다. 소리꾼이 되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육자배기와 잡가를 많이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