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옛시는 강하다.
짧으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조용히 읊조리다 보면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옛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마력이 있다. 이런 매력에 빠져 오늘날에도 시읽기를 즐기고, 때에 맞게 인용하는 경영자가 많다.
고두현이 쓴 이 책, 《옛시 읽는 CEO》는 경영자가 읽고 그 참뜻을 되새길 만한 옛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느낌에 맞게 분류하여 엮어낸 책이다. 옛시에 얽힌 이야기와 더불어 난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시 한 수를 인용하여 백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전한 사례 등을 풍부하게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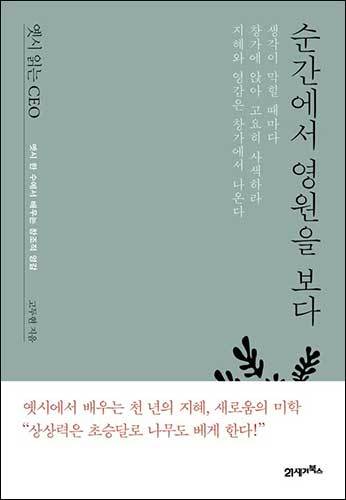
말이 범람하는 시대, 옛시에 담긴 따뜻하고도 여백 있는 감성은 가슴을 울릴 때가 많다. ‘조선의 이태백’이라 불렸던 이안눌이 함경도 관찰사 시절, 눈이 천 길이나 쌓인 변방에서 겨울을 보내며 쓴 「따뜻한 편지」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차마 부모님이 걱정할까 전하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p.33)
<따뜻한 편지>
집에 보낼 편지에 괴로움 말하려다
흰머리 어버이 근심할까 두려워
북녘 산에 쌓인 눈 천 길인데도
올겨울은 봄날처럼 따뜻하다 적었네
- 이안눌
지은이 고두현은 자식이 어버이를 걱정하는 이안눌의 시를 읽고, 거꾸로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한 기억을 떠올렸다. 20년 전 밤늦게 도착한 어머니의 소포. 거기 담긴 남해산 유자 9개, 그리고 편지 한 통. 그는 어깨너머로 조금 글을 깨친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고 밤새 잠들지 못했다.
(p.37)
‘큰 집 뒤따메 올 유자가 잘 댔다고 몇 개 따서
너어 보내니 춥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만앗지야
봄 볕치 풀리믄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르라.’
지은이는 ‘모든 게 서투른 사회 초년병 시절, 서울살이의 곤궁한 밭이랑 사이에서 아등바등하던 20년 전 그때, 어머니가 보내주신 유자 아홉 개와 중세국어 문법으로 써 내려간 편지’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고백한다. 자식이나 어버이나 서로 근심할까 두려워 괴로움은 말하지 못하고 그저 ‘여긴 괜찮다’라고 말하는 마음은 비슷한가 보다.
조선 중기의 문신 송순이 쓴 시조 또한 마음이 넉넉한 ‘마음 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은이의 표현대로, 강산까지 병풍처럼 둘러놓고 보니 초가삼간은 ‘천하를 품을 만큼 커다란 집, 우주의 집’이 되었다.
(p.127)
<십 년을 경영하여>
십 년을 경영하여
초가 세 칸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놓고 보리라
- 송순
퇴계 이황이 64세 때 도산서원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을 찾아온 제자 김취려에게 써 준 시는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자네는 아직 젊으니 열심히 노력하면 잘될 것이라 격려하는 대학자의 마음이 따뜻하다.
(p.139)
<자탄(自歎)>
이미 지난 세월이 나는 안타깝지만
그대는 이제부터 하면 되니 뭐가 문제인가
조금씩 흙을 쌓아 산을 이룰 그날까지
미적대지도 말고 너무 서둘지도 말게
‘미적대지도 말고, 너무 서둘지도 않는’ 적정속도. 이것이야말로 삶이라는 길에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아닐까. 산을 쌓아 올리는 길은 실로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자신만의 ‘적정속도’로 꾸준히 흙을 쌓아 올리다 보면 문득 태산이 되어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옛시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도 풍부하게 소개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일화와 감상을 곁들여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옛시를 읽다 보면 그때도 인간의 고민과 애환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옛시에 비유와 은유, 상징과 응축으로 녹아있는 감성을 잘 이해하는 경영자라면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않을까. ‘봄 볕치 풀리믄 또 조흔 일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 싶은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