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만고강산-萬古江山>을 소개하였다. 단가의 대부분은 중국 관련 지명이나 인물, 또는 명승고적 등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워 친숙미가 떨어지는 반면, <만고강산>은 금강산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 소재의 강릉 경포대(鏡浦臺), 양양의 낙산사(落山寺), 간성의 청간정(淸澗亭),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등을 구경하고, 봉래산에 올라 그 절경에 감탄한다는 내용이어서 친근감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 구절, “어화세상 벗님네야!. 상전벽해(桑田碧海) 웃들 마소. 엽진화락(葉盡花落)없을 손가. 서산에 걸린 해와 동령에 걸린 달은 머물게 하고, 한없이 놀고 가자.”로 맺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번 주에는 <광대가-廣大歌>를 소개한다. 이 단가는 조선 말기, 신재효(申在孝)의 단편가사로 판소리에 대한 미학적 측면을 강조한 내용이다. 처음 부분은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를 비롯한 유명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한바탕 꿈이라는 일장춘몽(一場春夢)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회를 밝히며 판소리를 전승시켜 온 광대들의 소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벽파(碧波)의 《가창대계》에 실려있는 <광대가>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열고 있다.
“고금에 호걸(豪傑) 문장(文章), 절창(絶唱)으로 지어내어 후세에 유전하나, 모두 다 허사로다.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와 조자건, 낙신부(洛神賦)는 그 말이 정녕한지, 뉘 눈으로 보았으며, 와룡(臥龍)선생 양보음(梁甫吟)은 삼장사(三壯士)의 탄식이요, 정절(靖節)선생 귀거래사(歸去來辭) 처사(處士)의 한정이라.”(가운데 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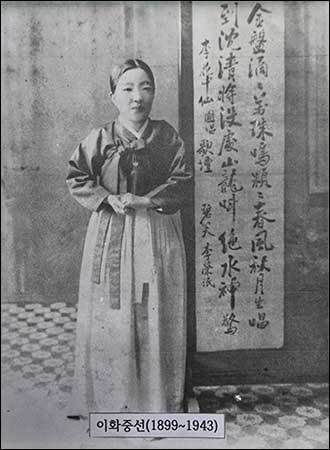
무엇보다도 이 <광대가>에는 소리 광대들이 갖추어야 할, 어려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이 대목은 작자, 신재효가 그 어려운 판소리를 얼마나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광대(廣大)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 지차(至次) 득음(得音)이요, 그 지차 너름새라. 너름새라 하는 것은 귀성 끼고, 맵시 있고, 경각(頃刻)에 천태만상 위선위귀(爲仙爲鬼) 천변만화(千變萬化), 좌상(座上)에 풍류호걸, 구경하는 노소(老少)남녀(男女) 웃게 하고 울게 하니, 어찌 아니 어려우며, 득음(得音)이라 하는 것은 5음을 분별하고 6율을 변화하여 오장(五臟)에 나는 소리 농락하여 자아낼 제, 그도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정금미옥(精金美玉)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보단장 미부인이 병풍 뒤에 나서는 듯, 삼오야 밝은 달이 구름 밖에 나오는 듯, 새 눈 뜨고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天生)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遠遠)한 이 속판이 소리 하는 법례(法禮)로다.”
여기서 인물치례를 첫째 조건으로 꼽는 점은 무엇일까? 인물이란 소리꾼의 외모가 아니라, 인품이나 기품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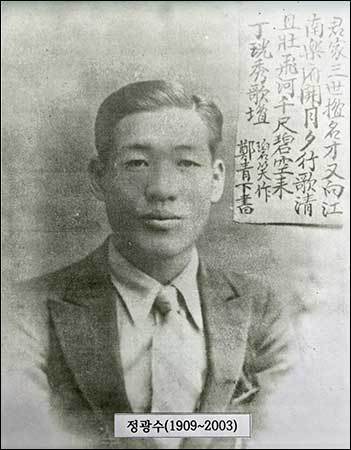
사설치례는 노랫말의 이해나 표현 능력의 구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득음(得音)이 될 것이다. 이 조건은 창자가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음악적 기교의 능숙함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수준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너름새는 노래와 함께 말이나 표정, 몸짓이 또한 주요 조건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러한 조건들과 관련하여 광대의 목 쓰는 기법에는 끌어내는 목, 돌리는 목, 높이 솟구치는 목, 아래로 굽이쳐 내리는 목, 등등 특이한 선율형에 따른 발성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연극적 대사, 곧 아니리의 구사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장단과의 호흡과 감정의 표출, 다시 말해 슬픈 느낌을 주는 애원성(哀怨聲)이나, 웅장한 느낌의 호령소리 등, 다양한 색깔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소리의 내면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대가에는 당대 뛰어난 판소리 명창들을 중국 당, 송, 대의 유명 문인들의 특성과 비교하기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는데, 그 일부를 들어보면, 송흥록(宋興祿)은 이태백, 모흥갑(牟興甲)은 두보(杜甫), 권삼득(權三得)은 한퇴지, 신만엽(申萬葉)은 두목지(杜牧之), 황해청(黃海淸)은 맹동야(孟洞野), 김제철(金齊喆)은 구양수(歐陽脩), 주덕기(朱德基)는 소동파(蘇東坡) 등과 각각 비유하고 있어 흥미롭다.
광대가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러한 광대들이 다 각기 소장으로 일세(一世) 천명(擅名) 하였으나
각색 구비 명창, 광대 어디 가 얻어 보리,
이 속을 알건마는 알고도 못 행하니 어찌 아니 답답하랴.“ (다음 주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