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이 회의에서 토론을 강조한 《조선왕조실록》 속의 기사로는 무엇이 있는가?
지난 호에 이어 기사 몇 개를 보자.
지난 호에서는 세종 즉위에 대해 명에 알리는 일(⟪세종실록⟫즉위년/8/13), 도당시험을 제술로 할 것인가 강경으로 할 것인가에서 제술
우위로 정한 일(⟪세종실록⟫1/2/23), 소금 공납을 줄이는 일(⟪세종실록⟫1/10/24)이었다. 이어서 이번에도 ‘당갱의지’의 몇 기사를 보자.
먼저는 가)격고(擊鼓, 임금의 거둥 때, 원통한 일을 상소하기 위해 북을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과 나)짚을 거두는 폐해에 대하여서다. 인권 신장을 위해 설치한 격고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문제다.
(허조가 참람하게 격고하는 무리를 징계하여 소송을 덜게 할 것을 아뢰다) 허조가 아뢰기를, "참람하게 격고(擊鼓)한 자를 성상께옵서 특히 백성을 사랑하시는 인덕(仁德)으로 죄책을 더하지 아니하옵시기 때문에, 북을 쳐서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사옵니다. 사헌부(司憲府)와 형관(刑官, 법률ㆍ소송ㆍ재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 안건 문서가 구름같이 쌓여서 두루 살필 수 없사오니, 마땅히 참람하게 격고하는 무리를 징계하시어 소송을 덜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나 원(元)나라에서 중서성(中書省)을 둔 것은 무릇 격고하여 소송하는 자는 순서를 밟지 않고 뛰어넘어서 아뢰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랫사람들의 사정이 임금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마침내 대란(大亂)을 일으켰으매, 명나라의 태종 황제는 원나라의 실책을 거울삼아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대궐 안에 들어와 원통함을 호소하게 하고, 황제가 모두 친히 재결(裁決)하였다."
... 신개(申槪)는 아뢰기를, "신하는 아래에서 수고하고 임금은 위에서 편안한 것이옵는데, 전하로서 친히 작은 일을 재결하시오면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문에 ‘망고오결(妄告誤決)’이란 말이 있으니, 마땅히 이 율문으로써 지나치게 호소하는 무리들을 죄줄 것이다. 징계하여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산골짜기와 들판을 모두 사전(私田)으로 삼는 폐단에 대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것은 전조(前朝)의 쇠해 가는 말기의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짚을 거두는 데에 일정한 수량이 있는가. ... 그 짚을 거두어서 나눠 줌이 어떨까." 하니,
신개와 황희 등이 대답하기를, "짚을 거두는 까닭으로 폐단이 있사오면 단지 조세(租稅)만 받는 것이 옳사오니, 하필 짚을 관가에서 거두어서 나눠 주게 하오리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받던 수량을 요량하여 감하고 관가에서 거두어 나눠 준다면, 벼슬아치는 거의 궁핍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요, 백성에게도 폐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이를 다시 의논하라." 當更議之 하였다. (⟪세종실록⟫14/12/3)
그리고 세종의 독창적 토지정책이라 할 공법(貢法)에 대한 논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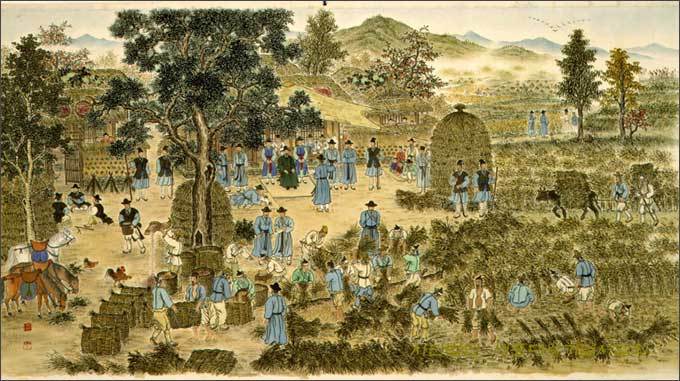
(황희ㆍ안순ㆍ신개ㆍ하연ㆍ심도원 등과 공법을 의논하다) 영의정 황희(黃喜) 등을 불러서 공법(貢法)을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말하기를, "각도 안에 혹은 좌ㆍ우도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혹은 경계를 나눈 우두머리 고을에는 토지의 품질이 비옥하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여 전연 다르니, 마땅히 토지대장을 상고해서 지난해의 손실(損實)에 따라 어느 고을은 상등(上等)으로 하고, 어느 고을은 중ㆍ하등(中下等)으로 하여 조세 받는 수를 작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경솔하게 할 것이 못되니, 내일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18/5/21)
다음으로 신중히 처리할 문제로는 하삼도 주민을 북방 국경 방지를 위해 함길도로 옮기는 주요한 일이었다.
(이휘가 함길도로 하삼도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미룰 것을 건의하다) 좌정언(左正言) 이휘(李徽)가 아뢰기를, "올해는 함길도(咸吉道)에서 수재(水災)로 인해 곡식이 잘 안돼서 백성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차 올봄에 하삼도(下三道)의 백성 2백여 호를 옮겨다가 이 도(道)에 입거(入居)시키고자 하오나, ... 생각하기를, 이 도에 오래 살고 있는 인민들도 오히려 굶주림을 면치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 새로 옮겨가는 백성들이 어찌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 비록 풍년을 기다려서 입거시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 평안도에도 수재가 있사온데, 지금 평양에다 영전(影殿)을 짓고 굶주린 백성들이 그 공사에 출역(出役)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사오니, 청하건대 정지(停止)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입거(入居)시키는 일과 성을 쌓는 등의 일에 대하여는 대간(臺諫)에서 간쟁(諫諍)한 지가 오래되나, 내가 처음부터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음은 그 일의 관계됨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마땅히 다시 의논해 보겠다." 然當更議之. (⟪세종실록⟫24/9/25)
또 중요한 일은 강도짓을 한 귀화인에 대한 처벌 문제였다.
(강도짓을 한 귀화 야인 동산에게 장 80대를 집행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귀화한 야인(野人) 동산(童山)이 노상(路上)에서 활을 당겨서 백성 득춘(得春)을 위협하여 재물과 말을 빼앗았는데, 득춘이 동산(童山)의 종을 통하여 주인의 이름을 물으니, 종이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동산이 일이 탄로될까 두려워하여 말[馬]을 거주하고 있는 중부(中部)에 바치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 주인 없는 말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고장(告狀)하니, 청하옵건대 강도(强盜)의 율(律)로써 참형(斬刑)으로 논죄(論罪)하소서."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그 경과는 ‘강도짓을 했으면 죽이는 죄는 세 번 조사하여야 하고 여러 자취가 많은데 강도로 논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뢴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도승지 황수신(黃守身)이 아뢰기를,
"귀화인에 대한 감죄(減罪)는 국가에서 일정한 법이 있으니, 또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마땅히 다시 의논해야 當更議之 될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 율(律)을 특별히 명하여 감등(減等)시켜 다만 장 80대만 집행하게 하였다." (⟪세종실록⟫28/11/20)
사람의 처벌 문제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한 결같이 신중한 문제에 대하여는 한 번의 토의로 끝내지 않고 ‘당연히 다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