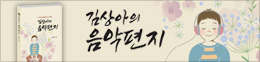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우리문화신문=석화 시인] 1999년 가을, 나는 사이판에서 귀국한지 며칠 만에 아들애의 손을 잡고 시장구경에 나섰다. 몇 년 만에 와보는 서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처음 들린 과일매장에는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주런하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군침을 꿀꺽 삼키며 아들애한테 물었다.
“뭘 먹을 거야?”
먹을 걸 사주면 좋아할 줄 알았던 아들애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몇 번 권했지만 아들애는 여전히 싫다고 했다.
“그럼 놀이감을 살까?”
나는 놀이감 매장 앞에 가서 아들애보고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다. 이번에도 아들애는 한사코 싫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자고 내 손을 잡아끌었다.
“그럼 다른 데로 가볼까?”
“아무것도 안 살 거야. 놀이감이랑 먹을 거랑 사구 돈을 다 써버리믄 엄마가 또 사이판에 갈까봐 싫어.”

순간 나는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엇이 욱- 올리 밀었다. 엄마 없는 세월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럴까?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1995년도 다 저물어가던 11월18일, 나는 세 살 난 아들애를 남편한테 맡기고 로무일군들의 행렬에 끼워 사이판으로 떠나갔다. 태평양을 날아넘어 사이판에 도착했을 때는 세 번째 날인 21일 새벽이었다. 행장을 풀고 한 두어 시간 눈을 붙였을까 출근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우리 일행은 관리일군을 따라 현장에 들어섰다. 수백 대 기계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관리일군의 배치대로 재단, 봉제, 완성 라인들에 골고루 널려 일하게 되였다. 나는 만들어진 옷을 다림질하는 이른바 완성다림이공으로 배치 받았다. 류수작업*이다보니 옷 하나를 한 사람이 다 다리는 게 아니고 부분을 나눠서 다리는데 나는 소매를 다리였다. 소매는 다리미판 위에 놓고 다리는 게 아니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다리미를 들고 다리였다.
현장은 수백 개의 모터가 돌아 그 열기로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찜통이 따로 없었다. 에어콘 대신 낡아빠진 선풍기 몇 대가 힘없이 돌며 바람을 몰아오고 있었는데 덩치만 컸지 찜통더위를 몰아내기에는 어림 반 푼도 없었다. 처음으로 다리미 앞에 선 나는 가슴과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잠간 새에 입고 있던 반팔 면티와 반바지를 물참봉으로 만들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은 미처 닦을 새도 없이 눈에 흘러들어 눈은 아리고 뻘겋게 부어있었다.
내가 괜찮을 거라 여겼던 다림질은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았다. 하루 기본 열두 시간 그리고 잔업으로 열네 시간 또는 열여섯 시간을 일하였다. 정심식사 저녁식사시간을 빼고는 꼬박 서서 다림질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더구나 일여덟 근(7~8근, 1근=0.6kg)은 잘 될 것 같은 다리미를 하루 종일 치켜들고 일 한다는 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알 수 없었다. 손바닥은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기를 무수히 반복했다. 피가 빠알갛게 배어나온 손바닥으로 이튿날 다리미를 꼭 잡을 수 없어 엉거주춤 쥐였다. 탁ㅡ 육중한 다리미가 손에서 빠지는 바람에 발등에 탁 부딪혔다. 가뜩이나 부은 발등이 시퍼렇게 더 부어올랐다.
고생 중에서도 그리운 고생이 마지막 고생이라던 말이 생각났다. 사이판에서 더운 고생 힘든 고생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애에 대한 그리움만은 참을 수 없었다. 사이판으로 떠나오던 날 기차역에서 영문 모르는 아들애가 엄마랑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줄 알고 퐁퐁 뛰며 좋아하다가 기차가 떠나자 와- 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던 모습이 아련히 젖어와 일을 하다가도 돌아서서 가만히 눈물을 훔치었다.
그때는 편지가 유일한 통신수단이었다. 배달원이 정심 저녁시간을 맞춰 편지를 한 자루씩 날라 왔다. 편지무지를 뒤적이다가 자기 편지가 있는 사람은 너무 좋아 애들처럼 퐁퐁 뛰면서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부터 펑펑 쏟는다. 내가 첫 편지를 받은 건 집을 떠나서 꼭 한 달만이었다. 편지에서 남편은 내가 제일 걱정하는 아들애가 엄마가 떠난 뒤 수많이 셈이 들었다*고 했다. 한번은 뛰놀아야 할 아들애가 하도 조용하길래 찾아보니 방구석에 엎드려 엄마사진을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는데 얼굴에는 흐르다 마른 눈물자국이 있더란다.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그만 울어버렸다.
어느 주말에는 바다로 나갔다. 스물여덟 해를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하는 바다구경이 눈곱만치도 즐거운 줄 몰랐다. 검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앉으니 아들애가 더욱 못 견디게 그리워 또 울고 말았다. 하얀 모래 위에 아들애의 이름을 적으며 목이 터져라 불러 보았다. 만약 회사에서 말미를 주어 집으로 왔다간다면 나는 그 요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와서 아들애를 보고 갔을 거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일 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물집이 생기던 손바닥은 차츰 딱딱해 지더니 더는 물집도 생기지 않았고 피가 나도록 아프지도 않았다. 대신 손바닥이 아닌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아프기보다는 백배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장이 와서 날보고 래일부터 봉제라인에 앉으라고 했다. 이젠 앉아서 일하게 되어서 다리 아픈 고생은 하지 않겠구나 했지만 이 일은 야밤삼경 심산길 걷기*였다. 기계를 다루는 것조차 서투른데 시간당 50장 임무를 완성해야 했다. 마음은 급하고 긴장한 나머지 서서 일할 때보다 땀이 배로 흘러내렸다. 깔고 앉은 방석은 땀에 젖어 축축해 있었다.
봉제라인에서 일한지 일 년 가까이 되였을 때였다. 한번은 회사에서 이튿날 반납할 완성품에서 불량이 백여 장이나 나왔다. 제시간에 반납 못 하면 회사 측에서 거액의 벌금을 안게 되였다. 관리자는 노발대발 했다. 기실 그 불량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었는데 불똥이 나한테로 몽땅 튕긴 것이다.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결혼해서 5년 동안 시내 동서남북 변두리에 있는 눅거리세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지긋지긋했고 더구나 2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게 할 수 없었다.
(제시간에 고쳐서 본때를 보여 줄 거야.)
그날 밤 나는 커다란 작업현장에 혼자 남아 불량품을 고쳤다. 그러면서 아들애를 생각했다.
(아들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엄마가 돌아가거들랑 다시는 널 떼어두고 이렇게 정처 없이 멀리 떠나오지 않을 거다. 사이판으로 떠나오기 전 엄마 주머니 사정을 알 수 없는 네가 시장골목에서 놀이감자동차를 사달라고 발버둥 쳤지. 그러는 너를 한사코 끌고 돌아선 게 이다지도 가슴 아플 줄은 진짜 몰랐단다. 이제 돈을 벌고 돌아가거들랑 엄마는 네가 사달란 걸 뭐든지 다 사줄 거야. 그것이 필요하든 말든 값이야 얼마나 비싸든 상관없이 다 사줄 거야. 그것이 남들이 말하는 눈먼 사랑일지라도 말이다.)
마지막 불량품을 다 고쳤을 때는 이튿날 출근시간인 여덟시가 되였다. 이렇게 2년 계약기한을 마치고 다시 2년을 더 했다. 그리고 집 떠나 4년만인1999년 가을,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땀과 눈물을 자아냈던 사이판과 “안녕”을 고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 꿈과 희망을 싣고 비행기는 점점 높이 날아올랐다. 그때 내가 속으로 수없이 외운 말이 있으니 바로 이 말이다. “사이판아, 잘 있거라.”
아들애의 손목을 잡고 시장을 나서자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네거리가 너무나도 정답게 안겨왔다. 나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어려운 고개를 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랑, 네 아빠랑 오손도손 잘 살 일만 남았다. 그치.”
(주)
* 류수작업 :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연속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체계
* 야밤삼경 심산길 걷기 :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의 길을 걷듯이 어렵다는 뜻
* 수많이 셈이 들었다 : 셈(수)를 헤아림 = 철이 들다
*눅거리세집 : 싸게 내놓은 형편없는 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