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아들아! / 그 목숨 떨궈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 조선인의 투지를 보였으니 / 너의 죽음이 어찌 헛되랴” 이윤옥 시집 ≪서간도에 들꽃 피다≫ 2권에 나오는 김상옥 의사의 어머니 김점순 여사에 대한 헌시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의로운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시 일제 경찰력의 중심부이자 독립운동가 검거와 탄압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뒤 신출귀몰한 모습으로 경찰을 따돌립니다. 그 뒤 삼판동(현 후암동)에서 일격을 치른 다음 또 다시 포위망을 뚫고 효제동 동지의 집에 숨었습니다. 이후 마침내 은신처를 찾은 일경은 경기도 경찰부장의 지휘 아래 시내 4개 경찰서에서 차출한 천여 명의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1월 22일 새벽 5시반 무렵 김 의사가 숨은 집을 겹겹이 포위하였지요. 이에 김상옥 의사는 양손에 권총을 들고 인근 집들의 지붕을 타고 넘나들며 무장결찰과 치열한 격전을 벌입니다. 조국독립의 염원을 담은 그의 총구는 쉴 새 없이 불을 뿜었고 대한 남아의 기백을 여지없이 떨친 의사에게 일경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시간여의 치열한 전투 끝에 여러 명의 일경을 사살하였으나 탄환이 떨어지자 마지막 탄환이 든

비오는 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빨간 빛깔의 공중전화를 기억하시나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둘 꺼내 딸깍딸깍 공전전화에 넣습니다. 동전을 넣고 나면 그제야 신호음이 들리고 수첩에 적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다이얼을 돌립니다. 잠시 뒤 전선을 타고 사랑스러운 그녀의 음성이 들려오면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그리고 동전이 다돼 통화가 끊길까봐 부지런히 또 다른 동전을 넣어가며 한 손으론 전화 줄을 잡은 채 심호흡을 해가며 그녀와의 통화에 열중하느라 뒷줄에 서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 손말틀(휴대폰)이 없을 때 젊은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풍경입니다. 이때의 또 다른 풍경은 약속시간에 애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애타는 마음으로 공중전화에 다시 매달리기도 하지요. 공중전화가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시절에는 종종 불미스런 일도 생겼습니다. "공중전화 오래 쓴다."는 핀잔을 들은 젊은이가 핀잔을 준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일이 2004년만 해도 이런 일어났던 적이 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듯합니다. 마을 어귀 구멍가

예전엔 참으로 가기 어려웠던 섬 제주! 이제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5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제주에는 볼거리도 많지만 특이한 먹거리도 많지요. 그 가운데 제주도에 가면 꼭 먹어보아야 한다는 음식, 메밀가루 부꾸미에 채 썰어 데쳐낸 무소를 넣고 말아서 만드는 제주도의 별미음식이 빙떡입니다. 메밀 부꾸미의 담백한 맛과 무소의 삼삼하고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 떡이지요. 남원읍에서는 말아 놓은 모습이 흡사 멍석과 같다하여 ‘멍석떡’이라고 하며, 3대 봉양을 제외한 작은 제사에서 약식으로 제물을 차릴 때 꼭 쓴다고 하여 ‘홀아방떡’ 또는 ‘홀애비떡’이라고 하고 서귀포에서는 ‘전기떡’(쟁기떡)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빙떡은 만드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빠른 시간에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떡인데 이웃이 잔치가 있거나 상을 당하면 ‘대차롱’(뚜껑이 있는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한 바구니씩 보냈습니다. 이때 부조를 받은 집의 여주인은 떡을 손으로 떼어내어 함께 쫓아온 귀신의 몫으로 밖으로 던져 잡신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한 뒤 모두가 함께

송나라 학자 태평노인(太平老人)은 고려청자에 반한 나머지 '수중금(袖中錦ㆍ소매 속에 간직할 귀한 것)'이란 글에서 '고려비색 천하제일'이라 적었다고 하지요. 그 비색청자전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비색청자전에 전시된 작품 가운데 국보 제61호 “청자어룡형주전자(靑磁魚龍形酒煎子)”는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지요. 높이 24.4cm, 몸통지름 13.5cm의 이 주전자는 물고기 꼬리 모양을 한 뚜껑에 술을 붓고 용 주둥이로 술을 따르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듯 섬세하게 만들어진 용의 머리에, 날아오를 듯한 물고기의 몸을 갖춘 모양입니다. 용머리에 물고기 몸통, 이런 상상의 동물을 ‘어룡(魚龍)’이라 부르는데 힘차게 펼쳐진 지느러미와 치켜세운 꼬리가 마치 물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용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여 ‘비룡(飛龍)’이라고도 합니다. 그밖에 특이한 모양의 청자주전자로는 죽순모양의 몸체에 대나무 가지를 본뜬 손잡이와 귀때부리(주둥이)를 붙이고 뚜껑은 죽순의 끝을 잘라 올려놓은 형태의 죽순모양주전자가 있습니다.

“강석덕(姜碩德)은 성품이 청렴하고 의로우며 인품이 빼어나고, 옛 것을 좋아하였다. 과부(寡婦)가 된 어머니를 지극히 섬겼으며, 배다른 형제와 매우 화목하였다. (중략)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할 적엔 매우 치밀했으며, 집에 있을 때는 주변에 책을 놓고 향(香)불을 피우고 단정히 앉았으니, 고요하고 평안하여 영예를 구함이 없었다. 손수 ‘징분질욕(懲忿窒慾)’이란 네 글자를 써서 자리 곁에 붙여두고, 손에서는 책을 놓지 아니하였다.” 위는 세조실록 5년(1459) 9월 10일자에 나오는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강석덕의 졸기(卒記)입니다. “졸기”란 한 인물의 간결한 평가이지요. 조선 초기의 유명화가 강희안(姜希顔)과 뛰어난 문인 강희맹(姜希孟) 형제의 아버지인 강석덕은 스스로 “징분질욕(懲忿窒慾)” 곧 “분노(忿怒)를 참고 사욕(私慾)을 억제함”이라는 좌우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병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여러 아들에게 글을 읽게 하고는 이를 듣고 있을 정도였지요. 또 아들에게 말하길 “내가 먹은 나이가 60세가 되었는데, 비록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지마는 일을 행하는 데 계략과 사기(詐欺)가 없었으니,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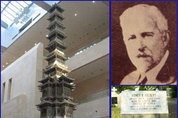
가내안전, 학업성취, 장사번성, 교통안전, 개운초복(開運招福) 정도면 인간 생활의 축복은 거의 대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을 빌기 위해 정초 일본인들이 신사나 절을 찾아 가는데 이러한 것을 하츠모우데(初詣)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일년 365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정초에 가는 것을 처음이라는 뜻의 하츠(初)를 붙여 하츠모우데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정초기도’ 정도로 해석 할 수 있다. 설날을 음력으로 세는 한국인들에게 양력설은 기껏해야 동해안 일출을 보러 가거나 12월 31일 날 보신각 타종소리를 들으러 종로에 나가거나 집에서 티브이를 모는 일 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양력설을 세는 일본인들에게 정초는 설날이자 신사참배를 가는 중요한 명절이다. 정초 신사참배 풍습은 도시코모리(年籠り)라고 해서 집안의 가장이 기도를 위해 그믐날 밤부터 정월 초하루에 걸쳐 씨신(氏神の社)의 사당에 들어가서 기도 하는 것을 일컬었다. 그러던 것이 그믐밤 참배와 정초참배로 나뉘어졌고 오늘날에는 정초 참배 형태가 주류이다. 이러한 정초기도 풍습은 명치시대(1868년) 중기부터 유래한 것으로 경성전철(京成電鐵) 같은 철도회사가 참배객 수송을 대대적으

예전에 밤이 되면 등잔불을 켜놓고 책도 읽고 바느질도 했었지요. 그 등잔불은 호롱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조선말기 우리나라엔 “남포등”이란 것이 들어왔지요. 남포등은 원래 네덜란드에서 만들어 휴대용으로 쓰였던 램프(lamp)인데 이것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면서 lamp → ランプ(람뽀) → 남포가 된 것입니다. 남포등은 석유램프, 석유등, 양등(洋燈), 호야등으로도 불렀지요. 남포등은 등잔불보다 더 밝고 편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을음이 많아 자고나면 콧구멍에서 검뎅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불을 좀 더 환하게 하려고 심지를 지나치게 올리면 그을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 그을음이 남포등 유리에 붙으면 불빛이 침침해지는 바람에 아침마다 그 유리를 닦는 것도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였지요. 하지만 남포등의 유리가 워낙 얇아서 잘 깨지니 조심조심해서 닦아야했습니다. 아들녀석이 효도한답시고 남포유리를 힘있게 닦다가 유리가 깨지기라도 하면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포등을 어떤 이는 과시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남포등은 어두운 밤에 걸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옆집이나 뒷집에서도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하기를 부잣집 광 속에는 구렁이 또는 족제비가 있는데 그것을 업(業)이라 이른다. 사람들이 흰죽을 쑤어 바치고 신처럼 대접한다.…(중략)… 구렁이가 집 광 밑에 굴을 뚫으면 광에 있는 곡식보다도 배 이상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렁이를 부귀사(富貴蛇)라 한다. …(중략)… 업이 달아나면 집이 따라서 망한다.” 위는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 ~ 1793)가 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 겨레는 구렁이를 집을 지켜주는 신으로 생각했고, 만일 구렁이가 집을 떠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뱀에 물리거나 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좋은 징조로 생각했지요. 그런가 하면 뱀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월 첫 뱀날[상사일(上巳日)]에는 머리를 빗지도 않고, 먼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경북 달성지방에서는 왼새끼를 꼬아 머리털을 묶고 약간 그을려 “뱀치자, 뱀치자”하고 외치기도 하지요. 그밖에 전북 정읍에서는 이삼만(李三晩)이란 사람의 이름을 써서 집안 모든 기둥에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뱀이 그 위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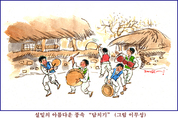
흔히 흑룡(黑龍) 곧 검은 용의 해라던 양력 임진년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연초 흑룡은 태왕(太王)인 황룡(黃龍)의 등 뒤에서 반란을 꾀하는 역적의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조선에 큰 상처를 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1592년)도 임진년이었고,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인 1952년도 임진년이었다는 설도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임진년이 어떤 해였는지요? 우리 겨레는 섣달그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세시풍속 “담치기”로 밝아오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풍물을 치고 다니면 어른들이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부대에 담아줍니다. 그렇게 걷은 곡식은 노인들만 있거나 환자가 있어가 가난하여 명절이 돼도 떡을 해먹을 수 없는 집을 골라 담 너머로 몰래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세시풍속은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해 액운이 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입춘의 “적선공덕행”이나 밭뙈기 하나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십시일반으로 곡식을 내어 마을 어른들을 위한 잔치를 했던 입동의 “치계미”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던 아름다운 풍속이었지요. 올

일본의 연말연시 풍경으로 한국인에게 낯선 게 있는데 바로 복주머니(福袋, 후쿠부쿠로) 풍습이다. 커다란 쇼핑 가방 속에 들어 있는 물건들은 옷, 신발, 속옷, 액세서리, 장난감, 과자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는데도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류가 들어 있다면 사이즈나 색상 디자인을 알 수 없는데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게 신기하다. 실제로 내가 아는 지인의 딸은 정초에 커다란 복주머니 가방을 여러 개 사들고 낑낑 거리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정초에 백화점에서 파는 복주머니는 대개 젊은 10대나 20대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사지만 더러는 중년들도 있다. 새해를 코앞에 둔 지금쯤 슬슬 일본의 상점가는 정초에 팔 복주머니 만들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복주머니 내용물도 옷이나 액세서리를 벗어나 여행 상품권, 맨션아파트, 자동차, 운전교습소 수강권, 맞선 대상 등 기발한 품목이 ‘복주머니’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행성을 조작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복주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