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이진경 문화평론가] 거문고 연주자 박은혜가 계묘년이 저물어 가는 2023년 12월 27일 밤 8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다섯 번째 거문고 독주회를 열었다. 중앙대학교 이형환 교수의 사회로 문을 연 거문고 독주회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연주곡들로 가득하였다. 신쾌동류 거문고 풍류 상현도드리와 하현도드리에 이어 거문고 독주곡의 백미인 신쾌동류 짧은 산조가 연주되었다. 이수자의 길을 걷고 있는 박은혜 연주자의 거문고연주는 관객들의 추임새를 끌어내기에 충분하였다. 필자가 숱한 거문고 독주회 가운데 박은혜 연주자의 공연을 보고 글을 쓰게 된 것은 산조 때문만은 아니다. 거문고 산조 연주 이후 소개되는 곡들이 기존의 독주회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거문고 창작곡인 ‘행복한 우리 살림ㆍ첫봉화’가 눈에 띄었다. 개방현을 우렁차게 울리며 박력있고 화려하게 연주하는 것이 한국의 창작곡들과 다르다. 오른손으로 줄을 뜨는 연주법이 인상에 남는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악기 개량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거문고는 개량되지 못해 거문고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북한의 거문고 창작곡은 모두 9곡이며 가야금 연주자들이 부전공으로 명맥을 이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금은 반짝이며 노란색을 띠는 금속이다. 원소기호 ‘Au’는 금을 나타내는 라틴어 'aurum'에서 따온 것이다. 한자로는 '金'으로 표기하는데, 이때의 금은 ‘쇠 금’으로서 금속(金屬)'을 말한다. 곧 金은 금과 금속 두 가지 뜻이 있다. 금속의 우리말은 쇠붙이이며 금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남아있지 않다. 신라인은 금을 비롯한 금속 전반을 모두 金이라는 한자로 옮겼고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을 앞에 붙여 구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인은 금을 나륜세(那論歲)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는 중세 한국어 어휘 '노ᄅᆞᆫ쇠〮(노란 쇠)'에 대응한다. 이후 조선 초기부터는 금을 그냥 한자어인 '金'이라고 불렀고, 노란 쇠를 비롯한 고유어 표현은 이에 밀려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금은 전성(展性)이 매우 우수해서 얇은 판이나 실로 가공할 수 있다. 전성이 강하다는 것은 물렁물렁하기는 하지만 잡아 늘이거나 강한 힘을 가한다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을 얇게 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펴지며 1μm (1/1000 mm) 이하의 두께까지 펼칠 수 있어서 뒤가 비쳐 보이는 얇은 금박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무언가를 금으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이제 며칠 후면 계묘년 토끼해가 지나고 곧 갑진년 용띠해가 밝는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일본에서는 오오소우지(大掃除, 대청소)를 하고 연말이면 도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 해넘이 국수)를 먹는다. 그런가 하면 집 대문에 시메카자리( 注連飾り, 금줄)를 매달고 집이나 상가 앞에 카도마츠(門松, 소나무장식)를 세워 나쁜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기원한다. 시메카자리는 연말에 집 대문에 매다는 장식으로 짚을 꼬아 만든 줄에 흰 종이를 끼워 만드는데 요즈음은 편의점 따위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장식은 농사의 신(稻作信仰)을 받드는 의식에서 유래한 것인데 풍년을 기원하고 나쁜 액운을 멀리하려는 뜻으로 신도(神道)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나라신(國神)인 천조대신(天照大神)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시메카자리는 12월 말에 대문에 장식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1월 7일 이후에 치우는 게 보통이다. 관서지방에서는 1월 15일에 치우고, 미에현(三重縣 伊勢志摩) 같은 지방에서는 1년 내내 장식하는 곳도 있는 등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카도마츠”는 12월 13일에서 28일 사이에 집 앞이나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열심히 정치하라는 뜻의 한자어는 근정(勤政)입니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의 가장 중심 건물이 근정전(勤政殿)이니 그 중요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수록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근정적망국군(勤政的亡國君)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쓸데없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와 친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청(親明背靑)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가 병자호란으로 이어져 삼전도의 굴욕으로 남아있기는 하지요. 어찌 되었거나 명나라가 망하고도 조선의 명나라 사랑은 지속되었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16대 황제가 숭정황제인데 그 숭정 연호를 200년 넘게 사용했으니까요. (원래 연호는 황제가 죽거나 바뀌면 연호가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멸망을 초래한 마지막 임금이나 황제의 기록은 좋지 않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숭정제는 망국의 황제인데도 비교적 평가가 좋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지요. 숭정제는 통찰력이 있고, 신중하며, 주도면밀해서 부지런하다는 장점이 있는 군주였습니다. 업무 능력과 근면함은 명나라 역사상 비슷한 황제를 찾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세계적인 부자는 참 많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넘쳐나도,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만 못하다. ‘그들은 부자가 된 뒤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서사는 많아도, 부자가 되어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서사는 훨씬 적다. 이향안이 쓴 책,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 진짜 부자들》은 나눔을 실천한 전 세계의 부자들과 지식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다룬 책이다.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낸 사업가 워렌 버핏부터 나눔의 정신을 세계에 퍼트린 배우 오드리 헵번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 그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인물은 김만덕, 후세 다츠지, 전형필 세 명이다. 잘 알려진 대로 김만덕은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한 제주 백성들을 구한 제주의 거상이며, 전형필은 우리 겨레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쓴 수장가다. 그런데 후세 다츠지는 무척 새롭다. 그는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법정에 선 일본 변호사다. 1880년 미야기현에서 태어나 메이지 법률학교에서 법 공부를 한 뒤, 23살의 젊은 나이로 판검사 시험에 합격한 촉망받는 법조인이었다. 인정받은 실력을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김영수 시인이 세 번째 시집 《탐라의 하늘을 올려다보면》을 내셨습니다. 형수님이 – 김 시인이 대학 선배이시기에, 형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김 선배는 2021년 12월 형수님과 함께 아예 제주로 내려가, 탐라의 곳곳에 발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탐라의 자연에서 아름다운 시어(詩語)를 건져 올리셨는데, 이번에 이를 모아 시집을 내셨네요. 시집 첫머리에 나오는 선배의 말을 들으니, 김 선배가 제주에 온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술 속에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선배가 제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들을 찾아보는 것이었답니다. 김 선배는 관동별곡처럼 선인(先人)들이 제주 경관을 노래한 시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현대에 와서도 제주 관련 시들은 많았지만, 놀랍게도 제주의 자연을 노래한 시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김 선배님 말입니다. “내가 해보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다.” 그래서 김 선배는 그러한 시를 짓기 위해 우선 제주의 지질을 연구한 책을 사서 읽었으며, 제주의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마나즈루에 도대체 뭐가 있니?' 엄마는 애절한 얼굴로 물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내 목소리였고 그대로 현관을 나왔다. 도쿄역까지 가는 전철은 굉장히 붐볐다.” 이는 소설 《마나즈루》의 주인공 케이의 말이다. 케이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 마나즈루를 향해 오늘도 발걸음을 옮긴다. 그녀가 마나즈루로 발걸음을 옮기는 날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마음이 심란한 때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외로울 때, 그리고 12년 전 실종된 남편의 흔적이 몹시도 그리울 때 그녀는 마나즈루행 열차에 몸을 싣는다. 얼마 전, 아끼는 후배로부터 소설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후배는 가와카미 히로미 작품인 소설 《마나즈루》를 번역했다고 하면서 사인까지 곱게 해서 책을 보내왔다. 책 표지에 두른 띠지(출판사에서 홍보하기 위한 책 광고 문구 등이 기재됨)에는 “추리소설과 여행기, 우아한 에로티시즘을 결합한 꿈 같은 작품”이란 광고 문구가 쓰여있다. 아담한 크기의 소설책을 받아 든 나는 책장을 대충 넘겨본 뒤 책상 위 한쪽에 한동안 방치(?)했다. 사실 나는 요즘 소설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p.34) 천하의 일이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게으르면 망하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정사(政事)와 같은 큰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천하의 일이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게으르면 망한다…자못 모골이 송연해진다. 군주에게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고, 게으르면 망한다고 ‘돌직구’를 날리는 정도전의 기개가 매섭다. 심지어 건물 이름도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는 뜻의 ‘근정전(勤政殿)’이니, 거기서 정사를 보는 임금은 자신도 모르게 태도가 엄정해지지 않았을까? 조선왕조는 문치 국가였다. 과거에 합격한 인재들은 모두 시작(詩作) 능력이 출중했다. 시 짓는 솜씨가 문재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이었으니, 어릴 때부터 시를 쓰며 자라난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필수 교양으로 시를 쓰고 읊었다. 조정에 출사한 최고의 문사(文士)들이 임금 곁에 머물며 늘 바라보는 장소가 경복궁이었던 만큼, 이들이 경복궁에 대해 지은 시문도 많이 남아 있다. 한문학자인 지은이 박순이 쓴 이 책, 《시가 흐르는 경복궁》은 경복궁을 주제로 옛 문인들이 쓴 글과 시에 지은이의 독창적인 관점을 덧붙인 책이다. 책에 실린 글이 모두 깊이 음미할 만하지만, 그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님이 쓴 《한국인이 알아야 할 한국문화 이야기》에는 조선의 도자기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자철화끈무늬병 이야기도 나오네요. 술병의 경우 술을 마시다 남으면 허리춤에 차고 가라고 술병에 끈을 동여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백자철화끈무늬병은 이 끈을 아예 백자 속에 무늬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끈이 달려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끈을 휙~ 그려 넣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청색 선을 미리 긋고 이를 따라 끈을 그린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어쨌든 끈은 한 번에 그렸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박물관에서 이 백자를 보았을 때, 이 끈을 그려 넣은 조선 도공의 해학에 감탄하던 생각이 납니다. 이 백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 병이라고 하데요. 하하! 달리 보면 백자가 넥타이를 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자 밑바닥에는 ‘니ᄂᆞ히’라고 쓰여 있습니다. 글씨체로 보아 끈을 그린 도공이 내처 바닥에 이 글씨를 쓴 것 같습니다. 뭘까? 자신의 서명인가? 아니면 ‘니나노~’ 하듯이 흥겨운 감정을 표출한 것일까? 하여튼 백자철화끈무늬병은 조선 도자기 가운데 가장 해학이 넘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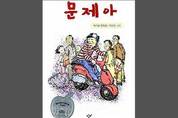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세요?" 그러자 부인은 웃으면서 기자에게 말합니다. "아뇨 하지만 전 아인슈타인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가끔 우린 중요한 본질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하여 가르침의 효과를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태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는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성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것처럼 우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보다 아이들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대단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버렸어 10대 초반에 질서도 안 지킨 놈들이 이제는 질서를 세우네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공부 안 하길 참 잘했네 공부는 안 했지만 난 넘 기특해 전교 1등도 날 보면 기겁해" 학교는 교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인 것이 맞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