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경제=김영조 기자] 오늘은우리 겨레의 가장 큰 명절 한가위다. 우리 겨레는 설이나 한가위 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혼인이나 아기의 돌잔치 때에도 떡을 해먹었다. 그런가하면 제사 때도 떡이 쓰였으니 떡과의 인연이 참으로 깊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떡과 관련한 속담이 많다. 귀신도 떡 하나로 쫓는다. 귀신 떡 먹듯 한다. 귀신에게 비는 데는 시루떡이 제일이다. 아닌 밤중에 웬 찰시루떡이냐? 귀신은 떡으로 사귀고 사람은 정으로 사귄다. 떡 본 귀신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없는 제사에 절만 한다. 떡이 있어야 굿도 한다. 제사떡도 커야 귀신이 좋아한다. 떡시루 김이 오르기 전에 남이 들어서면 떡이 선다. 떡 찌다가 뒷간에 갔다 오면 부정탄다. ▲ 안동소주박물관에 전시된 화려한 떡들 이처럼 제사나 잔치 등 크고 작은 애경사에는 떡이 빠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귀신에게 공양하는 떡도 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 싶다. 떡은 곡식가루를 찌거나 삶아 익힌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헌에 오른 떡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루떡(증병) : 곡식 가루를 시루에서 익힌 떡으로 시루의 등장과 함께 있어온 떡이다. 시루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백설기

[그린경제=김영조 기자] 꽃 내가 그의 이름을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김춘수는 꽃을 노래한다. ▲ 난의 향기(뉴스툰) 세상의 향기 그는 빛깔과 향기가 있는 꽃을 노래한다. 빛깔과 더불어 향기가 없으면 꽃이 아니란다. 이런 향기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람은 살짝 스치는 여인의 머리에서 나는 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샤넬 number9"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젖냄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카시아향을 좋아한다. 세상엔 참으로 향기가 많다. 꽃향기가 있는가 하면 풀향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음악의 향기가 있다. 숲향기, 자연의 향기, 보랏빛 향기, 천년의 향기, 여름 향기, 고향의 향기, 흙의 향기, 절의 향기, 신록의 향기, 연인의 향기, 소주의 향기, 전통의 향기, 문학 향기, 입술의 향기, 아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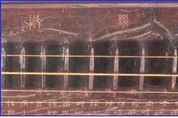
[그린경제=김영조 기자] ▲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거문고 연주도 과학이 만들어낸 거문고와 가야금의 아름다움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공동연구소가 얼마 전 가야금에 대해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울림통 위에 가루를 뿌린 뒤 주파수를 달리해 진동을 가하는 ‘클라드니 도형’ 실험이다. 그 결과, 현에서 생기는 주파수인 100헤르츠에서는 울림통이 떨렸지만 현이 만들지 않는 주파수인 80헤르츠에서는 울림통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현이 떨릴 때 울림통도 같이 떨려야 한다는 '고운 소리의 비결'을 눈으로 입증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야금과 거문고의 울림통 재료로 쓰는 오동나무의 상피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세포의 벽이 얇고 유연하며, 비중도 0.3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바이올린의 재료인 가문비나무는 규칙적이며 촘촘한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우리의 현악기는 바이올린에 비해 음색이 부드럽다고 한다. 또 울림통 재료가 되는 나무 무늬의 형태도 소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좋은 가야금과 거문고는 일반적으로 국수무늬 목재를 사용한 울림통이다. 국수무늬는 늙은 나무의 중심부를 긁어낸 목재가 아래로 쭉 뻗은 무늬를 갖고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늙은 나

[그린경제=김영조 기자] 송강 정철은 “성산별곡”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세상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는가?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구나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을 타자꾸나.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도다“ 험한 세상사를 잊고, 벗과 함께 술을 권커니 자커니 하다가 거문고를 타니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니 술 탓일까 거문고 탓일까? 벗과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혼자 즐기는 거문고의 세계도 절제와 내면세계로의 침잠을 통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고 소리(琴)와 하나가 되는 주객일체의 경지로 갔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 한민택의 연주 ▲ 중국 지린성 지안의 장천 1호분 벽화, 여성의 거문고 반주에 맞춰 남자가 춤을 춘다. 금은 중국 악기, 거문고는 한국음악을 위한 악기 고구려의 옛 서울인 만주 지안현[輯安縣]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고분 무용총 벽화와 제17호분에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4현 17괘의 현악기가 그려져 있고, 또 안악에서 발굴된 고분 제3호의 무안도(舞樂圖)에도 거문고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