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서한범 명예교수] 지난 속풀이에서는 종묘제례에서 둘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의 이야기와 종헌례, 철변두, 송신례와 관련된 음악이야기를 하였다.
아헌례에 쓰이는 정대업의 음악적 분위기는 보태평과 달리, 씩씩하고 활달하며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란 점, 둘째 잔을 올리는 의미는 조상의 외적인 업적, 즉 무(武)와 공(功)을 칭송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음악의 시작은 진고십통이라고 해서 큰 북을 10회 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일무는 무무라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종헌례는 셋째잔을 올리는 의식이며 음악이나 춤은 아헌례와 동일하지만, 음악을 끝낼 때는 대금십차(大金十次), 즉 징을 10회 쳐서 음악을 끝낸다는 점, 종묘의 제례음악에서 시작은 북소리, 종료는 쇳소리를 내는 것은 고진퇴금(鼓進退金)으로 옛 전쟁터에서 북소리 울리거든 진격, 쇳소리 나면 퇴각이라는 전술에서 유래되었다는 점, 다음의 의식은 철변두와 송신(送神)례로 이어지며 음악은 공히 <진찬>이란 점, 특히 종묘제례악은 1920년대 초, 조선의 음악을 살피기 위해 나온 일본의 다나베 히사오(田邊常雄)를 감동시켰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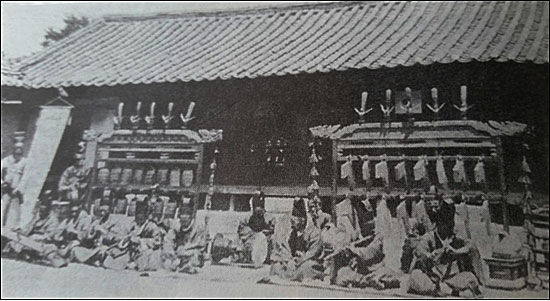
▲ 다나베가 찍어 책에 올린 "종묘등가악(宗廟登歌樂)" 1921년대
민족혼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아악부를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동물원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구경거리를 만들어 줄까, 그도 아니면 일본 음악에 흡수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일본 음악의 권위자였던 다나베를 조선에 파견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당시 아악부를 지켜오던 노악사들의 심경은 과연 어떠했을까?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궁중음악을 이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것도 일본인 음악가 앞에서 시험대상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피리를 불었고 , 대금을 불었으며 북 장고를 쳤을 것이다. 단지 소리를 내어 가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응원을 청하며 정성을 다해 마지막 연주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
다나베는 이 음악을 듣고“ 감동적이다. 실로 세계의 보배인 이 음악을 동양의 음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일본인으로 식민지의 음악을 듣고 난 후, 음악가적인 양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존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진정 무엇이 그를 감동시킨 것일까?
무엇보다도 혼연일체가 된 악사들의 수준 높은 연주가 결정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생 이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해 온 악사들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절박감에서 혼신을 다한 연주에 그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종묘제례악>이라는 음악 속에 녹아있는 한민족의 혼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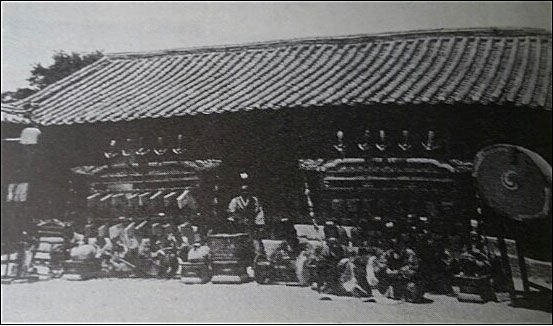 |
||
| ▲ 다나베가 찍어 책에 올린 "종묘헌가악(宗廟軒架樂)" 1921년대 | ||
그는 당시 조선의 악기를 비롯하여 악사들의 연주, 춤, 기타 음악계 실체를 사진 자료나 악보자료,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 일본에 보냈다. 조선의 기자들은 이 필름을 단지 조선의 사정을 선전하는 자료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적어도 총독부의 고관들은 이 필름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왕가 아악의 중요성을 깨달은 모양이어서 이전처럼 동물원을 남기고 아악대 등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리라는 난폭한 의견은 일소된 듯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었다고 그의 조사기행에서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나베는 아악부의 청사문제, 악원의 처우개선, 아악의 보호를 당국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하였다고 한다.
“이왕직 아악부에서는 대정 8년(1919)부터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악원의 모집계획을 세웠으나 급여액이 워낙 적은데다가 그것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악의 근절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직원의 대우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학생수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그의 청원은 일본 정부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아악부에서는 계획보다 확대되어 아악생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아악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다나베의 건의는 일제로 하여금 조선음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이었다. 실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겨우 50여명으로 아악의 명맥만을 간신히 이어오던 아악부는 1019년부터 후계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5년 간격으로 20여명 내외의 젊은이들을 공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세습제도,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도록 만든 제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였던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