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속풀이에서는 거문고를 백악지장(百樂之長)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나 선비, 사대부들은 거문고를 특히 애호하여 모든 악기의 으뜸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처럼 금을 좋아 하게 된 배경은 황폐화 되어가는 몸과 마음을 닦아 천리(天理)진정(眞情), 즉 하늘의 이치에 따르고 참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다. 선비들에게 있어 거문고는 수양의 악기로 통한다. 글공부하는 선비나 사대부의 사랑채에는 금을 걸어놓고 책을 읽다가 분심이 생기면 자연스레 거문고를 비껴 타는 것이다. 그래서 선비들의 생활상을 표현한 말로 좌서우금(左書右琴), 즉 왼손에 책, 오른손에는 금을 든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문고는 언제부터 연주되어 온 악기일까? 고구려시대로 알려져 있다. 처음 중국 진나라로부터 고구려에 금이 전해 졌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이것이 악기인줄은 알았으나 어떻게 타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라사람들에게 이 악기를 타는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방을 붙여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왕산악이란 재상이 거문고를 대폭 고쳐 만들고 스스로 곡을 지어 탔다고 한다. 거문고의

지난주까지 태평소와 단소, 퉁소, 훈과 지 등의 관악기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보았다.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또한 낯선 용어들이 등장함으로 친숙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전통악기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악기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현악기란 줄을 진동시켜 고저와 가락을 만들어 가는 악기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줄악기들은 대부분 명주실을 꼬아 만든 악기들이다.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한국의 현악기 종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어서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양금, 금, 슬, 향비파, 당비파, 월금, 공후 등이 있으나 이 중 현재까지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악기들은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양금 등이고 기타의 악기들은 재현을 위한 연구 중에 있다. 한국 전통의 현악기들은 그 소리내는 방법이 크게 4종류로 압축된다. 첫째는 거문고처럼 술대라는 도구로 줄을 내리치거나 올려침으로 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가야금, 또는 금, 슬의 경우처럼 손가락으로 줄을 뜯거나 퉁겨서 내는 방법, 셋째는 해금이나 아쟁의 경우처럼 활로 줄을

지난주에는 퉁소에 관해 소개하였다. 퉁소는 아래 위가 통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점, 퉁소를 통소, 퉁수, 또는 퉁애라고도 부른다는 점, 단소보다 굵고 긴 악기로 청공(淸孔)이 있어 음색이 아름답다는 점, 옛 석비(石碑)나 석상에 퉁소 그림이 보인다는 점,『악학궤범』에도 9공의 퉁소가 소개되어 있다는 점, 그럼에도 궁중음악에서는 퉁소의 사용처를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반면, 민간음악에서는 북청사자놀음의 반주음악이나 시나위 음악을 통하여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우리보다는 중국의 조선족 동포사회에서의 퉁소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는 점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번 주에는 석전(釋奠), 즉 문묘(文廟)제례에 편성되는 관악기로 훈, 지, 약, 적과 같은 악기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문묘제례란 공자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서 그들의 학문과 정신을 받드는 의식으로 여기에는 초헌, 아헌, 종헌에 따라 음악과 춤이 따르는데, 그 음악은 고려때 송나라에서 들여온 아악으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고대의 음악을 전해 준 중국은 그 음악을 잊고 있으나 우리는 고려 때의 음악을 악보로 기록하여 지

‘퉁소[洞簫]’라는 말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만나는 노래는 서도소리 초한가(楚漢歌)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산(算) 잘 놓는 장자방(張子房)은 계명산 추야월에 옥통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八千弟子) 해산 할 제,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삼경(九秋三更)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외기러기 슬피 울어 객(客)의 수심(愁心)을 돋워 주고 장자방의 사향가(思鄕歌) 퉁소가락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항우(項羽)의 8천 군사가 일제히 전의(戰意)를 잃고 항복을 하고 말았을까? 퉁소를 퉁수, 또는 퉁애라고도 한다. 이 악기는 단소에 비해 보다 굵고 긴 세로악기여서 저음을 내고 있지만, 대금처럼 청공(淸孔)이 있어서 그 음색이 매우 아름답기도 하려니와,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함께 불기 시작하면 흥겹고 장쾌한 가락이나 리듬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힘을 지닌 악기이기도 하다. 원래 소(簫)라는 악기는 위가 열려있고 밑은 닫혀 있는 세로 부는 관악기이다. 위는 열려있고 아래는 막혀 있는데 소리가 날까? 가령 물병이나 술병에 입술을 대고 바람을 넣어도 소리가 나는 원리와 같다. 그러나 퉁소는 위와 아래가 통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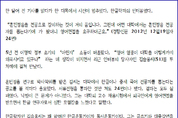
지난 주 단소의 재료와 구조, 그리고 소리 내는 요령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단소는 퉁소에 비해 작은 소(簫)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재료로는 오죽(烏竹), 황죽(黃竹), 소상(瀟湘)반죽(半竹)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 죽관의 제1공은 왼손의 엄지, 제2공은 왼손의 집게, 제3공은 왼손의 장지, 제4공은 오른손의 장지, 제 5공은 항상 열어놓고 연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소리 내는 요령은 위아래의 입술을 최대한 넓혀서 - 휘 - 하고 바람을 넣으며 단소를 드는 각도도 다양하게 시도해 볼 것과 무엇보다도 약하고 부드럽게 바람을 넣어야 소리가 잘 난다는 안내를 하였다. 국악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 될 오늘을 기다리며 나는 학생들에게 엄한 단소의 실기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단소는 소리내기가 약간 까다로운 반면, 한번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소리에 반해 쉽게 놓고 싶지 않은 악기이다. 그래서 단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소를 오래 사귄 친구와 같은 악기라고 말한다. 단소가 언제부터 우리 음악에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악학궤범≫이나 영조 때의 ≪증보문헌비고≫에도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민간에

얼어붙은 메 가람에 소리 없이 돋은 봄은 눈석이 흐름과 꽃봉오리 몸내 얻어 가는 결 보내 주는 맘 아름답다 하느나. * 메 : 산 * 결 : 겨울 * 가람 : 강, 시내

햇빛이 동무냐 봄바람이 벗이냐 이제는 긴긴 해달 스스로 살아야하니 보낼 봄 얼마 있는지 오는 가을 얼마일까

얼어붙은 땅이건만 이제사 때를 아는지 땅 덮은 묵은 눈은 어디 있고 어디 갔지 눈석이 고운 내음은 아씨 몸내 같아라 * 눈석이 :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 스러짐

선봄은 다 갔건만 기척 없는 개나리 회초리 휘둘러서 깨어라 소리치니 하늘 땅 오르내리는 봄바람은 비손하네 * 선봄 : 입춘

애티 추위 잠들고 묵은 추위 보내고 쌀쌀한 찬바람 온 누리를 설쳐도 새봄은 가슴에 돋아 꽃내음 그윽하네 * 애티 추위 : 소한 * 묵은 추위 :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