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김영조 기자] 24절기 중 봄 절기는 입춘부터 시작하여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가 된다. 또 여름 절기는 입하부터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까지다. 이어서 가을 절기는 입추를 비롯하여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이며, 겨울 절기는 입동과 함께 소설, 대설, 동지, 소한을 지나 대한으로 끝난다. 그런데 이 24절기는 무엇인가? 이 절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오죽 했으면 천체현상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농사지을 때를 알려주는 일 곧,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임금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권리의 하나였다고 했을까? 그래서 한해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지을 때를 알려주는 절기는 중요했던 것이다. 예부터 사람들이 쓰던 달력에는 태음력(太陰曆), 태양력(太陽曆),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 등이 있다. 태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다. 1년을 열두 달로 하고, 열두 달은 29일의 작은 달과 30일의 큰 달로 만들었다.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그린경제/얼레빗 = 김영조 기자] “내장은 창난젓 알은 명란젓 아가리로 만든 아가리젓 / 눈알은 굽어서 술안주하고 괴기는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도 약용으로도 쓰인데제이니 /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니가 되고….” 위 노래는 2002년 발표한 강산에의 7집 앨범에 있는 함경도 사투리로 맛깔나게 부르는 ‘명태’다. 그런가 하면 1952년에 발표됐던 굵직한 오현명의 바리톤 목소리로 듣는 양명문 작사, 변훈 작곡의 가곡 ‘명태’도 있다. “검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 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컸을 때 / 내사랑하는 짝들과 노랑 꼬리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 살기 좋다는 원산구경이나 한 후 이집트의 왕처럼 미이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소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 헛 명태라고 음 허쯧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 국민생선 명태는 모든 이의 안주가 된다.(그림 이무성 한국화가)

[그린경제/얼레빗 = 김영조 기자] 누룽지를 새까만 가마솥에서 닥닥 긁을 때부터 퍼져 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가히 일품이었다. 그것은 분명 우리만의 냄새요, 우리만의 맛이 아닐까? 또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여 나오는 숭늉은 어쩌면 최고의 마실거리리라. 그래서인지 한 수필가도 “우리는 누룽지를 잃었습니다. 대신 라면과 일회용 반짝 문화를 얻었습니다.”라고 탄식한다. 정말 우리는 누룽지를 잃어간다. 우리의 고향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문화를 잃어간다. 정말 누룽지가 우리에게 소중할까? 허준의 책 동의보감에는 <누룽지>가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거나 넘어가도 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이내 토하는 병증으로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는 병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누룽지는 알다시피 쌀로 만든다. 그렇다면 쌀은 현대인이 즐기는 인스턴트음식의 주재료인 밀가루와 어떻게 다를까? 쌀은 밀에 견주어 일반성분,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적지만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높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라이신 함량은 밀의 2배 정도나 많다. 또 쌀이 밀보다 아미노산가와 단백가가 높아 소화흡수율과 체내 이용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영양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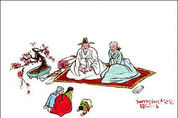
[그린경제/얼레빗 = 김영조 기자] 우리 고유의 설인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이날을 맞아 그동안의 시름을 잊고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 새배를 하고 성묘를 하며, 정을 다지는 하루다. 또 온 겨레는 “온보기”를 하기 위해 민족대이동을 하느라 길은 북새통이다. “온보기”라 한 것은 예전엔 만나기가 어렵던 친정어머니와 시집 간 딸이 명절 뒤에 중간에서 만나 회포를 풀었던 “반보기”에 견주어 지금은 중간이 아니라 친정 또는 고향에 가서 만나기에 온보기인 것이다. 설날의 말밑들 ▲ 설날의 해돋이(여수 향일암) 그러면 “설날”이란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 있을까? “설”은 먼저 "서럽다"라는 뜻이 있는데 한 해가 지남으로써 점차 늙어 가는 처지를 서글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리다', 삼가다.'의 `살'에서 비롯했다는 설도 있다. 여러 세시기(歲時記)에는 설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바짝 죄어 조심하고 가다듬어 새해를 시작하라는 뜻으로 본다. 또 '설다. 낯설다'의 '설'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도 이야기도 한다. 처음 가보는 곳은 낯선 곳이며,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다. 따라서 새해는 정신적, 문화적으로 낯설다고 생각하여 ‘
[그린경제/얼레빗 = 김슬옹 교수]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님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 어떤 분인가를 밝히기 위해 종이로 만든 신주인 지방을 써 놓고 절을 한다. 이 지방이 지금 눈으로 보면 어색한 한문으로 되어 있다.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 소상히 모르는 상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제사상을 받으시는 조상과 제사를 올리는 후손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글귀로 되어 있다. 지금 보통의 자방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일 경우 각각 “顯祖考學生府君神位, 顯祖妣孺人 000氏神位”라고 쓴다. 할아버지인 경우 벼슬을 안 지냈다고 '학생(學生)'이란 말이 붙어 있고 할머니는 벼슬하지 못한 남자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유인(孺人)'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학생(學生)'은 말광(사전)에 “생전에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명정(銘旌) 등에 쓰는 존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존칭이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유인(孺人)'도 말광에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정(銘旌)에 쓰던 존칭”이라고 나오지만 “학생”과 마찬가지로 존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야말로 극소수만이 벼슬을 할 수 있었던 시대의 관습을 우리말 구조도 아닌 한문 구조, 그것도

[그린경제/얼레빗 =김영조 기자] 오래 전 한 시골마을의 추수감사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마을 아주머니들은 양동이에 막걸리를 담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시게 했다. 한 서너 순배쯤 돌자 사람들은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고 흥이 나 시끌벅적한 마당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내게 징채를 쥐여 주며 징을 쳐보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그때까지 한 번도 풍물 악기를 제대로 만져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무가내였다. 누구나 쉽게 칠 수 있으니 한번 쳐보란다. 할 수 없이, 사실은 적당히 취기가 오른 나의 객기에 결국은 엉겁결에 징채를 잡았다. 아마도 술기운이 아니었으면 그때 징채를 잡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꽹과리, 장구 등 치배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연신 징을 울려댔다. 정말 흥겨웠다. 평생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적도 별로 없었던 듯하다. 만일 이것이 서양 음악이었다면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풍물굿은 가능하다. 풍물굿은 연주자가 관객이 되기도 하고, 관객이 즉석에서 연주자가 되기도 한다. 연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한마음 되어 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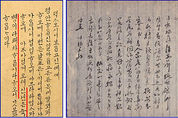
[그림경제/얼레빗=김영조 기자] 이제 4346 계사년을 보내고 새롭게 4347 갑오년을 맞았다. 갑오년을 맞으면서 한국문화신문은 독자 여러분께 새해 덕담이 될 말들을 소개한다. 물론 우리의 설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지만 한해가 바뀐 시점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본다. 설날의 말밑, 몸과 마음을 바짝 죄어 조심하고 가다듬어 한해를 시작하라 설날은 왜 설이라고 부를까? “설”이란 말의 말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설을 신일(愼日)이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종요로운 얘기일 듯하다. 이 말 뜻은 새해가 되면 몸과 마음을 바짝 죄어 조심하고 가다듬어 한해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또 설은 새해라는 정신ㆍ문화적 낯섦의 의미로 생각되어 ‘낯 설은 날'로 생각되었고, '설은 날'이 '설날'로 바뀌었다거나 한 해가 지남으로써 점차 늙어 가는 처지를 서글퍼 한다는 "섧다"의 “섧”이 변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설날에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야 말로 한해를 잘 사는 바탕이 아닐까? 참고로 설날 아침에는 누구나 떡국 한 그릇을 먹는다. 여기서 떡국은 꿩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이 제격이지만 꿩고기가 없는 경우에는 닭고기를 넣고 끓였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

[그린경제/얼레빗=김영조 기자] 오늘은 24절기의 스물두째 절기인 동지(冬至)로 해가 적도 아래 23.5도의 동지선(남회귀선) 곧 황경(黃經) 270도의 위치에 있을 때여서 한해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옛날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곧 작은설이라 하였다. 해가 부활한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설로 대접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라는 말처럼 <동지첨치(冬至添齒)>의 풍속으로 전하고 있다. 또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흘레(교미, 交尾)한다고 하여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부른다. 하선동력과 황감제 궁중에서는 설날과 동지를 가장 으뜸 되는 잔칫날로 생각하는데 이때 회례연(會禮宴, 잔치)을 베풀었다. 해마다 예물을 갖춘 동지사(冬至使)를 중국에 파견하여 이날을 축하하였다. 《동국세시기》에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 임금에게 바친다. 나라에서는 이 책에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어새를 찍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단오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속과 아울러 <하선동력(夏扇冬曆
[그린경제/얼레빗=김영조 기자] 지난 주 금요일(12월 6일)은 24절기 가운데 스물한 번째 대설(大雪)이었다. 24절기 가운데 봄 절기는 입춘부터 시작하여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가 된다. 또 여름 절기는 입하부터 소만, 망종, 하지, 대서, 소서까지다. 이어서 가을 절기는 입추를 비롯하여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이며, 겨울 절기는 입동과 함께 소설, 대설, 동지, 소한을 지나 대한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대설이 지났다면 이미 겨울 속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해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절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예부터 사람들이 쓰던 달력에는 태음력(太陰曆), 태양력(太陽曆),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 따위가 있다. 태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다. 1년을 열두 달로 하고, 열두 달은 29일의 작은 달과 30일의 큰 달로 만들었다.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

[그린경제/얼레빗 = 김영조 기자] 요즘 언론에는 의사나 영양사들이 나와 온통 소금 유해론을 펼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소금 탓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온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소금기(염분)가 많다며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뽑힌 김치도 요주의 먹거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이 즐겨먹는 된장찌개를 포함한 온갖 찌개들까지 소금 투성이어서 문제 있는 먹거리처럼 말한다.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우리 겨레는 예부터 아무 탈 없이 김치와 같은 절임 반찬과 된장, 고추장 같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왔다. 요즘 언론에 나와서 소금 부정을 말하는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우리 겨레는 이런저런 병들로 멸종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멀쩡하다. 아니 싱겁게 먹는다는 현대에 훨씬 더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텐가? 자, 여기서 생각해보자. 사람은 소금물 속에서 태어난다.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과 같다고 한다. 또 사람의 몸 안에는 소금이 들어있는데 피 속의 소금기는 0.9%이고 세포의 소금기 역시 0.9%다. 그 0.9%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