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왕실 이야기. 예나 지금이나 최고 권력자 주위의 이야기는 세간의 관심을 끈다. 밝은 빛처럼 시선을 모으는 권력의 속성처럼, 임금과 그 주변의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에 기록되고 회자하였다. 다만 정보의 통제가 엄격했던 옛날에는 덜 알려지고, 지금은 더 많이 알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영규가 쓴 이 책,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왕실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임금과 세자는 어떻게 지내고 왕후와 후궁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다. 막연히 사극으로만 보던 왕실 사람들의 생활을 마치 옆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왕비 간택과 외척에 관한 이야기다. 간택은 왕실에서 혼인을 앞두고 혼인 후보자들을 대궐 안에 불러 배우자를 뽑던 제도다. 고려 때만 해도 이런 제도 없이 상궁을 앞세워 중매하는 형식으로 혼인했지만, 조선시대 들어서는 간택을 통해 일종의 ‘선발’을 했다. 태종은 신하 이속이 왕실과의 중매 혼인을 거부하자 괘씸하게 여기고 ‘간택령’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왕실의 혼인을 위해 간택을 할 때는 먼저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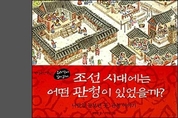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조선시대 공무원?! 지금보다 사회가 다원화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하지만 ‘나랏일’은 지금보다 더 거대하고 엄중한 일이었다. ‘관청’과 ‘관리’의 위상이 아주 높았고 나라의 많은 부분을 관청에서 관장했다. 그러면 조선시대 관청의 직제와 구성은 어떠했을까? 박영규가 쓴 책, 《조선시대에는 어떤 관청이 있었을까?》는 이런 궁금증을 한껏 풀어주는 책이다. 사극을 봐도 이런저런 관청과 벼슬의 이름이 나오지만, 따로 책을 읽지 않으면 이 부분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조선시대 관청의 세계’를 자유롭게 노닐며 익히게 해 주는 유익한 책이다. 책의 구성은 크게 1장, ‘조선의 중앙 관청’과 2장, ‘조선의 지방 관청’으로 나뉜다. 중앙관청 편에서는 의정부와 6조, 언론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를 비롯해 세자궁의 관청, 조선의 학문 기관, 그 밖의 주요 관청, 소규모 중앙 관청 등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도, 부, 목, 도호부, 군, 현 등 각 지방을 관할하던 관청과 이방, 호방, 형방, 예방, 병방, 공방 등 지방 관아에서 일하던 아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국방을 관장하던 병조의 지방 관직인 병마절도사, 병마절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