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이 날릴 명성 선비의 기개 맑고 / 그 선비의 기개 맑고 맑아 만고에 빛나리니 / 만고에 빛나는 밝은 마음 모두가 학문 속에 있으니 / 그 모두가 배움을 행하는 데 있으므로 그 이름 영원하리라” 위는 매헌 윤봉길(尹奉吉, 1908.6.21-1932.12.19) 의사가 16살 때 지은 “옥련환시(玉連環詩)”입니다. 어제(4월 29일)는 그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상해 홍구(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대장 등을 죽이고 중상을 입힌 지 80돌이 된 날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1년 겨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뒤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연(천장절-天長節)과 상해 점령 전승 기념행사장 단상에 폭탄을 던짐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조선인의 기개를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날의 의거는 단상에 있던 상해 파견군총사령관과 일본거류민단장을 죽이고, 제3함대 사령관,

남나라 열해면 내고장 된다는데 파뿌리 머리 이고 갈쪽을 내다보면 개나리 노란 빛깔이 꿈결인 듯 돋아나네 * 오늘날에는 얼마 안 남은 재일 1세는 억울하게 끌려 온 사람들이 많아 2세나 3세와는 달리 믿나라(고국), 믿고장(고향)에 대한 사랑이 유달리 맑고 뜨겁다. 그러니 좋아하는 꽃도 2세/3세들이 좋아하는 벚꽃이 아니라 개나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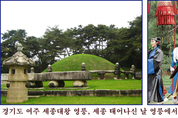
지난주 속풀이 53에서는 국악과 서양음악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와 서로 다른 점들이 곧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고, 그 특징들이 바로 독특한 미적(美的) 가치를 느끼게 하는 개성이어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악이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악이란 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한국의 음악이란 포괄적인 개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일부 제한적인 의미로 쓰인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약 100여 년 전부터 이 땅에 들어온 서양음악의 영향을 받고 음계나 리듬, 하모니 등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들을 음악이란 이름의 자리에 앉히는 반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음악은 국악, 혹은 전통음악으로 별도 취급해 왔기 때문에 국악이란 용어가 글자의 뜻인 대한민국의 음악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일부 제한적인 의미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음악교과목이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을 떠올려보면 재미(?)있는 기억들이 떠오를 것이다.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건강한 한국인의 육성’, ‘음악을 통한 한국인의 심성’을

60~80년대 유행했던 “정관수술”이라 불렀던 수술, 그것은 바로 정자가 지나는 통로를 묶어 임신을 막았던 남성 불임수술이었지요. 70~80년대 예비군 훈련을 받기 싫었던 남성들은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빼준다는 말에 혹해서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필요시는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다", "여자의 출산고통을 좀 덜어 주자", “남자 피임이 가장 효과적이다.”, “장화보다 번거롭지 않고 느낌이 좋다.”, “정관수술 하면 정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 같은 말로 예비군들을 꾀면 훈련도 받기 싫고, 불임도 원했던 예비군들이 너도나도 정관수술에 응했었지요. 동아일보 1962년 11월 27일 자에는 “정관수술, 200여 명 자원”이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때 정관수술을 하여 생활고를 덜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적게 난 것이지요. 당시는 국민 대다수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두면 기르기가 힘들다고 여겼지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는 당시의 큰 화두였습니다. 이렇게 60년대에 둘만 낳자던 시대를 거쳐 이제는 다시 셋

가로 길이가 184㎝임에 반해 세로 길이는 8.4㎝인 기이한 그림을 보셨나요?. 8.4㎝는 요즘 명함의 가로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바로 조선 영조임금 때 화원 김두량(金斗樑)이 아들 김덕하(金德夏)와 함께 그린 “사계산수도(四季山水圖)”가 그것입니다. 8장면의 산수화가 좁고 긴 두루마리에 여백 없이 꽉 차게 그려졌는데 비좁거나 옹색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한 부분인 봄 풍경을 보면 꽃밭에 집을 지었는지 집 사이에 꽃을 심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꽃이 앞다투어 핀 봄 밤 그림입니다. 화려한 누각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넓은 마당에는 술과 안주를 나르는 하인들이 바쁘고, 심지어 두 마리 학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봄 풍경 다음으로 여름 풍경이 이어지는데 봄 풍경 왼쪽에서 학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가면 서서히 여름으로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칼로 자르듯 분명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 그림의 특징은 장기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탁족하는 여름 장면은 물론 새참을 내가고 가을걷이하는 모습 그리

구한말 조선에 온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이 1908년 펴낸 책 ≪조선견문기≫에는 선교사들이 자전거를 처음 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의 반응을 적은 내용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자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에 조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구경꾼들의 요청에 못 이겨 길을 여러 번 오고 가고 해야 했지요.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나리’라고 부르며 최고의 대우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나리로 대접받았던 선교사 알렌은 미국 사람으로 한국이름은 안연(安連)입니다. 대한제국 때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양에서 기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1884년 (고종 21년) 미국 공사관 의사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지요. 그는 갑신정변 때 부상한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 인연이 되어 1885년 왕립병원 광혜원(廣惠院)이 설립되자 여기에서 서양 의술을 베풀게 됩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을 드나들 수 있는 시절이 아닐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선교사들을 통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그 곡조를 간직하고 (桐千年老恒藏曲) 매화는 한평생 추운겨울에 꽃을 피우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梅一生寒不賣香) 달은 천번을 이지러지더라도 그 본래의 성질이 남아 있으며 (月到千虧餘本質) 버드나무는 백번 꺾이더라도 또 새로운 가지가 올라온다. (柳經百別又新枝)“ 이는 조선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특히 외교문서를 잘 쓰기로 유명했던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의 ≪야언(野言)≫에 나오는 7언절구 한시입니다. 한시는 물론 당대 최고의 문장가답게 《상촌집》, 《낙민루기(樂民樓記)》, 《황화집령(皇華集令)》 같은 작품이 전해지고 있으며 위 시조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가 잘 드러나는 시로 퇴계 이황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지요. 선조임금의 신망이 두터웠으며 장남 신익성이 임금의 셋째딸 정숙옹주와 결혼할 때 좁고 누추한 집을 수선할 것을 권했지만 집이 훌륭하지는 못해도 예(禮)를 행하기에 충분하다며 끝내 기둥 하나도 바꾸지 않은 청렴한 선비로도 이름이 났습니다. 인조의 스승이기도 했던 신흠이 죽자 인조는 손수 장례에 쓰일

“아지랑이 피는 산골 백양나무 새잎 난다 곡우절기 가까우면 못자리를 해야하니 제비는 짝을 지어 옛집을 찾아오고 노랑나비 범나비는 꽃을 찾아 날아댄다“ 위는 태평농 누리집 ‘태평만담’ 가운데 일부로 요즈음 절기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24절기의 여섯째로 봄의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곡우(穀雨)는 봄비(春雨)가 내려 백곡(百穀)을 기름지게 한다.” 하여 붙여진 말이지요.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농사철로 접어듭니다. “곡우에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곡우에 비가 오면 농사에 좋지 않다.”와 같은 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속담이 전합니다. 또 곡우 무렵엔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르는 때인데 이때 사람들은 곡우물을 마십니다. 곡우물은 주로 산 다래, 자작나무, 박달나무 따위에 상처 내서 흘러내리는 수액인데 몸에 곡우물이 좋다고 해서 예전부터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는 깊은 산 속으로 곡우물을 마시러 가는 풍속이 있습니다. 경칩의 고로쇠 물은 여자 물이라 해서 남자에게 좋고, 곡우물은 남자

“백범은 흉탄에 쓰러지고/ 단재는 수문랑(하늘의 벼슬)으로 멀리 갔네/ 가련한 손, 홀로 남은 심산 노벽자(늙은 앉은뱅이)/ 여섯 해 동안 삼각산 아래 몸져누웠도다.” 이 시는 심산 김창숙 (1879~1962) 선생이 병상에서 백범 김구와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며 쓴 시입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고 강제로 맺은 을사늑약 (1905)이 단행되자 스승 이승희와 대궐 앞으로 나아가 을사오적의 목을 베라는 상소를 시작으로 1960년 4·19 직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의장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민족운동사 중심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나자 130여 명의 뜻을 모아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파리만국평화회의에 보내는 등 해방이 되기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뛰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독립, 통일, 민주화 운동을 통틀어 심산 김창숙 선생을 따를 만한 이가 없다는 평을 받을 만큼 불굴의 정신으로 일관한 선생은 독립운동에 두 아들을 바치고 선생은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두

135. 극히 절제된 전통가무극 노가쿠(能樂)를 관람하고… 오-오-잇(합창소리) 타타타탁(북소리) 오-오-잇(합창소리) 타타타탁(북소리) “북잽이들의 북 치는 소리도 절도가 있지만 그들이 내는 소리 역시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내는 소리처럼 획일적인데다가 질러내는 소리가 각이 져서 마치 사무라이들의 칼싸움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 말은 한국인들이 노가쿠(能樂)를 함께 보고 나오면서 내뱉은 첫마디이다. 나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다. 출연자들의 바로 코앞에 앉아서인지 유달리 북잽이의 절도 있던 손놀림이 기억에 남는다. 일본의 전통극인 가부키나 분라쿠(인형극) 등은 일본에서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지만 노가쿠 공연은 좀처럼 볼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얼마 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처음 보는 기회를 얻었다. 일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타츠미만지로(辰巳滿次郞) 씨 등 노가쿠시(能樂師) 일행의 한국공연 소식을 알려준 천안 순천향대학 교수인 후지타 선생은 나와 오랜 지인으로 순천향대학에서 노가쿠 특강을 마친 뒤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공연이 있으니 함께 보자고 권유해와 보러 간 것이다. 노가쿠(能樂)는 1,0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가무극으로 유네스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