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알 밤 - 유가형 공기가 꼬들꼬들 마르니 고추잠자리 군무에 가을하늘 노을이 빨갛게 군불 지핀다. 고슴도치들이 밤나무에 주저리 주저리 떨어질듯 무겁게 붙어있고 지금 고슴도치의 해산 준비로 분주하다 하얗게 자궁문이 열리나 보다 호동그렇게 놀란 감나무 수백 개의 등불이 일제히 켜졌다 임박한가 보다 외마디 소리에 나는 눈을 짝 감았다 툭! 툭! 일란성 세쌍둥이다! 바닥에 검붉은 가을빛이 쏟아진다 저 해산의 황홀함이라니... “어디선가 밤꽃 향기가 물씬 난다. / 강렬한 생명의 냄새 / 나도 모르게 불쑥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한 시인은 밤꽃의 향기를 이렇게 노래한다. 6월이 되면 벌들을 유혹하는 밤꽃의 향기가 물씬 나고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란다. 그런데 그 향기에 견주면 그 열매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범할 수 없다. 밤송이는 날카로운 가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과실이 오히려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동물들을 유혹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다른 과실들은 그 안에 씨앗을 품고 있어서 동물들이 먹고 뱉은 씨앗이 자신의 또 다른 과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은 달콤한 향기도 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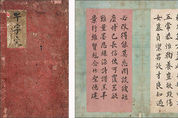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其四(기사) 士本四民之一也(사본사민지일야) 사(士)도 본래 사민 가운데 하나일 뿐 初非貴賤相懸者(초비귀천상현자) 처음부터 귀천이 서로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네 眼無丁字有虗名(안무정자유허명)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헛된 이름의 선비 있어 眞賈農工役於假(진가농공역어가) 참된 농공상(農工商)이 가짜에 부림을 받네 이 시는 조선 후기 시ㆍ서ㆍ화 삼절(三絶)로 일컬어진 문신ㆍ화가이며, 서예가인 자하(紫霞) 신위(申緯)가 1820년 나이 52살에 춘천부사(春川府使)에서 물러나 경기도 시흥의 자하산장(紫霞山莊)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을 노래한 것 가운데 한 수다. 신위는 초계문신으로 발탁될 만큼 촉망받았다. 초계문신은 37살 이하의 당하관(정3품 아래의 벼슬아치) 가운데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뽑아 규장각에 위탁 교육하고, 40살이 되면 졸업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던 제도다. 신위는 1815년 곡산부사로 나갔을 때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확인하고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정에 세금을 탕감해달라는 탄원을 하였으며, 1818년에 춘천부사로 나갔을 때는 그 지방 토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맞서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강 - 도종환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간다 가장 더러운 것들을 싸안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천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간 어느 기슭에 몰래 손을 씻는 사람들아 언제나 당신들보다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흐른다 중국 역사에서 성천자(聖天子)라 추앙받는 요(堯) 임금(BC2356~2255)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자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능력이 모자랐다. 요 임금은 허유(許由)라는 어진 은자(隱者)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를 찾아가 자신의 뒤를 이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권세와 명예에 욕심이 없었던 허유는 정중히 사양하고는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강물에 귀를 씻었다. 그때 마침 소를 끌고 물을 먹이려고 온 소부(巢夫)는 허유가 그런 사연으로 귀를 씻었다는 말을 듣고는 더러운 귀를 씻은 물을 자신의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그보다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물을 먹였다는 고사가 있다. 이를 ‘세이공청(洗耳恭聽)‘ 또는 ’영천세이(潁川洗耳)‘라고 한다. 귀가 더럽혀졌다고 씻은 허유나 그 귀를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기 도 - 김현숙 가을에는 한 알의 여문 알곡과 단 과육에서 천지가 고루 익혀낸 빛과 향기를 맛보게 하옵소서 여름날, 밖으로 범람하던 생각도 안으로 깊이 여울지는 맑고 고요한 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차례 바람이 불면 세상을 채우던 열매들을 다 내어주고 더 멀고 외로운 길 떠나는 행자들의 가벼운 발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침묵으로 믿음이 되는 산과 비어있음으로 평온한 들판을 오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틀 뒤엔 24절기 ‘처서’가 있다.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만큼 “處暑”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더위를 처분한다.”라는 뜻이 되어 여름은 가고 본격적으로 가을 기운이 자리 잡는 때다. 불볕더위와 무더기비로 몸살을 앓던 올여름을 처분하는 계절인 것이다. 이때쯤 농촌에서는 땡볕에 고추 말리는 풍경이 수채화처럼 곱기도 하다. 또 옥수수 이삭 위를 날아다니는 빠알간 고추잠자리도 가을을 부르는 손짓으로 보이는 때다. 한가위 명절을 코앞에 둔 들녘, 노란 벼이삭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지난여름, 시련의 무더위를 용케도 견뎌내고 이제 튼실한 알곡을 선사할 시간이다. 어쩌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소 나 기 - 송낙현 쨍쨍쨍 땡볕의 여름 한낮 아내가 마당에 빨래를 널어놓고 마실 나간 사이 후드득후드득 빗방울 떨어져 화다닥 뛰어나가 재빨리 걷어 왔는데 언제 나왔는지 해가 마알갛게 웃고 있다 재미나 죽겠다는 것처럼.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청순하고 깨끗한 사랑을 담은 황순원(黃順元)의 단편소설 <소나기>. 1953년 5월 《신문학(新文學)》지에 발표되었다. 시골 소년은 개울가에서 며칠째 물장난을 하는 소녀를 보고 있다. 그러다 소녀는 하얀 조약돌을 건너편에 앉아 구경하던 소년을 향하여 “이 바보” 하며 던지고 달아난다. 소년은 그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고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시작되는 황순원의 <소나기>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접해봤던 소설이다. 이렇게 순박한 소년과 소녀와의 만남, 소녀의 죽음, 조약돌과 분홍 스웨터로 은유 되는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이 소묘된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는 소설 <소나기>를 기리는 ‘황순원문학관’과 ‘소나기마을’이 조성됐다. 작품의 절정이자 전환점인 소나기는 두 사람을 끈끈하게 묶어주지만, 결국 그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소꿉친구 분이 - 허홍구 기억 더듬어 찾은 이름 일곱여덟 살쯤에 옆집 살던 분이!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할매가 되었더라 옛 동무가 생각났다는 듯 날 보고 무심히 던지는 말 “옛날에는 니가 내 신랑했다 아이가” 이칸다. 찌르르한 전류가 흐르더라. *이칸다= 이렇게 말하더라(경상도 방언) 한 블로그에는 “57년 전 헤어진 뒤 반세기 만에 ‘깨복쟁이’와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보인다. 여기서 ‘깨복쟁이’란 “옷을 다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함께 놀며 자란 허물없는 친구”를 뜻한다. ‘깨복쟁이’와 비슷한 말로는 불알친구ㆍ소꿉동무 등이 있고 한자성어로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벗 곧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구를 뜻하는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있다. 어렸을 때 이웃에 살던 그리고 옷을 벗고도 부끄럽지도 않던 소꿉친구와는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모래 집짓기 따위를 하며 놀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빼먹지 않았던 것은 소꿉놀이였다. 현대에 오면서 소꿉놀이도 발전하여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소꿉놀이 꾸러미를 쉽게 살 수 있지만, 예전엔 그저 풀이나 흙이 먹거리를 대신했고, 그릇이나 솥은 조개껍데기가 대신했다. 그리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아 지 매 - 김태영 아무리 어리버리 해도 애기 하나 낳아 봐라 그러면 아지매가 되는겨. 니들이 아무리 젊어도 아지매 만큼 빠르지 않더라 밥하고 청소하고 얘기보고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아지매 되기 쉬운 것이 아녀 밤새 젖 물린 채 꾸벅꾸벅 졸고 입술이 부르터지고 비몽사몽 해도 애기 울음소리는 기똥차게 듣지 아지매가 되어야 그렇게 용감해지는 겨. ‘아줌마’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인 여자를 친근하게 또는 낮추어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라고 풀이한다. 곧 '아줌마'라 하면 친근함도 있지만, 부정적인 정서가 더 강한데 실제 모습은 어떻든지 똥똥한 몸매에 파마머리를 하고 화려한 몸뻬를 입은 모습이 연상된다. 그것뿐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뛰어가며 자리 잡기,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 마당을 헤집고 다니는 억척스러움도 담겨 있다. 흔히 촌스럽다고 표현할 정도의 행동거지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강한 생활력이 포함되는 정도다. ‘아저씨’가 그저 나이가 들고 혼인한 남성이라는 평범한 느낌을 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인 것이다. 최근 미국 한인 아줌마들의 '아줌마 이엑스피(Ajumma EXP)'의 춤 공연이 화제다. 미국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때 - 황경연 언제부터였을까? 꽃집의 저 화려한 장미보다 개천가에 멋대로 피어난 애기똥풀이 더 예쁘게 느껴지기 시작한 때는 양귀비과에 속하는 ‘애기똥풀’은 젖풀, 까치다리, 씨아똥이라고도 부른다. 애기똥풀은 들판이나 길가, 빈터 등 마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해살이풀 들꽃으로, 양지바른 곳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더더구나 ‘애기똥풀’은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노란색의 유액 때문에 애기똥풀이라고 불렀단다. 이 애기똥풀은 독이 있는 식물로 벌레가 쉽게 덤벼들지 못한다. 즙을 짠 다음 물과 섞어서 뿌리면 진딧물을 없앨 수 있고 천연 농약으로 쓰기도 한다. 줄기를 자를 때 나오는 노란색의 유액에 살균효과가 있어서 피부병이나 무좀 치료로도 쓰고 천연염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애기똥풀은 독성이 강해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만, 봄에 어린 순을 충분히 물에 우려낸 다음 나물로 먹을 수도 있다. 또 한약재로도 쓰여 관절염, 신경통, 삔 데, 몸이 피곤한 증세, 타박상, 습진, 종기 등에 효과가 있다. 안도현 시인은 그의 시 ‘애기똥풀’에서 “나 서른다섯 될 때까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풀에게 - 방우달 힘든데 살아줘서 감사하다 꽃까지 피워줘서 고맙다 향기까지 나눠줘서 미안하다 씨앗까지 남겨줘서 위대하다 늘 곁에 있어 줘서 이쁘다 넓은 의미로는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 가운데 나무가 아닌 것은 모두 풀이라고 한다. 겨울에 땅 위에 나 있는 것은 완전히 말라버렸다가 해마다 새로운 싹이 터 자라는 식물이다. 풀은 곡식 생산과 토양 형성기능 덕분에 모든 식물 가운데 경제효용 값어치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개체수도 가장 많다. 풀은 소, 말, 양 등 초식동물 나아가 사람의 먹거리로 쓰이는 것은 물론, 야생동물의 둥지 또는 은신처도 되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집을 짓는 데도 쓰인다. 원예용으로 심어 가꾸는 종류도 있으며 잔디밭에도 쓰고, 흙이 깍이는 것을 막는 풀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풀은 이처럼 생각 밖으로 쓰임새가 많다. “앗! 몇 주 안 갔더니 고추밭이 온통 풀밭이 되어버렸네” 주말농장을 하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사람들이 길러 먹거리로 먹는 풀 종류의 푸성귀들은 농사짓는 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몇 주를 안 갔으니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그림자 - 윤향기 친구도 애인도 모두 떠나고 오랜 직장까지 날 외면해도 병든 소나무를 버리지 않는 건 오직 하나 너 ‘그림자’의 일반적인 풀이는 “빛이 물체를 비출 때 빛을 가려 반대편에 나타나는 검은 형상”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안고 다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요. 빛이 없다면 그림자는 없다. 그리고 그 빛이 강할 때 그림자도 선명해지고, 빛이 약하면 그림자가 보이는 듯 마는 듯하기도 하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Carl Jung)은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며, 개인의 의식 생활에서 구현이 적을수록, 그것은 검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말했다. 호프만슈탈이 대본을 쓰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가 작곡하여 1919년 초연한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이 있다. 어둠 속에서 영혼 세계의 사자가 나타나 황후에게 3일 안에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황제가 돌이 된다고 알려주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 오페라의 중심이다. 그녀는 인간 세계로 내려가 바라크의 아내에게 그림자를 팔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꼬드긴다. 바라크의 아내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