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충남 서산 출신의 소리꾼 심정순(沈正淳)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심팔록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부친의 음악적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점, 박춘재 등과 일본에서 음반 취입 후, 발매 광고가 신문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 이해조의 강상연(江上蓮), 연(燕)의 각(脚), 토(兎)의 간(肝), 등이 심정순의 구술(口述)로 매일신보에 연재되면서 더욱 알려졌다는 점, 예단(藝壇) 일백인(一百人) 편에는 여러 광대 가운데도 가장 품행이 단정하고 순실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고, 1910~1920년대 그의 활동내용은 대부분이 판소리, 가야금 연주, 병창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비단 중고제 판소리뿐이 아니다. 동편제, 서편제를 막론하고 초창기를 지나 그 이후로 내려오면서 사설의 내용이나 음악적 기교의 변화로 판소리는 세련, 정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는 양반층을 끌어들이면서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인데, 그것은 유성기판에 담겨있는 고음반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음반 자체가 여러 제약 속에서 그렇게 기획되기도 하였지만, 시골 장터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열린 공간에서 쉽게 접했던 욕설이나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민속음악의 명인으로, 즉흥음악의 대가로, 명성을 날렸던 심상건과 그의 딸 심태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함께 미국 순회공연을 한 바 있고, 1965년에는 심상건이 신병치료차 미국에 갔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떴었며, 그의 묘비에는 가야금이 조각되어 있다는 이야기, 심상건의 숙부, 심정순의 소리제는 그의 막내딸 심화영에게 이어졌는데, 이 소리는 과거 서울 경기지방과 충청도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제(古制)의 한 유형이며 김창룡 가문과 이동백, 심정순을 위시한 심씨 가문 등에서 이어졌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다. 아버지 심정순으로부터 중고제 소리를 이어받은 심화영은 소리보다는 춤에 더 재능을 보여서인가, 특히 승무(僧舞)를 잘 추었다고 한다. 그래서 훗날 승무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이 된 바 있고, 그 종목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타계하였다. 현재 이 종목은 심화영의 손녀딸 이애리가 전수조교로 활동하며 동 종목을 보존하고 있다. 심화영의 승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는 중고제 판소리를 지켜 온 심정순(沈正淳)을 소개해 보도록 한다. 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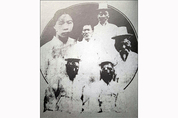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심상건 명인의 넷째 딸, 심태진이 현재 99살의 노인임에도 6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가야금산조와 병창, 단가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지도방법은 1:1 개인지도로 매우 엄격하였으며 제대로 못 하면 대나무로 어깨를 맞았다는 이야기, 한성준에게 춤을 배웠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산조는 즉흥적이어서 오르지 한성준이 그 장단을 맞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심상건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민속음악, 특히 가야금산조와 병창, 기악의 명인으로 무대나 방송, 음반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던, 그러나 주권을 잃었던 불행의 시대를 보낸 국악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변화의 음악을 만들어 내는 즉흥음악의 대가였다. 그는 산조를 탈 때마다 매번 달라서 배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울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가리켜 선생 없이 자학(自學), 자득했기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심상건은 해방 직후, 조택원 무용단의 일원으로 넷째 딸, 심태진과 함께 미국의 원정공연을 성공리에 마쳤고, 귀국해서도 그의 공연활동이나 방송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그에게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판소리 중고제와 심상건의 가야금 산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중고제 판소리는 경드름이나 설렁제의 가락이 많으며, 평탄한 선율과 장단변화에 따른 극(劇)적인 표현보다는 단조로운 구성이 특징인데, 이러한 판소리 중고제의 특징이 심상건 가야금 산조에도 나타나는 것은 숙부인 심정순의 중고제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주에 이어 심상건의 가야금 산조와 중고제 판소리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한다. 현재, 심상건 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할 수 있는 40대 이상의 중견연주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충남 도청이나 문화재단, 서산문화원 등에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심상건류 가야금 산조 감상회>를 기획하여 지역민들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그 까닭은 서산 출신 심씨 일가의 활동이나 중고제의 이해 및 재발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서산>이라는 지역이 배출해 낸 심상건 명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게 되며, 음악적 자긍심을 느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중고제 판소리의 특징을 이어받은 심상건의 가야금 산조는 남도제의 산조 음악과 또 다른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전승의 가치는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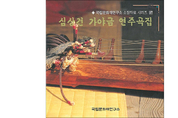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심상건의 충청제 산조와 김창조 계열의 남도제(南道制) 산조의 서로 다른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남도제 산조란 19세기 말, 가야금 연주자인 전라도 영암의 김창조가 처음으로 만들어 탄 산조로 우조-평조-계면의 진행이지만, 충청제는 평조-우조-계면조라는 점을 말했다. 또한, 충청제 산조는 평조와 경드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경드름이란 서울ㆍ경기지방의 음악 어법으로 경기ㆍ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해 온 중고제 판소리의 특성이 심상건의 산조 음악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 심상건의 산조음악은 남도제 산조의 계면처럼 슬픔의 느낌이 깊지 않다는 점, 또한 순차적 하행 선율형과 빠른 장단의 한배, 등이 남도제 산조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밖에도 심상건의 충청제 산조와 김창조계열의 남도제 산조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상건 산조의 음악적 특징』이란 김효선의 논문을 보면, 어느 음계의 중심음이 옥타브 위, 또는 아래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 해서 음역이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율의 진행은 순차적 하행이 주(主)를 이루고 있으나, 끝냄의 형태는 대부분이 4도 상행 종지라고 한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내포지방의 기악으로 대표되는 심상건의 가야금 산조를 소개하였다. 심상건은 1894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작은 아버지(심정순)댁에서 자라며 국악적 소양을 키웠고, 그의 4촌 동생들도 악가무로 이름있는 심재덕, 심매향, 심화영 등이며 특히 심화영의 승무는 충남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심상건은 1920~30년대 일제강점기에 강태홍, 한성기, 정남희, 안기옥, 김병호 등과 활동하였고, 약 40여 장의 음반자료를 남겼다는 이야기, 1960년대 말, 5·16 민족상, 전국음악경연대회 가야금 부문의 지정곡은 심상건류 산조였기에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한슬릭(Aduard Hanslick)의 ‘긴장과 이완’이나 심상건의 줄을 ‘풀고 조이는’ 음악 미학(美學)은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도 심상건류 가야금 산조(散調)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심상건류 가야금산조를 분석해 본 연구자들이나, 실제로 그 산조를 연주해 오고 있는 전공자들은 그 산조의 특징이 김창조 계열의 남도제(南道制) 산조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김창조 계열의 남도제 산조란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충청지방의 기악(器樂) 중 대전지방의 줄풍류 이야기를 하였다. 줄풍류란 방중악(房中樂), 곧 실내에서 연주하는 음악으로 가곡반주나 영산회상과 같은 음악을 연주한다는 점, 문화재연구소의 《대전 향제 줄풍류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1960년대 당시 줄풍류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풍류객은 대금을 연주하는 권영세(1915년 생)로 그는 박흥태, 방호준, 김명진, 성낙준, 윤종선, 김태문 등에게 여러 악기를 배웠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는 1965년, 대전율회와 <대전정악원>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맡아보았는데 당시의 풍류객으로는 권영세 이외에도 7~8인이 있었다는 점, 충청풍류, 곧 내포풍류는 일제강점기 말부터 대전 율계가 있었으나, 거의 유명무실해 졌다가 1960년부터 대전 현지의 권영세나 임윤수 등에 의해 활동이 재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대전지방의 민간풍류에 이어 이번 주에는 내포지방의 기악으로 가야금 산조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한다. 충청지방의 가야금 산조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심상건이라는 명인부터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만큼 그는 당대 가야금 산조 음악으로는 전국적인 인물이었다. 심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기악(器樂)에 관한 이야기로 대전지방의 줄풍류 이야기를 하였다. 가야국이 망하자, 악사 우륵은 가야금을 안고 신라로 투항하여 제자들에게 가야금, 노래, 춤을 각각 가르친 것처럼 악은 악가무를 포함한다는 이야기, 충남 홍성이 낳은 한성준도 춤과 북뿐이 아니라 피리나 소리를 잘해서 곧 악ㆍ가ㆍ무의 능력이 출중했다는 이야기, 충청지역의 향제줄풍류는 대전, 공주, 예산 등지에서 활발한 편이었으나 1960년대 전후에는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향제줄풍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민간풍류를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줄풍류란 방중악(房中樂), 곧 실내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란 뜻이다. 당시 대전 줄풍류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풍류객은 대금을 연주하는 권영세(1915년 생) 씨로 그는 박흥태에게 가야금 병창, 방호준에게는 가야금 풍류, 김명진에게는 단소 풍류를 배웠다. 또한, 예산의 성낙준에게 대금 풍류, 공주의 윤종선에게 양금풍류, 김태문에게 가야금 풍류 등을 배우고, 한국전쟁 직후에 대전 율회에 들어가 대금을 불었다고 한다. 1965년에 <대전 정악원>에 들어가 회원들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중고제>는 악제(樂制)의 개념, 경기 충청권이라는 지역의 개념, 고제(古制)에 비해-그 이후 시대의 중고제(中古制)라는 시대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 용어를 판소리 이외에 충청지역의 악(樂)ㆍ가(歌)ㆍ무(舞)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내포제 시조>는 <충청제 시조>라고도 부르나 이를 <중고제 시조>라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 특히 충청지방의 시조창은 가성(假聲)창법을 피하고, 순차 하행(下行) 종지법을 쓰며, 가사를 붙이는 박의 자리도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주에는 충청지방의 악(樂), 즉 기악(器樂)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다. 원래 악(樂)의 개념속에는 악(樂)ㆍ가(歌)ㆍ무(舞)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우륵(于勒)과 가야금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이 실려 있어 이를 소개한다. “6세기 중반, 신라에 의해 가야국이 망하자, 가야금의 대가인 우륵 선생은 가야금 한 틀을 안고 신라로 투항하게 된다. 신라의 진흥왕은 선생을 국원(國原-지금의 충주)에 모셨는데, 어느 날 우륵이 타는 가야금 음악에 감탄하며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한국춤문화유산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중고제> 관련 세미나 이야기 중, 정노식의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소개된 중고제는 동편도 아니고, 서편도 아닌 그 중간이며 염계달, 김성옥의 법제를 많이 계승하여 경기, 충청간에서 유행한 소리제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중고제는 평조(平調)대목이 많고, 정가풍의 창법을 쓴다는 점, 장단을 달아놓고 창조(도섭)로 부르며 글을 읽듯, 몰아간다는 점, 말 부침새도 비교적 단순하게 구사하는 소리제라는 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음반에만 담겨 있을 뿐, 소리꾼으로 이어지는 실제의 전승은 단절되었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바와 같이 <중고제 악가무>라는 말에서 중고제가 판소리의 한 유파(流波), 곧 경기지방과 충청지방에서 많이 불리던 중부지방의 소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또한, 이 소리제는 전라도 지방의 동편제나 서편제 판소리와는 달리, 정가풍의 특징적인 창법의 소리제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동편이나 서편 판소리와는 다른 음악적 유파로 분류되는, 혹은 중부권이라는 지역적 의미를 담고 있던 이름이지만, 또 다르게 해석되는 점은 어느 특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