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일하다’와 짝을 이루는 ‘놀다’는 일제의 침략을 만나서 갑자기 서러운 푸대접을 받았다. 저들은 우리네 피를 남김없이 빨아먹으려고 ‘부지런히 일하기[근로]’만을 값진 삶의 길이라 외치며 ‘노는 것’을 삶에서 몰아냈다. 일제를 몰아내고 분단과 전쟁과 산업화로 이어진 세월에서는 목숨 지키는 일조차 버거워서 ‘놀다’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놀다’는 ‘일하다’를 돕고 북돋우고 들어 올리는 노릇이고, ‘일하다’에 짓눌린 사람을 풀어 주고 살려 주고 끌어올려 주는 노릇이며, ‘일하다’로서는 닿을 수 없는 저 너머 다함 없는 세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데려다주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서 밀려난 ‘놀다’를 다시 불러들여 제대로 가꾸는 일에 슬기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놀다’는 네 가지 이름씨 낱말로 우리네 삶 안에 살아 있다. 움직씨 ‘놀다’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놀기’, ‘놀이’, ‘놀음’, ‘노름’이 그것들이다. 그러니까 움직씨 ‘놀다’가 ‘놀기’라는 이름씨로 탈바꿈하여 벌어져 나오면, ‘놀이’를 거치고 ‘놀음’에 닿았다가 마침내 ‘노름’까지 가지를 치며 나아가는 것이다. ‘놀기’는 ‘놀다’를 이름씨로 바꾸어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그림씨(형용사) 낱말은 본디 느낌을 드러내는 것이라, 뜻을 두부모 자르듯이 가려내는 노릇이 어렵다. 게다가 그림씨 낱말은 뜻덩이로 이루어진 한자말이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푸짐하게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세기 백 년 동안 소용돌이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선조들이 물려준 이런 토박이말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뒤죽박죽 헷갈려 쓰는 바람에 힘센 낱말이 힘 여린 낱말을 밀어내고 혼자 판을 치게 되니, 고요히 저만의 뜻과 느낌을 지니고 살아가던 낱말들이 터전을 빼앗기고 적잖이 밀려났다. ‘날래다’와 ‘이르다’ 같은 낱말들도 6·25 전쟁 즈음부터 ‘빠르다’에 밀리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날래다’와 ‘이르다’가 ‘빠르다’에 자리를 내주고 자취를 감출 듯하다. 우리네 정신의 삶터가 그만큼 비좁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빠르다’는 무슨 일이나 어떤 움직임의 처음에서 끝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가 짧다는 뜻이다. 일이나 움직임에 걸리는 시간의 길이가 길다는 뜻으로 쓰이는 ‘더디다’와 서로 거꾸로 짝을 이룬다. ‘날래다’는 사람이나 짐승의 동작에 걸리는 시간의 길이가 몹시 짧다는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기쁘다’와 ‘즐겁다’는 누구나 자주 쓰지만 뜻을 가리지 못하고 마구 헷갈리는 낱말이다. · 기쁘다 :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나다. · 즐겁다 :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믓하고 기쁘다.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사전에서 ‘기쁘다’를 ‘즐겁다’ 하고, ‘즐겁다’를 ‘기쁘다’ 하니 사람들이 어찌 헷갈리지 않을 것인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아 읽는 어느 책에서는 ‘즐겁다’를 “느낌이 오래가는 것”이라 하고, ‘기쁘다’를 “느낌이 곧장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쓰임새를 더듬어 뜻을 가리려 했으나, 이 역시 속살에는 닿지 못한 풀이다. ‘기쁘다’와 ‘즐겁다’는 서로 비슷한 구석도 있고, 서로 다른 구석도 있다. 서로 비슷한 구석은 무엇인가? ‘기쁘다’와 ‘즐겁다’는 모두 느낌을 뜻하는 낱말이다. 기쁘다는 것도 느낌이고 즐겁다는 것도 느낌이다. 그냥 느낌일 뿐만 아니라 좋은 쪽의 느낌이라는 것에서 더욱 비슷하다.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몸까지도 좋다는 느낌으로서 ‘기쁘다’와 ‘즐겁다’는 한결같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구석은 무엇인가? ‘기쁘다’와 ‘즐겁다’는 느낌이 빚어지는 뿌리에서 다르다. 좋다는 느낌이 마음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지난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국어 시험지에, “다음 밑금 그은 문장에서 맞춤법이 틀린 낱말을 찾아 고치시오.”에서와 같이 ‘밑금’이라는 낱말이 자주 나왔다. 그런데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밑금’은 시나브로 꼬리를 감추고 ‘밑줄’이 슬금슬금 나타나더니 요즘은 모조리 ‘밑줄’뿐이다. “다음 밑줄 친 문장에서 맞춤법이 틀린 낱말을 찾아 고치시오.”와 같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도대체 시험지 종이 바닥에다 무슨 재주로 ‘줄’을 친단 말인가? ‘금’은 시험지나 나무판같이 바탕이 반반한 바닥 또는 바위나 그릇같이 울퉁불퉁하지만, 겉이 반반한 바닥에 만들어진 자국을 뜻한다. ‘자국’이라고 했지만, 점들로 이어져 가늘게 나타난 자국만을 ‘금’이라 한다. 사람이 일부러 만들면 ‘금을 긋다’ 하고, 사람 아닌 다른 힘이 만들면 ‘금이 가다’ 또는 ‘금이 나다’ 한다. 사람이 만들 적에 쓰는 움직씨(동사) ‘긋다’의 이름꼴(명사형)이 곧 ‘금’이고, ‘그리다’와 ‘그림’과 ‘글’도 본디 뿌리는 ‘긋다’에서 벋어난 낱말이다. ‘줄’은 반반한 바닥(평면)에 자국으로 나 있는 ‘금’과는 달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입체로 이루어진 기다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그치다’나 ‘마치다’ 모두 이어져 오던 무엇이 더는 이어지기를 그만두고 멈추었다는 뜻이다. 이어져 오던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얽혀 있고, 사람의 일이나 자연의 움직임에 두루 걸쳐 쓰이는 낱말이다. 그러나 이들 두 낱말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저만의 남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그치다’와 ‘마치다’의 뜻이 서로 넘나들 수 없게 하는 잣대는, 미리 어떤 과녁이나 가늠을 세워 두었는가 아닌가다. 미리 어떤 과녁이나 가늠을 세워 놓고 이어지던 무엇이 그 과녁을 맞혔거나 가늠에 차서 이어지지 않으면 ‘마치다’를 쓴다. 아무런 과녁이나 가늠도 없이 저절로 이어지던 무엇은 언제나 이어지기를 멈출 수 있고, 이럴 적에는 ‘그치다’를 쓴다. 자연의 움직임은 엄청난 일을 쉬지 않고 이루지만, 과녁이니 가늠이니 하는 따위는 세우지 않으므로, 자연의 모든 움직임과 흐름에는 ‘그치다’만 있을 뿐 ‘마치다’는 없다. 비도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태풍도 그치고, 지진도 그친다. 과녁이나 가늠을 세워 놓고 이어지는 무엇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고 모두 과녁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나 움직임에는 ‘그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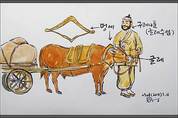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자유는 사람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다. 그러나 사람은 몸과 마음에 얽힌 굴레와 멍에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가 몹시 어렵다. 가끔 굴레를 벗고 멍에를 풀었을 적에 잠깐씩 맛이나 보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온전한 자유에 길이 머물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의 몸과 마음에 얽힌다는 굴레나 멍에는 빗대어 말하는 것일 뿐이고, 참된 굴레나 멍에는 소나 말 같은 집짐승을 얽어매는 연모다. ‘굴레’는 소나 말의 머리에 씌워 목에다 매어 놓는 얼개다. 소가 자라면 코뚜레를 꿰어서 고삐를 코뚜레에 맨다. 그리고 고삐를 굴레 밑으로 넣어서 목뒤로 빼내어 뒤에서 사람이 잡고 부린다. 이때 굴레는 고삐를 단단히 붙들어 주어서, 소가 부리는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말은 귀 아래로 내려와 콧등까지 이른 굴레의 양쪽 끝에 고삐를 매어서 굴레 밑으로 넣고 목뒤로 빼내어 뒤에서 사람이 잡고 부린다. 굴레가 고삐를 맬 수 있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여, 말이 부리는 사람의 뜻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한다. ‘멍에’는 소나 말에게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를 끌게 하려고 목덜미에 얹어 메우는 ‘ㅅ’ 꼴의 막대다. 멍에 양쪽 끝에 멍에 줄을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사랑하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들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푸나무까지도 힘이 솟아나고 삶이 바로잡힌다는 사실을 여러 과학자가 밝혀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목숨의 바탕이기에, 참으로 사랑하면 죽어도 죽음을 뛰어넘어 길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 사람이 삶으로 보여 주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말꽃(문학)이나 삶꽃(예술)이 예나 이제나 사랑에서 맴돌고, 뛰어난 스승들의 가르침이 하나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부채질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사랑하다’와 비슷한 토박이말에 ‘괴다’와 ‘귀여워하다’와 ‘좋아하다’가 있다. 이들 넷을 비슷한 토박이말이라 했지만, 저마다 저만의 빛깔을 지니고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서로 다르다. 우선 이들 네 낱말은 ‘괴다’와 ‘귀여워하다’가 한 갈래로 묶이고, ‘사랑하다’와 ‘좋아하다’가 다른 한 갈래로 묶여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앞쪽 갈래는 높낮이가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쓰는 것이고, 뒤쪽 갈래는 높낮이가 서로 비슷한 사람 사이에서 쓰는 것이다. ‘괴다’와 ‘귀여워하다’는 아이와 어른 사이, 제자와 스승 사이, 아들딸과 어버이 사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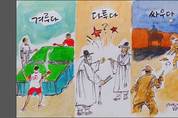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세상 목숨이란 푸나무(풀과 나무)건 벌레건 짐승이건 모두 그런 것이지만,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 산다. 핏줄에 얽혀서 어우러지고, 삶터에 얽혀서 어우러지고, 일터에 얽혀서 어우러져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자니까 서로 아끼고 돌보고 돕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겨루고 다투고 싸우기가 십상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겨루고 다투고 싸우는 노릇이 갈수록 뜨거워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일백 년에 걸쳐, 침략해 온 일제와 싸우고, 남과 북이 갈라져 싸우고, 독재 정권과 싸우며 가시밭길을 헤쳐 와서 그런지 삶이 온통 겨룸과 다툼과 싸움으로 채워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온통 싸움의 난장판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는데, 겨룸과 다툼과 싸움을 제대로 가려 놓고 보면 그래도 세상이 한결 아늑하게 느껴진다. 정작 싸움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툼과 겨룸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겨룸은 무엇이고, 다툼은 무엇이며, 싸움은 무엇인가? · 겨루다 :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다. · 다투다 : ①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다. ②승부나 우열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물은 햇빛, 공기와 함께 모든 목숨에게 가장 뺄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물을 찾아 삶의 터전을 잡았다. 그러면서 그런 물에다 갖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먹거나 쓰려고 모아 두는 물이 아니라 흘러서 제 나름으로 돌고 돌아 갈 길을 가는 물에 붙인 이름을 살펴보자. 물은 바다에 모여서 땅덩이를 지키며 온갖 목숨을 키워 뭍으로 보내 준다. 이런 물은 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되어 땅 위로 내려와서는 다시 돌고 돌아서 바다로 모인다. 그렇게 쉬지 않고 모습을 바꾸고 자리를 옮기며 갖가지 목숨을 살리느라 돌고 돌아 움직이는 사이, 날씨가 추워지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얼음이 되기도 한다. 그처럼 김에서 물로, 물에서 얼음으로 탈바꿈하며 돌고 도는 길에다 우리는 여러 이름을 붙여 나누어 놓았다. 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던 물이 방울이 되어 땅 위로 내려오는 것을 ‘비’라 한다. 그리고 가파른 뫼에 내린 비가 골짜기로 모여 내려오면 그것을 ‘도랑’이라 한다. 도랑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사람의 집 곁으로 흐르기 십상이기에, 사람들은 힘을 기울여 도랑을 손질하고 가다듬는다. 그래서 그것이 물 스스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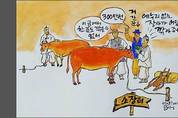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값’은 남이 가진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 적에 내가 내놓는 값어치를 뜻한다. 그것은 곧 내가 가진 무엇을 남에게 건네주고 대신 받는 값어치를 뜻하기도 한다. 이때 건네주는 쪽은 값어치를 ‘내놓아야’ 하지만, 값어치를 건네받는 쪽은 값을 ‘치러야’ 한다. 값어치를 내놓고 값을 받는 노릇을 ‘판다’ 하고, 값을 치르고 값어치를 갖는 노릇을 ‘산다’ 한다. 팔고 사는 노릇이 잦아지면서 때와 곳을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이 모여 종일토록 서로 팔고 샀다. 그때를 ‘장날’이라 하고, 그곳을 ‘장터’라 한다. 본디는 파는 쪽에서 내놓는 것도 ‘무엇’이었고, 사는 쪽에서 값으로 치르는 것도 ‘무엇’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슬기가 깨어나면서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는 쪽에서는 돈으로 값을 치르는 세상이 열렸다. 그러자 돈을 받고 무엇을 파는 노릇을 일로 삼는 사람도 생겼는데, 그런 일을 ‘장사’라 하고, 장사를 일로 삼은 사람을 ‘장수’라 부른다. 장사에는 언제나 ‘값’으로 골치를 앓는다. 값을 올리고 싶은 장수와 값을 낮추고 싶은 손님 사이에 밀고 당기는 ‘흥정’이 불꽃을 튀기지만, 언제나 가닥이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