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주광일 시인이 올해 5월 20일 4번째 시집 《나의 꿈 나의 기도》를 세상에 내셨습니다. 주 시인은 서울법대 문우회 회장을 하시면서 문우회 단톡방에 정력적으로 시를 올리시더니, 1년 5개월여 만에 4번째 시집을 내셨네요. 주 시인은 일상이 시입니다. 날마다 접하는 자연이나 사람, 뉴스 등 어느 것 하나 시와 연결되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서문을 쓴 정순영 시인의 말처럼 주 시인의 시는 천진난만하고 거짓이 없으며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 시인은 서문에서 주 시인의 시에 딱 맞는 공자의 사무사(思無邪)를 인용합니다. 이번 시집 《나의 꿈, 나의 기도》도 이렇게 일상에서 길어 올린 천진난만한 사무사(思無邪)의 시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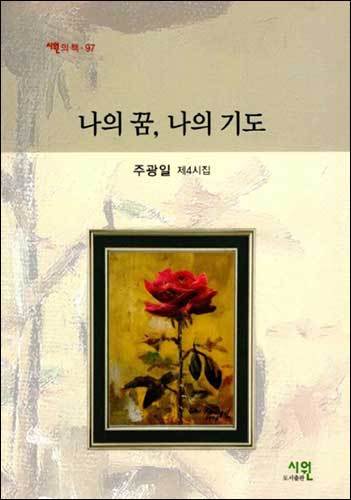
이렇게 일상이 흐르는 천진난만한 《나의 꿈, 나의 기도》를 감상하다 보면 봄을 맞이하고 여름 지나 가을이 오고 어느덧 주 시인의 인생 지혜가 절정에 이르는 겨울이 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 말미마다 써놓으신 시를 쓴 날짜를 보니, 시도 대체로 계절이 가는 순서대로 배치하였네요.
시집은 5부로 나뉘어 있는데, 아예 3부 제목은 <가을비에 젖은 어느 영혼>, 4부는 <낙엽지는 소리 들으며>, 5부는 <겨울해는 서산에 기울고>로 계절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집 끝에서 시 해설을 한 김송배 시인은 《나의 꿈, 나의 기도》를 자연 변화에서 탐색하는 자아의 성찰이라고 합니다. 저도 계절을 따라 주 시인의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뭇 가까워진 어느 봄날
60년 넘는 내 친구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데
이제는 사는 동안
실컷 반성하고,
실컷 기도하며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2021년 어느 봄날>이라는 시의 첫 연입니다. 봄을 노래하는 시라면 먼저 봄을 영어로 Spring’이라고 하듯이 만물이 약동하는 봄기운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 시인은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친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팔순을 넘기신 노시인은 봄을 맞이하면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도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둘째 연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 사뭇 흐릿해진 봄날”이라고 하고, “서녘 하늘 바라보니 / 별을 기다리는 저녁노을만 / 눈부시게 타고 있구나”라고 노래합니다.
그뿐인가요? 주 시인은 <노인의 봄날>에서는 “이 봄엔 어디 갈 곳도 없네”, “이 봄엔 떠날 자유조차 없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연에서는 “그래도 싱그러운 새봄의 풀꽃/ 야무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 아쉬운 봄날 풀죽은 노인의 / 오랜 시름 덜어주네”라며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름은 또 어떠할까요? 주 시인은 <2021년 여름 일기>라는 제목의 연작시를 11편까지 쓰셨습니다. 연작시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돌림병에 시달리는 여름을 시에 담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코로나 와중에도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주 시인은 눈은 당연히 여기에도 꽂힙니다. 그
그래서 연작시 1편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 올림픽경기를 치른다고 야단법석인데 / 참가선수들이 수용소에 갇혀 / 가혹한 형벌을 기다리는 포로들처럼 / 딱하게 생각되네”라며, 이 코로나 와중에 올림픽을 강행함을 딱하게 생각하면서도, 2편에서는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관중도 없이 / 올림픽경기를 치른다네 / ”바람아 불어라. 관중도 없이 / 죽을 힘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 시원하게, 바람아 불어라.”며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또 그해 여름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하면서 끝내는 아프가니스탄을 다시금 우스꽝스러운 탈레반 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주 시인은 연작시 4편에서 “탈레반이 / 아프가니스탄 전역은 물론 / 수도 카불마저 점령하자 / 카불 공항은 탈출시민들로 / 아비규환이라는데 ,/ 서울 귀뚜라미 밤새워 운다”라고 슬피 노래합니다. 7편에서는 “카불 공항 활주로 바닥에 버려져 울고 있던 생후 7개월 아기를 걱정하면서 잠이 덜 깬 눈을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을을 데려오는 장대비 내리는 이른 새벽 답답한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마른기침을 하면서 눈물에 젖은 눈두덩을 비비면서 악귀들이 장악한 아프칸에 남겨져 죽음보다 더 참혹한 생지옥의 삶을 이어가는 자유민들을 위하여 피울움 담긴 기도를 드린다.”라며, 터져 나오는 감정을 산문시로 표현합니다. 연작시 5편에서는 돈다발 싸 들고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 분노하며, 이와 대비되는 교육부 장관을 보며 시를 토해내고요. 이 시는 전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하던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돈다발을 싸 들고
‘빛의 속도’로 국외로 달아나 버렸다.
72세의 아슈라프 가니라는 남자다.
그날 그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던 45세의
랑기나 하미디라는 여자는 끝까지 공무를 수행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였다. 그녀는 자택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영국 B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살아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죽음의 땅 카불에 남았다.
달아난 남자 대통령과
혼돈에 빠진 조국에 남은 여자 장관.
누가 바보인가? 누가 현자(賢者)인가?
카불 함락 이후 벌써 3일째,
78세의 한국 남자인 시인은
이유 없이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
무슨 까닭인지 오늘은,
힘든 삶을 이겨내셨던
이 나라 어머니들이 그립다.
저도 주 시인 따라 이유 없이 부끄러워지는군요. 이번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시 <나의 꿈, 나의 기도>도 탈레반이 임신 8개월 된 여자 경찰관을 가족들 앞에서 총살했다는 뉴스를 보시고 쓴 시입니다. 시인은 그 뉴스를 보시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겨우 잠든 꿈속에서 태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도하십니다.
(앞에 줄임)
가위 누르는 꿈속에서
나는 들었네.
엄마와 함께 총살된 8개월
태아의 울음소리를...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새벽잠에서 깨어났네.
그리고 소리 없이 아픈 가슴으로
기도했네.
“하느님,
살아있는 우리들을 덜 불쌍하게
여기시더라도, 이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죽은 아프칸의 태아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주님의
자비로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남의 나라 뉴스이지만 임신 8달 된 여자 경찰관의 죽음을 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도의 시를 쓰는 주 시인은 참으로 가슴이 따뜻한 시인임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주 시인은 가을에는 <가을 엽서>라는 연작시를 무려 27편이나 올렸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주 시인은 쓰고 싶은 가을엽서가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 내가 쓰는 글이 시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나는 아직 모르겠네.
그래도 내가 시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어디 조용한 곳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숨어버리고 싶었네.
그렇게 남모르는 부끄러움만 쌓여가던
2021년 어느 가을날, 나는 마침내
내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작은 결심 하나 하였다네.
시인이라고 불리건 말건
남은 세월이라도 착하게 살면서
'말이 되는 말만 쓰다 가리'라고.
<가을 엽서> 9번째의 연작시입니다. 주 시인도 한때는 “내가 과연 시를 쓰는 걸까?” 하며 부끄러워하셨군요. 그러면서 착하게 살며 말이 되는 말만 쓰다 가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 하셨다는데,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결심이라면 결코 작은 결심은 아니겠지요. 시인이시여! 앞으로도 우리 후학들에게 참으로 말다운 말, 시다운 시를 계속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시인은 겨울엽서도 26편을 쓰셨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엽서이니 엽서에는 모든 것을 벗어던진 나목(裸木)에 찬바람이 ‘쌩~’하게 스치는 스산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대 생각나면 / 하늘을 보며 / 속으로 울고”<겨울 엽서 13>, “흐린 하늘 아래 / 찬바람은 끊임없이 불었고 / 나의 기도는 끊임이 없었고”<겨울 엽서 16>, “그리움이 무언지도 / 모른 채로 서슬 퍼런 / 세월 더불어 / 살고 있다네”<겨울 엽서 18>, “어스름이 다가오면서 / 바람은 더욱 차진다 / 내 가슴도 더욱 떨린다”<겨울 엽서 21>,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음을 / 나는 알고 있다 / 이제는 내가 나를 스스로 / 위로해 주어야 함을 / 나는 알고 있다”<겨울 엽서 22> 등등. 이렇게 주시인은 겨울의 스산함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겨울에 주 시인은 결코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시인의 <겨울 기도>를 음미합니다.
저는 오늘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디짧은 겨울 낮 한나절
골방에 틀어박혀 존 밀턴의
실낙원을 읽었을 뿐입니다.
저는 내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레, 글피에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
그러므로 주님, 저는 이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의 가슴에 남아있는 마지막
아쉬움과 목마름을 씻어주소서.
자꾸만 어두워지는 한 치 앞을 밝혀 주소서.
제 여정의 끝은 주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
그러니 저를 주님 뜻대로 처분하소서.
보잘것없는 제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시를 음미하다 보니, 당장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주님 뜻대로 처분에 맡긴다는 노시인의 기도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선배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겨울기도>를 다시 천천히 음미하면서 《나의 꿈, 나의 기도》를 본 감상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