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 때 사간원에서 성균관 학유 조득인의 직임을 거두기라는 상소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학정(學正)ㆍ학록(學錄)이란 벼슬은 유생(儒生)의 사표(師表)로서, 인재의 현능(賢能, 어질고도 재간이 있음) 여부와 풍속의 아름답고 고약한 것이 모두 이와 직접 관련되고 있으므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이 이조에서의 각 품에 제수한 문서를 접해 보았는데, 새로 급제한 조득인(趙得仁)으로 성균관 학유(學諭)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염치(廉恥)라는 것은 사풍(士風, 선비의 기풍)의 가장 큰 근간이옵고, 장리(贓吏, 뇌물받거나 횡령한 자)는 중인이 경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관오리와 불법한 인간은 비록 그 후손까지라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옵서 특별히 관대하옵신 도량과 어떤 추한 것도 다 포용하옵시는 덕으로 장리의 자손까지도 또한 다시 등용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덕은 길이 그 후손까지 뻗어가게 하시고, 악한 일은 그 자신에만 그치게 하옵시는〉 아름다운 뜻으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조득인은 장리인 조진(趙瑨)의 손자입니다. 어찌 성균관 학정·학록의 직임에 합당하겠습니까...
하여, 드디어 조정의 논의가 각기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우찬성 신개(申槪)가 헌의하기를, "조득인은〈장리 조진의〉 친아들이 아니고 손자이요, 또 학정ㆍ학록이 비록 대간이 모두 동의하여야만 나와 사은하는 직분이긴 하오나, 대간에 비유할 것은 아니오니 다른 벼슬에 옮기지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20년6월9일)
한 관리에 대한 평가에는 복잡한 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때 세종은 한 개인을 평가하는데 그를 둘러싼 가문이라든가 환경까지를 살핀 것이 사실이지만 조상의 잘못이 본인에게 미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다. 인재가 귀하고 인재를 얻는 것이 곧 정치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세종 23년에 사간원에서 이추를 감찰에 임명함이 불가하다고 청한 일이 있었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추(李抽)를 감찰로 삼으시니, 추의 조부 이양(李揚)은 일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을 얻었고, 외조부 심종(沈悰)은 회안군(懷安君 이방간)과 사사로이 결탁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마땅히 벨 것이 온데,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입어 벌을 받지 아니하였사오나, 그 죄는 종사(宗社)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사오니, 추를 감찰에 임명함은 심히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하리라." 하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우승지 민신(閔伸)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 주의(注擬,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세 사람을 임금에게 추천하여 올리는 일)에 참예하였사오나, 모두 말하기를, ‘착한 사람을 대우함은 오랫동안 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함은 짧게 한다(善善長惡惡短) 라고 하는데, 어찌 그 조부의 죄를 손자에게 미치게 하리오.’ 하므로, 즉시 아뢰지 아니하였사옵고, 심종의 일은 신 등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23/윤11/3)
여기서도 연좌제 문제가 연상되는 벌을 제기하지만, 할아버지 때 일을 손자에게 미칠 수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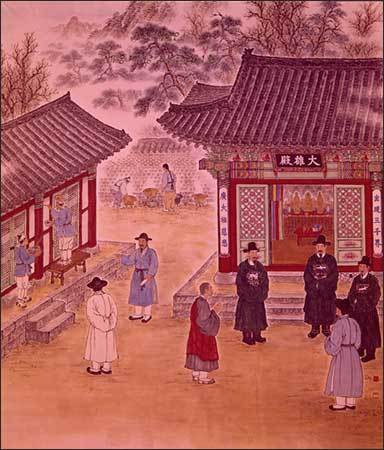
세종 23년에 사리각 경찬회와 이추의 개차(改差, 관원을 갈아냄)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에 사리각 경찬회(불상, 경전 등이 새로 완성되거나 절, 탑 등이 낙성되었을 때 이를 경축하기 위한 행사)를 파하기를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이르시기를, ‘이 회를 간략하게 베풀면 진실로 폐가 없다.’라고 하시오나, 신 등은 애초에 여기에 이를 것을 뜻하지 아니하였으니, 청하옵건대, 파하게 하옵소서. 또 감찰은 임금의 이목(耳目)이온데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이추(李抽)를 개차(改差, 벼슬아치를 바꿈)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 살피고 깨달은 것이 많다. 그러나 사리각은 이미 부처가 있고 다시 창건하였으니, 불공하는 법회(法會)를 베풀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명제(漢明帝) 이래로 대대로 어진 임금이 있어 불교를 존숭해 믿었으나 해(害)가 있지 아니하였다. 또 이추의 일은, ‘착한 사람을 존경하기를 오래도록 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기는 짧게 한다.(善善長惡惡短)’는 말이 일찍이 있었고, 형벌이 후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도 유자(儒者)의 말이니, 외가(外家)의 일로써 그 외손에게 누(累)가 미칠 수 없다." 하였다. 우정언 이계선(李繼善)이 반대의견을 아뢰자, "나의 전일에 한 말은, 나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른 것인데, 너희들이 잘못 들은 것이다.이추의 일은 내가 이미 자세히 생각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23/윤11/9)
종교에는 국가의 규범은 있어도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종교는 중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재를 귀히 여긴다는 정신은 종교문제에까지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예는 서얼, 장리의 후손인 하복생을 판사로 제수한 것에 반대하나 불허한 일이다.
대사헌 윤형(尹炯)등이 상소하기를, "서얼(庶孽)은 사족(士族)에 들 수 없고, 장리(贓吏)는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니, 명분을 중히 하고 염치를 가다듬게 하자는 것은 참으로 고금의 큰 관방(關防, 부정행위를 막음)입니다. ... 주상 전하께서 너그러움과 포용하시는 도량으로 서얼ㆍ장리의 후손도 만일 취할 만한 것이 있으면 또한 혹 거두어 쓰고 과거보는 것까지 허락하시니,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는 것은 길게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짧게 하시는(善善長惡惡短) 은혜의 지극함이오나, 일찍이 가볍게 제수를 허락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하복생은 하구(河久)의 양첩소생이요, 장리(贓吏) 김음(金音)의 외손인데, 별로 재주와 덕이 없고 다만 공신의 자손으로 분수에 원래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지금 또 군자판사(軍資判事)를 제수하시니, 대개 작은 관청의 장(長)도 오히려 알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리의 자손도 이미 생원(生員)을 허락하고 급제(及第)를 허락하였으니, 판사(判事)가 비록 높다고 하나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하물며 복생은 다른 공신의 자손이 아니니, 비록 서얼이라도 능히 그 집을 이으니 족히 국가의 기쁨이 될 만하다. 마땅히 그 허물을 엄호하여 선업(先業)을 잇게 하여야 하겠으니, 너희들의 말이 옳기는 하나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30/5/20)
“복생은 비록 서얼이라도 능히 그 집을 이으니 족히 국가의 기쁨이 될 만하다. 마땅히 그 허물을 엄호하여 선업(先業)을 잇게 하여야 하겠으니, 너희들의 말이 옳기는 하나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인재에 대한 세종의 단호한 모습이 보인다. ‘선장악단(善長惡惡)’이란 장점은 오래, 단점은 짧게 하라는 뜻을 살리는 말이 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정치를 볼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