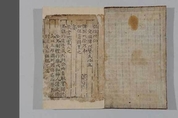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정도전 (1342, 충혜왕 복위 3~ 1398, 태조 7) -② 정도전은 조선전기 정치인이자 학자이다. 조선의 정신적 기틀을 세운 인물이다. 호는 삼봉(三峰)이다 활동사항 정도전은 문인이면서 동시에 무(武)를 겸비했고, 성격이 호방해 혁명가적 소질을 지녔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의론(議論)이 정연했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유배ㆍ유랑 생활을 보내면서 곤궁에 시달렸다. 더욱이, 부계혈통은 향리(鄕吏)의 후예로서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연안 차씨(延安車氏) 공윤(公胤)의 외가 쪽의 서자였다. 특히 모계에 노비의 피가 섞여 있었다. 이러한 혈통 때문에 권문세족이나 명분을 중요시하는 성리학자들로부터 백안시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시대에도 3대 종 집안의 하나라는 세인의 평을 받았다. 그가 청ㆍ장년의 시기를 맞았던 고려 말기는 밖으로 왜구ㆍ홍건적의 노략질로 나라 안이 어수선했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횡포로 정치기강이 무너지고 민생이 몹시 고단하였다. 이러한 때에 9년 동안의 시련에 찬 유배ㆍ유랑 생활은 그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 사랑 의식을 깊게 만들었으며, 그의 역성혁명(왕조가 바뀌는 일) 운동은 이러한 개혁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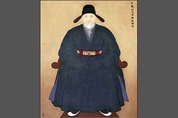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정도전(鄭道傳, 1342, 충혜왕 복위 3~ 1398, 태조 7) 정도전은 조선전기 정치인이자 학자로 호는 삼봉(三峰)이다. 출생지는 충청도 단양 삼봉(三峰)이다. 고려 말 개혁적 신진사대부로 활동했으나 모계에 노비의 피가 섞여 있어 혈통 문제로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이성계 휘하에 들어가 조선의 건국을 기획하고 구현해냈다. 조선조의 국가경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로서 정착시킨 설계자이기도 하다. 《조선경국전》을 비롯한 경세론 관련 저작을 남겼다. 세자책봉 문제로 불거진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의 사상을 모은 《삼봉집》이 있다. 세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조선 건국의 민권 사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으니 먼저는 당시 왕조세력의 관점인 《조선왕조실록》 평가로서의 졸기를 살펴보자.(《태조실록》7/ 8/26. 1398) 졸기 정도전의 호(號)는 삼봉(三峰)이며, 본관은 안동(安東) 봉화(奉化)다. 고려 왕조 공민왕 9년(경자년, 1360)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임인년(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이색(李穡, 1328 충숙왕 15 ~ 1396 태조 5) 이색은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정치가이며 유학자로 시인이다. 호는 목은(牧隱),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성리학을 고려에 소개하고 확산시키고 새로운 사회의 개혁과 지향점으로 지목하였다. 이제현의 제자로서 그의 문하에서 성리학자들은 다시 역성 혁명파와 절의파로 나뉘게 된다. 정도전, 유창 등의 스승이었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역성혁명에 협조하지 않았고 조선 개국 이후에도 출사하지 않았다. 그는 고려 말 삼은(三隱,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의 한 사람이다. 세종 때 보면 <성리대전>을 명으로부터 받은 기록이 있다. 진헌사(進獻使)에 첨총제(僉摠制) 김시우(金時遇)가 명에서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며, 처음에 윤봉(尹鳳)이 돌아갈 적에 임금이 대전(大全)·사서 오경(四書五經)·《성리대전(性理大全)》·《송사(宋史)》 등의 서적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시우(時遇)가 돌아올 적에 황제(皇帝)가 특별히 하사한 것이다. (《세종실록》 8/11/24) 그리고 세종은 이 <성리대전>을 읽으며 이를 정치 사상의 기초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생애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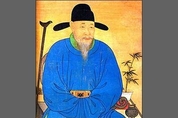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을 살피고 있다. 하연과 한상경, 황보인을 보자. 하연(河演, 우왕 2년 1376년 ~ 단종 1년 1453) 하연은 조선 초기의 영의정을 지낸 문신이자, 성리학자, 서예가, 시인으로 문종의 스승이다. 하연의 졸기를 중심으로 그의 활동을 살펴보자. “영의정(領議政)으로 잉령치사(仍令致仕, 임금의 영 에 따라 그대로 벼슬에 머묾)한 하연(河演)이 졸(卒)하였다. 하연은 진주 사람이다. 병자년(1396 태조 5년)에 과거에 올라 봉상 녹사(의정부 중추원의 벼슬아치)에 보직(補職)하였다가 뽑혀서 직예문 춘추관 수찬관이 되고 여러 관직(官職)을 더하여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이르렀다가 승정원 동부대언에 발탁 제수되었다. 태종(太宗)이 하연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은 이 벼슬에 이른 까닭을 아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경이 대간(臺諫)에 있을 때 의연하게 일을 말하였으므로, 내가 곧 경을 알았다." 하였다. 세종이 내선(內禪, 후손에게 양위)을 받자, 지신사(知申事, 밀직사의 정3품 관직)에 제수하였다. 이때 나라에 일이 많았는데, 하연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을 살피고 있다. 최항(崔恒, 태종 9년/1409~성종 5년/1474) 최항(崔恒)은 조선 전기의 대학자로서 세종ㆍ문종ㆍ단종ㆍ세조ㆍ예종ㆍ성종 때 관직에 있으면서 문물제도 정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역사와 언어에 정통하였으며 문장에도 뛰어났다. 2004년 10월의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최항은 1409년(태종 9) 삭녕(현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태어났다. 세종 16년(1434)에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집현전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집현전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고, 세종 25년(1443)에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뒤인 세종 33년(1450) 집현전부제학이 되었다. 최항은 1452년(문종 2) 동부승지에 제수되었고, 단종 1년에 도승지와 이조참판을 역임, 1455년(세조 1) 대사헌ㆍ호조참판ㆍ이조참판ㆍ형조판서ㆍ공조판서를 지낸 뒤 1460(세조 6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1467년(세조 13년) 영의정에 올랐고, 1474년(성종 5) 죽었다. ▪ 생애: 집현전의 또 다른 인재 젊은 시절에 비범한 뒷이야기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들을 살피고 있다. 조말생과 허후를 보자. 조말생(趙末生, 1370 공민왕 19 ~ 1447 세종 29) 조선전기 병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州)다. 생애 및 활동사항 1401년(태종 1) : 생원으로서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요물고(料物庫, 궁중의 양식으로 쓰는 곡식을 맡아보던 관청) 부사(副使)에 임용되었고, 감찰ㆍ정언ㆍ헌납을 거쳐 이조정랑에 승진되었다. 1407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2등으로 급제하여 전농시典農寺, 제물로 올리는 곡물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부정(副正)이 되었으며, 다시 장령ㆍ직제학을 역임하였다. 1411년(태종 11): 판선공감사가 되었다가 곧 승정원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에 잠시 임명되었으며, 승진하여 지신사(知申事) 등을 역임하고, 1418년에는 이조참판에 이르러 가정대부(嘉靖大夫)가 되었다. 같은 해 8월에 형조판서ㆍ병조판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세종 8년(1426) : 뇌물 받은 죄로 연좌되어 외직으로 좌천되었다. 세종 14년에 동지중추원사가 되고 다음 해에 함길도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다. 세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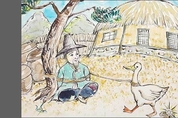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들을 살피고 있다. 윤회와 정흠지를 살펴보자. 윤회(尹淮, 우왕 12, 1386 ~ 세종 18. 1436)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문신이다. 윤회(尹淮)는 조선 초의 대표적인 문한관(文翰官, 문필에 관한 일을 하는 직책)으로서 국가의 여러 편찬 사업에 참여하고 많은 글을 지었으며, 경연에서 여러 차례 경사(經史)를 강론하였다. 활동사항 윤회는 나이 10살에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외울 정도로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태종 1년(1401) :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좌정언, 이조좌랑ㆍ병조좌랑, 이조정랑ㆍ예조정랑과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를 거쳐 변정도감(辨正都監)이 되어 송사를 판결함이 공명하고 진실하였다. 태종 17년(1417) : 승정원의 대언(代言)이 되었다. 태종이 일찍이 윤회에게 이르기를 “경은 학문이 고금을 통달했으므로 세상에 드문 재주이고, 용렬한 무리와 견줄 바가 아니니 힘쓰라” 하였다. 임금은 곧 윤회를 병조참의로 삼아 가까이 두고 늘 ‘순정(純正)한 학자’라 일컬었다. 세종 4년(1422) : 집현전이 설치되자 부제학으로 임명되고 다시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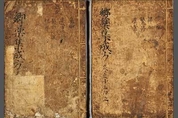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들을 살피고 있다. 졸기를 토대로 유효통과 이계전을 살펴보자. 유효통(兪孝通, 태어난 때와 죽은 때 모름) 세종 9년(1427)에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대사성을 거쳐 집현전 직제학이 되었는데, 문장에 능한 학자이고 의학에 정통한 의학자이다. 집현전 부제학, 병조 참의(參議), 중추원 부사 등을 지냈다. 세종 13년 전의감정(典醫監正) 노중례(盧重禮) 등과 같이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과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펴냈다. 문장에도 뛰어나 《동문선(東文選)》에 몇몇 작품이 남아 있다. 생애 및 활동사항 태종 8년(1408) :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세종 즉위년(1418): 병조 좌랑(佐郞)이 되었고, 그 뒤에 집현전 수찬(修撰)과 집현전 응교(應敎), 예문관(藝文館) 직제학, 집현전 부제학, 공조 참의(參議), 강원도관찰사, 병조 참의, 중추원 동지사, 중추원 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세종 9년(1427): 문과중시(重試) 을과에 급제하여 대사성을 거쳐 집현전 직제학이 되었는데, 문장에 능하고 의학에 정통하였다. 세종 13년 : 전의감정(典醫監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들을 살피고 있다. 졸기를 중심으로 유관과 유정현을 살펴보자. 유관(柳寬, 충목왕 2, 1346~세종 15, 1433) : 조선의 청백리 · 유관의 졸기 세종 15년 5월 7일(1433) 나이가 많아 우의정을 물러난 유관(柳寬)이 졸(卒)하였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곧 슬피 울어서 초상난 것을 알리고자 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오늘은 잔치를 베푼 뒤이고, 또 예조에서 아직 정조장(停朝狀, 조회를 정지)을 올리지 않았으며,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니, 내일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고, 흰옷과 흰 산선(繖扇, 임금이 나들이할 때 앞에 세우는, 우산 모양으로 생긴 의장)으로 홍례문 밖에 나가 백관을 거느리고 의식과 거행하였다. 관의 처음 이름은 관(觀)이고, 자는 몽사(夢思)인데, 뒤에 이름은 관(寬), 자를 경부(敬夫)로 고쳤다. 황해도 문화현 사람으로 고려 정당문학(政堂文學) 공권(公權)의 7대손이다. 공민왕 20년(신해년, 1370)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번 옮겨서 전리 정랑(典理正郞), 전교 부령(典校副令)이 되고, 봉산 군수로 나갔다가 들어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들을 살피고 있다. 졸기를 중심으로 안경공, 안순, 안지를 살펴보자. ∙ 안경공(安景恭 충목 3, 1347 ~ 세종 3, 1421) 세종 이전에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데 이바지한 인물이다. 소개를 대신하여 졸기를 보자. “흥녕 부원군 안경공(安景恭)이 졸(卒)하였다. 경상도 순흥부 사람이었다. 판문하부사 안종원(安宗原)의 아들로 사람됨이 단정하고 근엄하며, 고려의 병진년(우왕 2년, 1376)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번 승진하여 밀직사(密直司) 좌부대언이 되었고, 태조께서 개국할 때 여러 장상(將相)과 같이 추대하여 좌대언으로 승진되고,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에 책정되었다가 관제(官制)가 시행되면서 중추원 도승지로 임명되고, 사헌부 대사헌에 승진하여, 공안부(恭安府)와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고 부원군으로 승진하였다. 일찍이 경상ㆍ전라ㆍ황해도의 안찰사가 되었는데 너그럽고 간단명료하여 까다롭게 굴지 아니하였다. 죽던 해에 나이가 75살이다. 조정 일을 3일 동안 정지하여 조의를 표하고 시호를 양도(良度)라 하였다. 온순하고 착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뛰어나고, 의로운 일을 좇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