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약 1만 년 전 무렵에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여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바다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 자원의 이용은 신석기시대와 구석기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양 오산리 유적, 창녕 비봉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 등 한반도 각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신석기인들이 식량으로 이용했던 각종 어류와 바다 포유류의 뼈, 패류 껍데기가 발견됩니다. 또한 식량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낚시와 작살, 그물추 등의 도구, 배와 노 등도 발견되어 당시에 어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인들의 먹거리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 유적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들이 쌓인 조개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다양한 동물 뼈 등으로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살았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먹거리를 확보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석기시대 조개무지 유적에서는 조개, 굴 등의 패류 껍질과 참돔, 다랑어, 삼치, 대구, 방어, 복어 등 다양한 어류의 뼈, 강치,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근간으로 왕실의 품위와 선비의 격조가 미술품에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문기(文氣)가 흐르는 품위와 격조는 조선백자의 미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17~18세기 영ㆍ정조 연간에 제작된 조선백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은 왜란(1592~1598)과 호란(1636~1637)의 피해를 극복하여 정치ㆍ사회ㆍ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회복하였으며, 문화적으로는 조선 제2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조선의 관요에서는 순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동화백자 등 다양한 종류의 백자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백자 큰 항아리가 바로 ‘백자달항아리’입니다. 17세기 후반에 나타나 18세기 중엽까지 유행한 이 백자는 보름달처럼 크고 둥글게 생겼다 해서, 1950년대에 ‘백자달항아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달항아리를 조선백자의 알맹이로 꼽는 이유는 절제와 담박함으로 빚어낸 순백의 빛깔과 둥근 조형미에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달항아리만의 특징입니다. 조선의 이상과 세계관을 담은 백자 조선은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예’란 유교 문화 전통에서 인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기실에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주거 생활과 생업 활동을 보여 주는 다양한 발굴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설명카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가운데 많은 유물이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1974년 주민의 제보로 발견되었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견 당시 일본 고고학계의 견해를 뒤엎을 만한 획기적인 자료가 수습되었고 이후 발굴에서도 새로운 자료들이 연이어 확인되는 등 역사ㆍ학술적 값어치를 인정받아, 1976년 사적(면적 546,908㎡)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여 송국리 유적 발굴과 연구 성과로 한국의 청동기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호 돌널무덤의 발견 1974년 4월 국립박물관은 부여 초촌면 현지 주민의 제보를 받고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팀은 판석 위에 큰 돌이 얹어져 있었다는 주민의 상세한 설명에 이미 도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표를 제거하고 덮개돌을 들어 올린 뒤 흙을 제거하다 보니, 예상과는 달리 동쪽 벽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서울의 동북쪽인 경기도 양주에 한 때는 삼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 정도로 규모가 컸던 회암사(檜巖寺) 터가 있는데, 중심 전각인 보광전(普光殿) 터에서 <‘효령대군(孝寧大君) 덕갑인오월(宣德甲寅五月)’이라는 글자가 있는 수막새> 여러 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수막새 가운데 범어인 ‘옴’자가 있고 글자 좌우에 효령대군’이, 하단에 ‘선덕갑인오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설명하면, ‘효령대군(1396∼1486)’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의 둘째 형으로 불교를 옹호한 대표적인 왕실 인물이고, ‘선덕’은 중국 명나라 선종(宣宗, 재위 1426~1435)의 연호로, 선덕연간 중 갑인년은 1434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수막새는 1434년 5월에 제작되어 보광전 기와로 사용되었으며, 효령대군은 수막새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보광전 불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왕자 이름이 왜 사찰 수막새에 등장했을까? 조선시대의 특징으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억불정책을 공식처럼 외워왔는데, 조선 왕실의 주요 인물인 대군이 무슨 연유에서 절 수막새 제작에 관여했을까하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서예실에 비석 한 기(基)가 서 있습니다. 몸체가 둘로 깨어져 위아래를 붙인 이 비석은, 모습도 표면도 세월의 흔적에 닳아 있습니다. 천년을 넘어간 세월을 지낸 이 비석의 이름은 <태자사 낭공대사비(太子寺郎空大師碑)>입니다. 원래 이름은 ‘태자사 낭공대사 백월서운탑비(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이며, 세상 사람들은 ‘백월비(白月碑)’라고도 부릅니다. <태자사 낭공대사비>는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던 시대) 낭공대사(郎空大師, 832~917)의 탑비입니다. 태자사와 탑은 이미 오래 전에 없어졌고 오로지 대사의 생애를 기록한 비석만이 남아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국사, 큰 스승 낭공대사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비석에는 그의 85년의 인생, 불가의 연과 수행자로서, 학승으로서,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61년의 승려로서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석의 글은 낭공대사의 입적(入寂) 한해 뒤에 최치원의 동생이자 신라 말 고려 초 최고 문장가 최인연(崔仁㳘, 868~944)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석이 세워진 것은 고려 광종 5년, 낭공대사가 죽은 뒤 37년 후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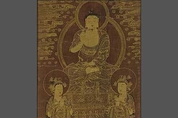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약사불(藥師佛)’은 과거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보살이었을 때 12가지의 소원을 세웠습니다. 아픈 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반드시 그 바람을 이루리라 맹세했습니다. 약사불은 오랜 시간 쌓은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간절했던 서원(誓願)으로 인해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부처로 오랜 시간 신앙이 되었습니다. 금동불, 석불, 마애불(암벽에 새긴 불상), 목조불 등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꾸준히 조성되었으며, 그의 모습은 보물(옛 지정번호 보물 제2012호)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처럼 불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보물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약사불과 그의 두 협시보살을 그린 조선시대 불화입니다. 높이 60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적갈색 화면 위에 부처와 두 보살의 찬란한 모습이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금니(금박 가루를 아교풀에 갠 것)로 그려져 있습니다. 보상화(寶相華)와 연꽃무늬로 장식된 높은 수미단 위에 금니로 섬세히 그려진 연꽃이 활짝 피었고, 그 위로 약사불이 앉았습니다. 바탕재가 훼손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다리 위에 올린 왼손에는 약사불의 상징인 약합(藥盒)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1123년 서긍(徐兢, 태어나고 죽은 때 모름)은 송 휘종이 파견한 국신사 일행 가운데 한 명으로 한 달 남짓 고려에 머물면서 공식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고려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그에 대한 면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입니다. 이 책의 그릇 부분에는 고려의 다양한 그릇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특히 ‘도로조(陶爐條)’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산예출향도 비색이다.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무늬가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그 나머지는 월요의 옛날 비색이나 여주에서 요즘 생산되는 도자기와 대체로 비슷하다.” 위의 내용은 고려시대 도자공예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산예출향(狻掜出香)'은 사자가 장식된 향로를 말하는데, 당시 서긍은 연화형(蓮花形) 향로 뚜껑 위에 사자가 장식된 것을 보고 이처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색은 비색(翡色)이며 매우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졌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 기록에 맞는 가장 비슷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청자 사자장식 향로‘입니다. 이 향로는 뚜껑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호패(戶牌ㆍ號牌)는 조선시대 16살 이상의 남성들이 차고 다니던 신분증으로 조선시대 전시실의 필수 전시품이기도 합니다. 호패법은 1413년(태종 13)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호패는 호구(戶口)를 파악하여 각종 국역(國役)을 부과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었기에 역을 부담해야 하는 양인(良人)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사회 제도를 재정비했던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대에 이르러서야 호패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재질과 수록 정보가 다른 호패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호패 재질도 달랐습니다. 2품 이상의 관리는 상아로 만든 아패(牙牌)를, 3품관 이하 관리는 뿔로 만든 각패(角牌)를, 그 이하의 양인은 나무패를 착용했습니다. 재질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도 달랐습니다. 착용자의 성명, 출생 연도, 제작 시기, 관(官)이 찍은 낙인(烙印)은 공통 요소이나, 상아ㆍ각패에는 나무 호패에 있는 신분과 거주지 정보가 없고 대신 과거 합격 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패와 각패에는 신분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지 정보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는 종종 판을 바꾸어 다시 펴내고, 그때마다 저자는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조선시대에 책을 출판하는 일이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지만, 1459년에 세조가 펴낸 《월인석보(月印釋譜)》가 오늘날로 치면 수정, 증보로 완성도를 높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앞 두 글자 ‘월인’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앞 두 글자 ‘석보’를 합하여 붙인 책 이름입니다. 그럼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어떤 책들일까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부모님과 아들의 명복을 빌며 1446년에 세종의 비이자 당시 수양대군이었던 세조의 어머니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가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왕후의 명복을 비는 데는 불경을 옮겨 쓰는 것만 한 일이 없으니 네가 석가모니의 행적을 편찬하여 번역함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이에 수양대군은 1447년에 석가모니의 전기를 모아 《석보상절》을 펴내고 이를 막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세종께 올렸습니다. 이를 보신 세종이 《석보상절》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이 초상화는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1848~1941)이 그린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 1833~1906)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에서 최익현은 머리부터 허리까지 그려진 반신상으로 그려졌고, 머리에는 모관(毛冠, 털모자)을 쓰고, 몸에는 심의(深衣, 신분이 높은 선비가 입던 웃옷)을 걸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면암최선생 칠십사세상 모관본(勉菴崔先生 七十四歲像 毛冠本)’, 왼쪽 아래에는 ‘을사맹춘상한 정산군수시 채석지도사(乙巳孟春上澣 定山郡守時 蔡石芝圖寫)’라고 씌어 있어, 1905년에 채용신이 그린 최익현의 74살 때의 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최익현은 을사년(1905)에는 75살였고, 74살 초상을 그렸다면 병오년(1904)에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채용신이 그렸던 전형적인 초상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곧 수없이 많은 붓질로 인물의 형태와 양감, 음영 등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모관은 가느다란 세필(細筆)로 마치 영모화(翎毛畵)를 그리듯이 묘사하였고, 심의는 탁한 흰색으로 두텁게 표현하여 맹춘(孟春: 정월)에 입었을 만한 겨울복색을 그렸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또는 유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