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뜰에 가보니 판자들로 막아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디자인 작품 같은 것이 그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 작품이 아니고 “공사안내”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만 고려했는지 글씨들은 작게 써놓았습니다. 더구나 이 안내판의 제목은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이 안내판을 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인일 텐데 그냥 한글로 “공사중”이라고 쓰면 될 것을 이 무슨 잘난 체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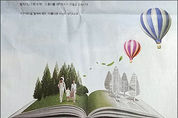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종이세상을 펼치는 대한제지가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이 흔히 영어를 써서 광고하는 것과 달리 영어 없는 한글광고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영어 없는 광고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칭찬합니다. 정말 기업주가, 기업이 민족주체성이 있다면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참좋은여행사는 회사 이름도 우리말로 했고, 광고도 우리말로 “참 좋았어요”라 써놓아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흔히 잘못 쓰이는 “너무 좋았다” 대신 “참좋은”이란 바른 말을 썼으며, 그렇다고 영어도 쓰지 않은데다 지저분하게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으면서 눈에 쏙 들어오는 좋은 광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서울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면서 “다시 파이팅하기”란 문구를 썼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파이팅(fighting)”이란 말은 본래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출처가 모호한 가짜 영어죠. ‘파이팅’은 호전적인 뜻으로 ‘싸우자’ '맞장 뜨자’는 정도의 뜻일 뿐이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속하자!’를 나타내는 말은 '키프 잇 업’(keep it up)이라고 해야 바르다고 합니다. 더러는 이 말을 '화이팅’이라고 소리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며, 얼큰한 대구탕을 끓이는 ‘대구’(whiting)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힘내자’, ‘아자아자’ 같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콩글리시 가짜 영어를 쓰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어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용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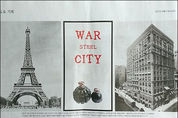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어제(2017. 6. 17) 경향신문에는 전면에 걸쳐 인문학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미국 시카고의 홈인슈어런스빌딩 사진 사이에 독일군이 쓴 수류탄을 배치하여 멋진 디자인 솜씨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WAR STEEL CITY”라고 제목을 영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또 토요기획 칼럼의 연제 제목도 영어를 한글로 쓴 “리틀 빅히스토리”입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풍기는 것은 <민족주체성이 빠진 잘난 체>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신문에 올리는 글에 꼭 영어로 제목을 달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호수공원(고양시)을 산책하는 길에 만난 '맹꽁이 서식지' 팻말이 매우 반가웠다. 사라져간다는 맹꽁이가 이 동네서 자란다니 싶은 마음에 풀이 무성한 습지를 한참동안 바라다 보았다. 녀석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진 것일까? 습지는 조용할뿐이다. 모쪼록 이 동네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서식지'라는 말이다. 서식이란 <표준국어대사전> 풀이로는 "서식(棲息):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이라고 되어 있다. 자리를 잡았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어서, 구태여 어려운 한자말로 '서식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길목인데 한자말을 쓰지말고 "맹꽁이가 자라는 곳" 또는 "맹꽁이가 사는 곳"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 쉬운 것을 어렵게 풀이하고 있는곳곳의 '설명판, 표지판, 알림판' 따위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말 사랑'을 먼저 바탕에 깔고 관련된 일을 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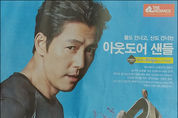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야외활동차림(아웃도어) 기업인 “레드페이스”는 그동안 영어 광고를 하여 꾸짖음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광고에는 영어가 아닌 한글광고를 하여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말이 아닌 영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웃도어 샌들“이라고 한글로 제목을 달고 ”물도 건너고, 산도 건너는“이라며 우리말로 표현도 해놓았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는 큰 손뼉을 쳐주고 싶습니다.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우리은행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톡 SORi 나는 금융”입니다. 우리말로 된 은행이 왜 광고에 억지 영어 “SORi”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멋있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더구나 그 아래는 “위비톡 플랫홈(WIBEE PLATFORM)”이라는 어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바꿀 수는 없었나요? 은행이름은 우리말로 잘 만들어 놓고 영어에 허우덕거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우리문화신문=성제훈 기자] 어제 비가 내렸고, 오늘도 비가 조금은 더 내린다고 합니다. 바람도 무척 서늘하네요. 어제저녁에 초등학생 아이가 벽보를 보고 '주인 백'이 무슨 뜻이냐고 묻더군요. 알림 백 자를 써서 '주인 알림'이라고 했더니, "아, 알림... 그렇게 쉬운 말을..."이라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자기가 모르는 말을 늘 저에게 묻고, 제가 쉽게 설명해주면, 그렇게 쉬운 말을 왜 어렵게 쓰냐고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저에게 좀 미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쉬운 말을 왜 어렵게 쓰냐"고 하지 않고, 혼잣말로 말끝을 흐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거의 다 '가뭄 해갈'이라는 기사 꼭지를 뽑았더군요. '해갈'은 '解渴'로 비가 내려 가뭄을 없애주는 것을 이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갈증을 풀어 버림'으로 다듬어 놨습니다. 저라면 '가뭄 해갈'을 '가뭄에 도움'이나 '가뭄 벗어나'정도로 풀어쓰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저희 집 애는 '가뭄 해갈'을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지하철에 탔더니 초등학생들이 20여 명이 함께 어딘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모두 파란빛의 반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 뒤 모두 영어로 범벅이 된 것입니다. 뒤에 “WATER=LIFE” 곧 “물은 생명”이라고 써서 그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도 물론 한글은 없고 영어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뜻이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입는 티셔츠가 영어로 범벅이 되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담임 선생님은 무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릴 때부터 우리말 사랑은 보이지 않고 사대주의만 키워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 승용차에는 뒤에 “초보예요 말이나 탈걸”이라고 써두었습니다. 그걸 본 우리 일행은 “와”하고 웃었습니다. ‘초보운전이니까 잘 봐주세요.’라는 뜻으로 우스갯소리로 표현했으니 이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양보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어떤 차에는 “초보라 미안해요 비행기를 살 걸 그랬네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왕초보운전 직진만 오일째”, “뒤에서 빵빵하니 아기도 울고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내가 제일 무섭다.”, “발로 하는 운전이라 미안해유”, “오른쪽이 브레이크죠?”, “ 등 재미난 스티커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보운전 당황하면 후진함(후진전적 2회)”,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같은 협박성이라든지, ”R아서 P해라“ 같이 말도 안 되는 영문자를 붙이는 것, ”NEW DRIVER“, ”BABY IN CAR“, ”I’m sorry 초보운전“처럼 완전 영문, ”운전 못하는데 보태준 거 있수?“ 같은 예의 없는 것, ”뒤에서 받으면 나는 좋지만 뭐 ㅋㅋ“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