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제자백가(諸子百家)로 일가를 이룬 사상가가 허다하지만
가장 허풍이 세고, 황당무계한 장황설을 늘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장자(莊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구라 대왕, 뻥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장자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해에 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은 그 크기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의 등 넓이도 몇천 리인지 알 수 없다.
한번 노하여 날면 그 날개가 하늘에 구름을 드리운 것 같았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명으로 이사를 한다.
남명이란 하늘 연못이다.”
원래 곤(鯤)이란 물고기의 배 속에 든 알이나 새끼로 참으로 작은 생명체입니다.
그것을 몇천 리나 되는 고기로 둔갑시킨 장자는 대륙의 허풍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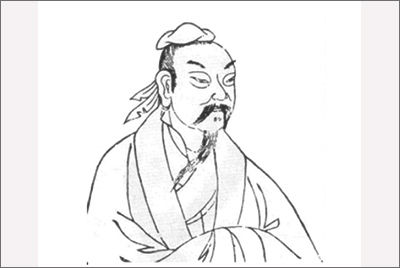
그가 아주 작은 것을 매우 큰 것에 비유하는 것엔 까닭이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이나 매우 큰 것이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곧 “크다,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모든 사물은 평등하다는 것에서 장자는 출발합니다.
곧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색안경,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뻥이 심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지만, 그 우화가 주는 깨달음의 호쾌함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장자를 읽는 맛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간의 마음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교육에 의하여 관념이 형성되고 환경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그것이 보편타당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장자는 이런 고정관념을 인위(人爲)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소요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도(道)에 기반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퍽 해괴한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는 장자가 현대에도 읽히는 까닭입니다.
장자가 꿈꾸는 삶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좌망(坐忘)을 이야기하지요.
* 좌망 :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는 것
요즘 유행하는 ‘멍때리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자를 읽으면 집착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져오는 행복이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