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흔히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다. 대를 이어 부를 지키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재산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지키는 것 자체가 일이다. 관리해야 할 것도,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많다. 그래서 300년 이상 ‘재벌가’로 부를 이어간 가문을 보면, 응당 그 비결이 궁금해진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 만석꾼으로 이름을 떨친 ‘경주 최부잣집’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임금이 바뀌면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하던 시절, 굳건한 처세와 대를 잇는 철학으로 무려 12대 300년 동안 부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나눔의 정신으로 조선 최고의 ‘적선지가(積善之家)’가 되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라 했던가. 덕을 쌓은 집안에 복이 있듯, 최부잣집은 부를 베풀수록 나날이 번성했다. 부를 베풀고, 민심을 얻고, 그 민심이 더 큰 부를 불러들이는 부의 선순환. 그것이 바로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었다.
이 책, 《명가-나눔을 실천한 최부잣집》은 그 부의 비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최부잣집을 소재로 2010년 방영한 사극 《명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엮어냈다. 비록 사극은 생각보다 이목을 끌지 못한 채 조용히 종영했지만, 책으로 아쉬움을 충분히 달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알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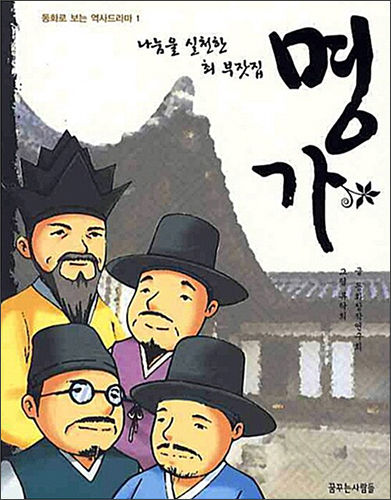
부의 기반을 닦은 1대 최진립, 이어받은 부를 더욱 늘린 2대 최동량, 본격적인 만석꾼 대열에 들어선 3대 최국선, 대를 이어 지켜온 재산을 독립운동에 아낌없이 희사한 12대 최준까지, 문중 300년 역사에서 톺아낸 최부잣집 부의 비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부잣집의 성공을 바라는 이들이 많게 했다. 최부잣집은 2대 최동량 때부터 수확을 소작인과 주인이 반으로 나누는 병작제를 도입했다. 농사를 잘만 지으면 수확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으니, 소작농들은 신이 나서 농사를 지었고 자연히 생산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부잣집 땅을 경작하고자 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고, 좋은 땅이 나오면 앞다투어 소개했다. 최부잣집은 철저한 이익 공유제로, 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여 생산력을 올린 덕분에 소작농의 고혈을 쥐어짜지 않고도 다른 지주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다.
둘째, 부를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처세로 사람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다. 흔히 부자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뭇 사람들의 질시를 받기 마련이다. 최부잣집은 만석꾼 집안이면서도 항상 근검절약하고, 해마다 수입 3천 석 가운데 삼 분의 일인 천 석을 빈민 구제에 사용하며, 흉년에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과 같은 기회주의적 처세를 지양했다.
이런 처세의 진가는 특히 난세에 빛을 발했다. 1894년 경주에서 활빈당이 부잣집을 휩쓸고 다니던 시절, 최부잣집만 무사할 수 있었다. 활빈당이 최부잣집을 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최부잣집을 보호한 덕분이다.
셋째, 항상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며 혁신을 추구했다. 최부잣집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과객은 조선 팔도의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급변하는 세상에 적절히 대처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3대 최국선은 시비법과 이앙법 등 혁신적인 농법을 도입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생산량 자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부를 끝없이 늘리지 말고 천 석을 유지하라던 1대 최진립의 뜻도 지켜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부의 끝없는 확장을 경계하는 뜻은 면면히 이어져, 최부잣집은 재산이 만 석을 넘기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했다.
넷째,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탐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최씨 집안 부를 지켜낸 가장 큰 비결일지도 모른다. 왕조시대에는 고관대작을 하다 축출되어 멸문지화를 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벼슬길의 무서움을 몸소 보고 느낀 1대 최진립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 것을 원칙으로 남겼다.
진사 역시 조선의 수재들만 합격할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이었기에 그 자체로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 글을 아는 선비로 적당한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서도, 높은 벼슬은 피해 가문의 재산을 지킨 현명한 처세였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명예와 재물을 함께 탐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시절이다. 명예를 추구한다면 청렴을 제1원칙으로 삼고 한없이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거대한 부를 쌓았다면 한없이 높은 벼슬은 탐하지 않는 자족(自足)의 미덕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매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행동을 절제한 최부잣집의 균형감각, 그것이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 아닐까. 게다가 베푼 덕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적선(積善)’의 뜻을 깊이 깨닫고 실천한 한결같은 나눔 정신이 12대를 이어간 부의 바탕이었다.
존경받는 부자가 유난히 흔치 않은 한국의 현실에, 경주 최부잣집 후손들이 ‘적선지가 필유여경’의 표본으로 더욱 번성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최부잣집의 처세와 철학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한국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만방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