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땅은 저마다 이름이 있다.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 뜻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저마다 이름이 있고 사연이 있다.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곳도 이름에 얽힌 사연을 알고 나면 더없이 가깝고 정겹게 느껴지는 법이다.
이 책, 《그래서 이런 지명이 생겼대요》는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ㆍ경기ㆍ충청 등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땅이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친절하고도 정겹게 풀어주는 책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명에 얽힌 유래도 함께 소개해 다 읽을 때쯤이면 세계로 눈을 넓힐 수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지명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다섯 개를 뽑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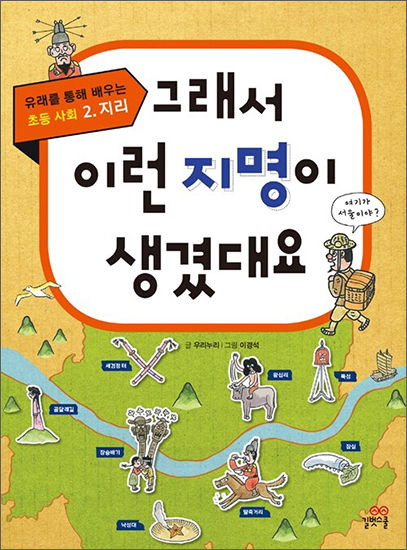
#1. 장승배기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경기도 화성(지금의 수원)으로 이장한 뒤, 11년 동안 12차례나 찾아갔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그러나 지금도 가깝지 않은 수원을 그 당시 가려면 꽤 먼 길을 움직여야 했다.
현륭원으로 행차하던 정조는 커다란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여기는 민가도 없고 사람도 드물어 귀신이 나올 것처럼 음침했다. 그래서 정조는 오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곳에 장승 두 기를 세우라 명했고, 이때부터 이곳은 ‘장승배기’라 불리게 되었다.
#2. 종로
누구나 한 번쯤 지나쳐봤을 종로. 이 ‘종로’라는 지명은 ‘종루’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서울을 한양으로 정하면서부터 지금의 종로1가에는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을 설치하고 종이 있는 누각을 ‘종루’라 했는데, 종로(鐘路)는 이 종루가 있던 길이라는 뜻이다.
밤 10시쯤 되면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모두 닫는다는 뜻으로 종을 28번 쳤고, 이렇게 종을 쳐서 통행금지를 알리는 것을 ‘인정’이라 했다. 통행금지가 풀리는 새벽 4시에 사대문을 한꺼번에 열고 종을 33번 치는 것은 ‘파루’라 했다. 오늘날 12월 31일에 제야의 종을 33번 치는 것도 이 파루에서 유래한 것이다.
#3. 통영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전라좌수사(전라도의 왼쪽 해안을 총괄하는 으뜸 무관)이었던 이순신은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며 전라도 해안을 지켜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처하자 조정에서는 삼도수군통제영을 급히 설치하고 통제사에 이순신을 임명했다.
삼도수군통제영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모두 관리하는 군사본부였고, 줄여서 ‘통제영’ 또는 ‘통영’이라 불렀다. 경남 통영은 바로 통제영이 만들어진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항전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4. 팔공산
후삼국 시대, 고려의 왕건은 후백제 견훤과 지금의 대구 지역에서 맞붙었다. 여기서 대패한 왕건은 산속으로 몸을 피했고, 후백제 군사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자 끝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왕건의 부하 장수였던 신숭겸은 왕건과 자신의 갑옷을 바꿔 입고 포위망 뚫기에 나섰다. 왕건의 갑옷을 입은 신숭겸을 본 후백제 군사들은 집중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신숭겸, 김락, 복지겸 등 여덟 명의 장수들이 왕건을 살리고 대신 목숨을 잃었다. 이에 여덟 명의 공신이 목숨을 잃은 산이라고 해서 ‘팔공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5. 해운대
신라 말기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고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신라로 돌아왔다. 비록 육두품 출신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관직인 아찬 벼슬을 받았지만, 개혁안을 반대하는 신라 귀족들의 횡포로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낙향했다.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바다와 동백섬을 보며 지친 심신을 달래다가 동백섬 남쪽 암벽에 ‘해운대’라고 새겨넣었다. 최치원의 어릴 적 이름이 ‘바다 구름’이라는 뜻의 ‘해운(海雲)’ 또는 ‘외로이 떠도는 구름’이라는 뜻의 ‘고운(孤雲)’이었기 때문이다. 최치원이 암벽에 자신의 어릴 적 이름 ‘해운대’를 새긴 뒤로 이 바닷가는 해운대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명들은 모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어떤 이름에는 구슬픈 사연이, 어떤 이름에는 그 시대의 제도와 문물이 담겨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대개 각 땅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이 책이 전하는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유래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가위 연휴 막바지, 어딘가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친척을 만날 때 가볍게 펼쳐보기 좋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책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괜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