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서한범 명예교수] 지난 주 속풀이에서는 조선의 음악 현황을 살피러 나온 다나베 앞에서 아악부의 존폐를 걱정하며 연주하게 된 노악사들의 심경을 상상해 보았다.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선조들에게 응원을 청하였을 것이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연주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 이에 감동을 받은 다나베는 실로 세계의 보배인 이 음악을 동양의 음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이야기, 악사들의 혼신을 다한 연주도 연주이지만, 그보다도 종묘제례 음악속에 녹아있는 한민족의 혼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감동을 받은 다나베는 아악부의 청사를 확대 증축하는 문제, 악사들의 처우 개선문제, 아악의 보존을 당국에서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청원을 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아악부에서는 계획대로 일반인들로부터 아악생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등, 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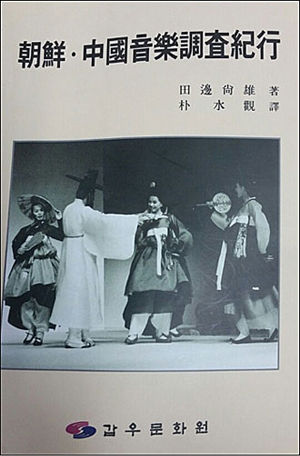 |
||
| ▲ 다나베 히사오가 쓴 《조선, 중국음악조사기행》 | ||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침략국의 음악인이 식민지국가의 음악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 쉽게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의 아악을 직접 조사해 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의 이름은 전변상웅(田邊尙雄), 다나베 히사오이다.
그는 《일본음악의 연구》, 《일본음악사》, 《동양음악사》, 《대동아의 음악》 등의 저서와 「조선음악고」「조선의 악곡 및 악기의 연혁」「조선음악과 일본음악의 관계」 등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특히, 박수관의 번역판으로 발간된 《조선, 중국음악조사기행》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중 하나를 공개해 보기로 한다. 그는 일본 궁내성 악부(樂府)의 부속기관이었던 아악연습소의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악부의 책임자로 있는 악장 상진행(上眞行)이란 사람이 그에게 조선 총독부에서 보내온 수사본(手寫本), 《조선악개요》라는 자료를 보여 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조선 이왕직에는 우리 일본 아악과는 다른 대규모의 아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왕직은 재정 곤란에 빠져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동물원이나 혹은 아악부 가운데 하나를 당장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총독부와 의논을 하였는데, 총독부의 반응은 동물원은 민중을 위해 이익을 미치고 있지만, 이왕가의 아악 같은 것은 민중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으니, 아악을 폐지하고 동물원을 남기겠다고 한다.”
침략국의 만행이 야만적이어서 결국 조선의 전통 아악은 폐지키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백년 동안 이어온 음악과 함께 수백명의 악인이 해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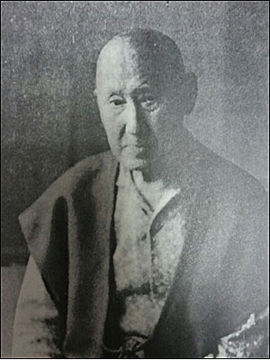 |
||
| ▲ 아악의 보존을 일본 당국에 청원한 다나베 히사오 | ||
1897년 고종 광무 1년 당시만 하더라도 770 여명의 악사들이 활동하였으나 10년 뒤, 순종 원년 1907년에는 300여명으로 감축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또 100여명이 줄었다. 강제합방을 당한 다음해인 1911년에는 이름을 《아악대》로 개칭하면서 80여명의 악인이 해산되었고, 1915년 이후에도 또 수십명씩 감축이 되어 이제 악장(樂長)인 명완벽(당시 70세) 이하 6명의 노악사만이 남아 그 잔무를 처리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왕가에서는 아악을 폐지하기 전에 기록만이라도 남기겠다는 일념으로 1917년에 《조선악개요》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 악부에 전해진 것이다. 이제 6명의 잔류 악사들이 악보정리를 마치면 아악부는 곧 해산하게 되어 있으니 참으로 주권없는 식민지 국가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악부의 상(上)악장은 악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자이고, 한학에도 정통하여 아악의 이론과 역사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준 다나베의 스승이었으며 또한 다나베를 아악연습소의 강사로 초빙한 은인이기도 한 사람이다. 그는 다나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이왕가의 아악은 곧 폐지되어 영원히 없어질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가 보존책을 취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당한 시기이고, 또한 급선무이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다”(다음 주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