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서한범 명예교수] 국악속풀이에서는 다나베가 쓴 《조선. 중국의 음악조사기행》 속에 나타난 당시의 음악관련 상황이나 사회 현상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1921년 4월 1일, 다나베는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부산 선창에 모여 있는 조선인의 옷이 모두 새하얗고 깨끗한 것을 보고 인상이 깊었다고 술회하였다. 조선인들이 왜 흰 옷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르는 채 말이다. ▲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중인 소리꾼과 춤꾼들(봉상소 뜰)
당시 부산역에서 출발한 급행열차가 서울까지 10시간 정도 걸렸다는 점이나, 일본의 철도는 협궤(挾軌)인 반면 조선의 철도는 광궤이고 객차 내부도 널찍하며 흔들림도 적어 승차감이 좋았다는 이야기, 거리와 주택의 모습에서는 조선인들의 거리는 대체로 낮 동안만 활기가 있고, 밤이 되면 갑자기 적적해져 버린다는 점, 일본인 거리의 가옥은 지붕부터 건축양식이 직선적이고 딱딱한데 반하여 조선의 가옥은 작기는 하나 모두가 곡선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 창덕궁 앞의 소옥(小屋) <단성사>에서 기생춤, 즉 장고춤을 보았는데 몸을 구불거리고 발놀림이 자연스러워 재미있었다는 이야기, 이 당시에는 영화관을 활동소옥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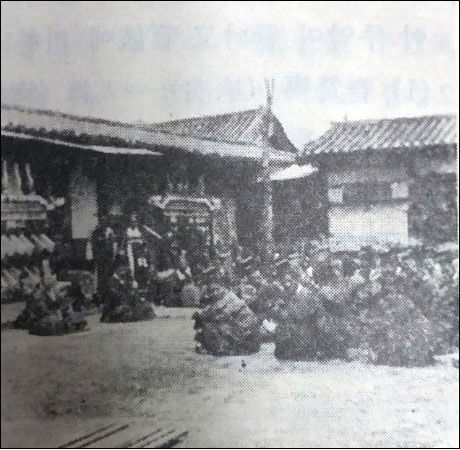
계속해서 1920년 당시, 일본인 다나베가 본 조선의 음악관련 현상이나 사회 정황들을 그의 기행문을 통해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1921년 4월 5일 그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 "승무" 명월관 뜰에서, 다나베 찍음
“이왕직 아악기의 진동수를 측정한 다음, 조선 민악 중 가장 이름 높은 「영산회상」이라는 대곡의 주악을 들었다. 그리고는 오후 4시경에 아악대를 떠나 김 군의 안내로 경성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악기 제조 판매점인 종로의 견지동 50번지의 <안동상점(安洞商店; 점주는 박덕인씨>에 가서 현금, 장고, 수고, 그리고 장식용 풍경 한 쌍을 구입하였다. 가격은 현금 35엔, 장구 15엔, 수고 2엔, 풍경3엔 계 55엔이었다.”
94년 전의 악기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흥미롭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는 조선악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던 곳이 유일하게 한 곳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종로 3가에서 창덕궁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국악기 판매점이나 무용도구와 의상, 그리고 국악학원이 줄을 잇고 있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악기의 값이 현금(玄琴), 곧 거문고가 35엔인 반면 장구가 15엔이었다는 사실도 이상하다. 다시 말해 장구 2대 값이면 거문고를 살 수 있다는 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의 가격이라면 장구 10대 값으로도 거문고를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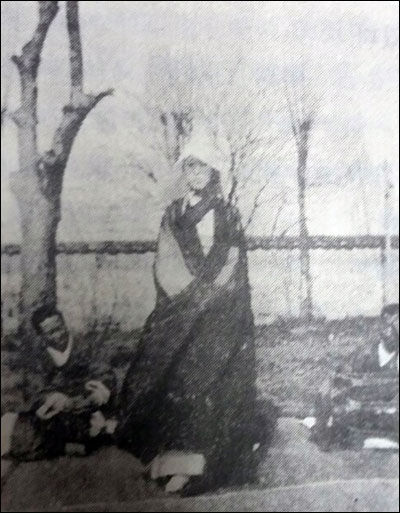
악기를 구입하여 여관에 돌아온 다나베는 저녁 시간에 무용발표회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는 무용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기행문 도처에 “가정춤을 추었다, 가정 춤을 보여 주었다.” 하는 글귀가 보이고 있다. 역시 전일에 기대를 걸고 갔던 단성사를 또 찾아 가는 것이다. 다음의 내용에서 당시에 인기를 끌던 춤이나 소리가 어떤 것이었나 하는 점을 알게 한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김 군의 안내로 기생 춤을 보기 위해 단성사를 따라나섰다. 전일에는 영화가 주였지만, 오늘은 기생의 연예뿐이었다. 관내는 조선 사람으로 만원이었으며 일본인은 우리들 몇 뿐이었다. 처음에는 관기(官妓)들의 춤이었다. 다음은 13세의 귀여운 어린 기생이 혼자서 유명한 <승무>라는 춤을 뛰어난 솜씨로 추었기 때문에 만장이 탄복하여 갈채를 보냈다. 다음은 창극 춘향전 가운데 이별의 노래 한 절을 부르고, 또 같은 대표적인 가극 심청가 중의 한 절, 그리고 민요로서 대표적인 평양의 수심가, 다음에 대표적 무용 <검무>를 기생 2인이 추었고, 그리고 잡가 여러 곡을 부르며 기생이 재미있게 춤을 추었다. 마지막으로 창극 춘향전의 한 장면을 했다.”
아마도 이 날은 영화는 상영치 않고 무대 공연만이 연출된 모양이다. 관기들의 춤이란 궁중무용의 한 종목을 말하는 것이고, 나이 어린 소녀가 승무를 잘 추어 갈채를 받았다는 점으로 당시에도 승무는 인기를 끌었던 춤이었다는 점을 알게 한다. 이와 함께 검무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춤으로 보인다.
성악장르로는 판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창극이 또한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던 것이 분명하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별가 대목이나, 심청가 중에서 한 대목, 그리고 창극 춘향전의 한 대목 등이 연출된 점으로도 짐작이 된다. 그 외의 일반 민요창으로는 평양의 수심가와 경기 잡가가 등장하는데 그만큼 일반 대중이 좋아했던 종목이어서 무대 위에 올려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러 출연자들이 여러 곡을 춤과 율동을 곁들여 불렀다는 점에서 느리고 지루할 수 있는 노래들을 생동감 있게 연출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