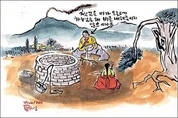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상이 하교하기를, ‘막 병란(兵亂)을 겪었는데 또 전에 없는 가뭄과 우박의 재해를 만났다. 며칠 내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모두 죽고 말 것이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침식조차 잊고 만다. 지금, 이 재변은 실로 내가 우매한 탓에 일어난 것으로 사직단(社稷壇)에서 친히 비를 빌고자 한다. 해당 조에 말하라.’ 하였다. 예조가 날을 가리지 말고 기우제를 행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는 《인조실록》 인조 6년(1628년) 5월 17일 기록입니다.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었던 조선시대엔 모내기 전인 망종과 하지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까지 나서서 기우제를 지냈고, 나라를 잘못 다스려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라 하여 임금 스스로 몸을 정결히 하고 음식을 끊기까지 했으며, 궁궐에서 초가로 옮겨 거처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3년(1394년) 5월 6일 “가뭄으로 종묘와 사직에 기우제를 지내다.”라는 기록을 시작으로 ‘기우제’라는 말이 무려 3,122건이나 나옵니다. 특히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년) 7월 2일에는 ”사내아이 수십 명을 모아 상림원에서 도마뱀으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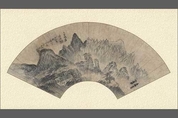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금강산(金剛山) -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一杖穿雲步步立(일장천운보보립) 山靑石白間間花(산청석백간간화) 若使畵工描此景(약사화공묘차경) 其於林下鳥聲何(기어임하조성하) 지팡이를 짚고 구름 헤쳐 걷고 걸어 서보니 산은 푸르고 돌은 흰데 간간이 꽃이 피어있네 만약 화공에게 이 경치를 그리게 한다면 그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는 어찌할거나 《단종실록》 단종 3년(1455년) 윤6월 3일 기록에는 “도승지 신숙주(申叔舟)가 고보(高黼) 등에게 문안하고, 화원(畫員) 안귀생(安貴生)을 시켜 금강산(金剛山) 그림을 정통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대인(大人)이 전날 수양군(首陽君)에게 청하였으므로, 전하께서 화공(畫工)에게 명하여 그려 온 것입니다.’ 하니, 정통이 찬탄(贊嘆)하여 마지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만큼 금강산은 중국의 사신도 감탄할 정도였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금강산을 그림으로 가장 잘 그린 이는 겸재(謙齋) 정선(鄭敾)이었다. 겸재의 그림 가운데는 금강산을 멀리서 한 폭에 다 넣고 그린 국립중악박물관 소장의 <금강전도(金剛全圖)>가 있으며, 금강산으로 가는 고개 단발령에서 겨울 금강산을 바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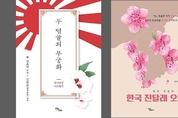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나는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국화라면서 무궁화를 심고 무궁화공원을 만들곤 하는 것이 이상스럽기만 했다. 특히 우리 역사서와 문학 그리고 그림에도 등장하지 않는 무궁화가 어찌 갑자기 국화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다. 그러다가 최근 강효백 교수의 책 《두 얼굴의 무궁화》와 《한국 진달래 오라》을 읽고 그 궁금증이 확연히 풀렸다. 강 교수는 먼저 머리말에서 ‘우리나라 옛시조 3,355수 중 단 한 수라도 무궁화를 노래했더라면’, ‘약 4,965만 자의 조선왕조실록에 무궁화가 단 번이라도 나왔더라면’, ‘화훼식물이 등장하는 조선시대 그림 154점 가운데 무궁화 그림을 단 한 점이라도 볼 수 있었더라면’, 구한말 이전 옛 민요 2,585곡 중에 무궁화를 노래한 민요를 단 한 절이라도 들을 수 있었더라면‘, ’무궁화 재배 가능지가 황해도 이남이 아니고 북한과 만주까지였더라면‘ 등을 제시하면서 무궁화는 우리의 국화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뿐만 아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정말 한반도의 무궁화를 뿌리채 뽑고 불살라버리는 등 탄압했더라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은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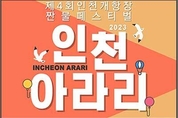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전통연희단 잔치마당(대표 서광일)은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제4회 인천 개항장 짠물 잔치>를 6월 2일부터 4일까지 연다. 인천은 1883년 외세에 의해 인천 제물포가 개항된 이후, 우리나라 근대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끌었으며 한국 근현대사의 영광과 상처를 간직한 지역으로 현대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4회 인천 개항장 짠물 잔치>는 근대 개화기의 역사적 서사를 간직한 인천역, 자유(만국)공원, 월미도 등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개항장을 주제로 전시, 체험, 공연 등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체험 프로그램인 <개항장 명소 나들이>는 개화기 의상을 입고 인천역을 시작으로 개항장 일대를 전문 안내원의 설명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의 개항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이 체험은 6월 3일~4일 낮 11시와 낮 2시,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 다른 체험 프로그램인 <인천아리랑 플래시몹>은 인천역 앞에서 6월 3일 ~ 6월 4일 낮 11시, 낮 2시 모두 4회에 걸쳐 자유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인천아리랑은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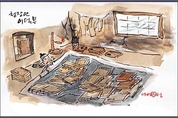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목멱산(木覓山, 남산) 아래 치인(痴人, 바보)이 있다”로 시작하는 책 《간서치전(看書痴傳)》은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李德懋)가 쓴 책입니다. 평생 이만 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는 그는 자신을 목멱산 아래 책 읽기에 미친 ‘독서광(讀書狂)’ 바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덕무는 선비의 윤리와 행실을 밝힌 《사소절(士小節)》은 물론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71권 33책 등 많은 책을 펴낸 학자로 유명하지요. “지난 경진년ㆍ신사년 겨울에 내 작은 초가가 너무 추워서 입김이 서려 성에가 되어 이불깃에서 와삭와삭 소리가 났다. 나의 게으른 성격으로도 밤중에 일어나서 급작스럽게도 《한서(漢書)》 1질을 이불 위에 죽 덮어서 조금 추위를 막았으니, 이러지 아니하였다면 거의 묏자리 귀신이 될 뻔하였다. 어젯밤에 집 서북 구석에서 독한 바람이 불어 들어와 등불이 몹시 흔들렸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노론(魯論)》 1권을 뽑아서 바람을 막아 놓고 스스로 변통하는 수단을 자랑하였다.” 이는 이덕무가 자신의 책 《청장관전서》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이덕무는 옛사람이 금은 비단으로 이불 해 덮은 것보다 책으로 해 덮은 나의 이불이 낫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빨 래 터 가난한 과부의 생 꿋꿋하게 건너는데 서러운 시간인 듯 두드리는 방망이는 빨래 속 더러움들을 벼리고 벼리다가 탁탁, 튕겨나는 소리마다 비누 풀어도 춘복 짓고 하복지어 빨래하기 어렵더라 힘겨운 시집살이를 서로에게 위로하니 (제6회 천강문학상 시조부문 대상을 받은 박복영 시인의 <빨래터> 가운데서)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례(周禮)》를 보면 떡 가운데 인절미를 가장 오래전부터 먹어왔다고 하며, ‘인절미는 찰지면서 쫀득하여 떡의 으뜸으로 여긴다.’라고 한다. 인절미는 혼례 때 상에 올리거나 사돈댁에 이바지로 보내는 떡이다. 찰기가 강한 찹쌀떡이기에 신랑신부가 인절미의 찰기처럼 잘 살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 돌아갈 때마다 “입마개떡”이라고 하여 크게 만든 인절미를 들려 보내기도 했다. 이는 시집에서 입을 봉하고 살라는 뜻과 함께 시집 식구에게 비록 내 딸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이 떡을 먹고 너그럽게 봐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 잡지 《별건곤》 제24호(1929년 12월 01일)에 있는 “사랑의 떡, 운치의 떡, 연백(延白)의 인절미”라는 제목의 글에 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며칠 전 ‘데일리안’에는 “올봄엔 '데님 셋업'이 유행하며 이른바 ‘청청 패션’이 재귀했다.”라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1930년대, 서부극이 유행하며 영화 속 주연 배우들이 청바지를 입고 등장하여 유행했던 그 ‘청청패션’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의 유행이 조선시대 한복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저고리를 보면 조선 초기인 1580년 청주 한씨의 덧저고리 길이는 무려 81cm나 되어 엉덩이까지 내려갔는데 1670년대의 누비 삼회장 저고리를 보면 42cm로 짧아집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로 오면 극단적으로 짧아졌지요. 1780년 청연군주의 문단 삼회장저고리는 19.5cm이며, 조선말 1900년대에 아주 짧아진 저고리는 길이가 12cm밖에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아진 저고리는 젖가슴이 보일락 말락 하는 것은 물론 배래(한복의 옷소매 아래쪽 부분)도 붕어의 배처럼 불룩 나온 ‘붕어배래’가 아니라 폭이 좁고 곧은 ‘직배래’여서 이 정도 되면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혼자는 도저히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맵시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던 것이 1930년대에 오면 다시 저고리 길이가 길어져 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불교에서의 탑은 원래 부처의 유골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존귀하다. 따라서 탑은 반드시 절의 중심부 곧 법당 앞에 세우며, 공양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처음으로 탑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뒤 석가모니의 사리를 똑같이 여덟 개로 나누어 인도 전역에 각기 탑을 세워 안치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삼국 시대부터 건립하였다. 탑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 목탑ㆍ석탑ㆍ전탑 등으로 나뉘며, 목탑은 나무, 석탑은 돌, 전탑은 벽돌, 모전 석탑은 돌을 벽톨 형태로 다듬어서 만든 탑이다. 지역에 따라 중국에서는 전탑이, 우리 나라에서는 석탑이, 일본에서는 목탑이 각각 발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은 백제 후기에 세워진 익산 미륵사터 석탑이며, 남북국시대 세워진 불국사 다보탑과 불국사 3층 석탑, 고려 중기의 신륵사 다층 전탑ㆍ경천사 10층 석탑, 조선의 원각사터 10층 석탑이 대표적이다. 어제(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사단법인 한국불교사진협회(이사장 최금란)는 경복궁 옆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불탑을 주제로 한 제28회 회원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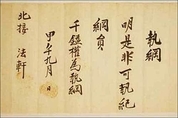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올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1895년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로 썩은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입니다. 한국이 번영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을 놓았으며, 유사한 외국의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근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 관아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민ㆍ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지요. 이는 19세기 당시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었던 신선한 민주주의 실험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값어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지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함께 〈4.19혁명기록물〉도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렸습니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임사절명시(臨死絶命詩) - 성삼문(成三問) 擊鼓催人命(격고최인명) 북을 울리며 사람의 목숨 재촉하는데 回頭日欲斜(회두일욕사) 머리를 돌리니 해가 지려고 한다 黃泉無一店(황천무일점) 황천길에는 주막 하나 없다는데 今夜宿誰家(금야숙수가) 오늘밤은 누구 집에서 잘까? 이 한시는 세조(世祖)의 회유에 응하지 않아 능지처형(凌遲處刑, 죄인의 뼈와 살을 발라내어 죽이는 형벌)을 당한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이 죽음에 임하여 목숨이 끊어지기 전 형장(刑場)에서 지은 시다. 둥둥 북을 울리며 망나니가 사람의 목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승에서의 마지막임으로 하직하려고 머리를 들어 산천을 돌아다보니, 해도 자신과 같이 서산으로 지려고 한다. 저승 가는 길에는 주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밤은 누구 집에서 자고 갈까를 성삼문은 걱정한다.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경국대전》에 명시되었는데 회초리로 가볍게 때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성삼문 같은 중죄인에게는 능지처형까지 처했다. 그런데 참 특이한 형벌로 ‘팽형(烹刑)’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탐관오리를 벌주는 것인데 곧 끓는 가마솥 속에 죄인을 넣어 삶는 공개처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