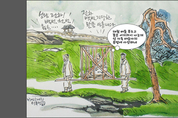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투구행(鬪狗行) - 권필 誰投與狗骨(수투여구골) 누가 개에게 뼈다귀 던져 주었나? 群狗鬪方狠(군구투방한) 뭇 개들 사납게 싸우는구나 小者必死大者傷(소자필사대자상) 작은 놈은 반드시 죽고 큰 놈은 다치니 有盜窺窬欲乘釁(유도규유욕승흔) 도둑놈이 엿보다 그 틈을 타려 하네 主人抱膝中夜泣(주인포슬중야읍) 주인은 무릎 껴안고 한밤에 우는데 天雨墻壞百憂集(천우장괴백우집) 비 내려 담장 무너져 온갖 근심 모인다 위 시는 석주 권필의 ‘투구행(鬪狗行)’이란 시다. 우의적(寓意的) 방법을 써서 당쟁(黨爭)을 일삼는 당시 정치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뼈다귀를 던져 주자 뭇 개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무섭게 싸운다. 이때 작은놈은 죽고 큰놈은 다친다. 도둑놈은 그 틈을 엿본다. 그 틈에 나라의 방비는 무너진다. 여기서 큰개는 당시 당파싸움을 하던 대북(大北), 작은개는 소북(小北), 틈을 엿보는 도둑놈은 왜구를 가리킨다. 석주(石洲) 권필(權韠, 1569~1612)은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 싫어하여 벼슬하지 않은 채 야인으로 일생을 마쳤다. 임진왜란 때에는 강경한 주전론을 주장했다. 광해군초에 권세를 가진 이이첨(李爾瞻)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까치설날 밤엔 - 윤갑수 어릴 적 까치설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지 엄니가 사주신 새 신발을 마루에 올려놓고 누가 가지고 갈까 잠을 설치던 추억 바람에 문풍지 우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 어둠 깔린 문밖을 바라보다 밤을 새우던 설날에 아버지는 뒤척이는 날 깨우신다. 큰댁에 차례 지내려 동생 손잡고 소복이 쌓인 눈길을 걸어갈 때 질기고 질긴 기차표 통고무신이 눈 위에 도장을 꾹꾹 찍어놓고 기찻길을 만든다. 칙칙 폭폭 기차가 네일 위로 뿌연 연기를 내품으며 달려간다. 마음의 고향으로……. 조선시대에 신던 신은 백성이야 짚신이나 마로 삼은 미투리(麻鞋)를 신었지만, 양반들이 신는 신으로는 목이 긴 ‘화(靴)’와 목이 짧은 ‘이(履)’가 있었다. 그런데 화보다 더 많이 신었던 ‘이(履)’에는 가죽으로 만든 갓신으로 태사혜와 흑피혜, 당혜와 운혜가 있다. 태사혜(太史鞋)는 양반 남성들이 평상시에 신었던 것이며, 흑피혜(黑皮鞋, 흑혜)는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나아갈 때 신던 신이다. 또 당혜는 당초(唐草) 무늬가 놓인 것으로 양반집의 부녀자들이 신었고, 온혜(溫鞋)라고도 하는 운혜(雲鞋)는 신 앞뒤에 구름무늬가 놓여진 것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나무 1 - 지리산에서 - 신 경 림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제 치레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 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훼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한국 전통집들은 백성집으로부터 궁궐에까지 모두 나무집 곧 목조건축이다. 우리 전통 목조건축의 기둥은 ‘원통기둥’,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의 3가지 모양이 있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고 최순우 선생은 ‘배흘림기둥’ 사무치는 고마움을 얘기할 만큼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여기서 ‘원통기둥’은 기둥머리ㆍ기둥몸ㆍ기둥뿌리의 지름이 모두 같은 기둥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소한에서 대한으로 가는 길목 - 하영순 일 년 24절기 중 동지 지나 소한에서 대한으로 가는 길목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 비라도 쏟아 졌으면 겨울 가음이라도 해갈하련만 날씨만 우중충하다 수은주는 내려가고 서민의 고뇌는 높아만 간다. 냉기류는 정가나 재계나 풀릴 기미가 없다 뭐가 그리도 원한이 많아 칼을 가는지 얼어붙은 이 땅에 봄은 언제 오려는지 꽁꽁 언 얼음장 밑에도 물은 흘러만 간다. 소한에서 대한으로 가는 길목 어제는 24절기 가운데 스물셋째인 소한(小寒)으로 한겨울 추위 가운데 혹독하기로 소문난 날이었다. 그래서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든가 "소한 얼음 대한에 녹는다.", ‘소한 추위는 꿔다가도 한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라는 말처럼 소한 추위는 예부터 대단했다. 예전 사람들은 매서운 추위가 오면 땔감이나 옷이 변변치 않았기에 견디기 참 어려웠고 동사(凍死) 곧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쯤이면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 아침에 세수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당기면 손에 문고리가 짝 달라붙어 손이 찢어지는 듯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뿐만 아니다. 저녁에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얼굴을 감추고 싶다 - 허홍구 철없고 겁 없던 시절 모자라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마구 쏟아 놓은 말과 글 여물지 못한 저 쭉정이와 가볍게 휩쓸리는 껍데기 이제 지워 버릴 수도 없고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건방 떨던 못난 짓거리 아직도 이리저리 흩어져 죽지도 않고 돌아다닌다. 어이쿠, 부끄러워라 부끄러운 흔적 어찌 지울까요 하느님, 부처님, 독자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로 시작되는 유명한 시 <사슴>의 시인 노천명은 인터넷에 ‘193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가’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어 있다. 노천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전쟁 참여를 권유하는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출정하는 동생에게’, ‘병정’ 등을 발표하고,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산하 부인대(婦人隊) 간사를 맡을 정도로 친일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천명에게는 웃지 못할 일화가 따라다닌다. 그것은 광복 직전인 1945년 2월 25일 펴낸 시집 《창변(窓邊)》에 관한 이야기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은진미륵불 - 한하운 비원에 우는 사람들이 진정소발(眞情所發)을 천년 세월에 걸쳐 열도(熱禱)하였건만 미륵불은 도시 무뚝뚝 청안(靑眼)으로 세월도 세상도 운명도 그렇게만 아득히 눈짓하여 생각하여도 생각하여도 아 그 마음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불구한 기립(起立) 스핑크스로 세월도 세상도 운명도 집착을 영영 끊고 영원히 불토(佛土)를 그렇게만 지키는 것인가. 오늘은 성탄절 전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세상에 오시는 크리스마스이브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 사상도 있다. 서양에 구세주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겐 미륵신앙이 있었다.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사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과 말세인 세상을 구하러 미륵이 오시기를 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독교 신앙의 천국에 가는 것과 구세주를 맞이하는 것에 견줄 수 있다. 특히 미륵사상이 있었던 우리나라 바닷가에는 미륵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매향의식(埋香儀式)이 있었고, 그 표식인 매향비(埋香碑)가 곳곳에 서 있다. 그 매향비들은 1309년(충선왕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동짓날 아침 - 최홍윤 날이면 날마다 새날이지만 내일부터는 진정 새날이겠다. 실은, 절기로 치면 동지 지나 낮 시간이 길어지는 첫날 바로 내일이 새해 첫날이 아닐까 싶다. 다음 주면 2022년 마지막 절기 동지가 있다. ‘동지(冬至)’는 24절기의 스물두째이며 명절로 지내기도 했던 날이다. 이날 가장 흔한 풍속으로는 팥죽을 쑤어 먹는 일이다. 그런데 동지가 동짓달 초승 곧 음력 초하루부터 열흘까지 사이에 들면 ‘애동지(애기동지)’라 하여 팥죽 대신 시루떡을 해 먹기도 하는데 요즈음은 이에 상관없이 팥죽을 쑤어 먹는다. 올해는 동지가 음력 11월 하순 곧 29일에 들어 노동지(老冬至)라 한다. 동지를 새해로 여기던 유풍 때문에 동지가 늦게 들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도 나이를 늦게 먹게 되니 그해가 노인들에게 좋다는 속설이 있다. 동지(冬至)라는 말은 드디어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해가 적도 아래 23.5°의 동지선 (남회귀선)과 황경 270°에 이르는 때며, 절기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옛사람들은 차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다가 동짓날에 이른 다음 차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날을 해가 죽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그 겨울의 시 - 박노해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해야 어서 떠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눈산의 새끼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우리 겨레는 더불어 사는 일에 익숙했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예부터 가난한 사람이 양식이 떨어지면 새벽에 부잣집 문앞을 말끔히 쓸었다. 그러면 그 집 안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보고 하인에게 “뉘 집 빗질 자국인가?”하고 물었다. 그런 다음 말없이 양식으로 쓸 쌀이나 보리를 하인을 시켜서 전해줬다는 얘기가 전한다. 그런가 하면 보릿고개에 양식이 떨어진 집의 아낙들은 산나물을 뜯어다가 잘 사는 집의 마당에 무작정 부려놓는다. 그러면 그 부잣집 안주인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곡식이나 소금ㆍ된장 따위를 이들에게 주었다. 물론 부잣집에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여 우 비 - 한준ㆍ박세준 별안간 맘이 왜 이럴까 아무 예고도 없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사랑을 가득 품은 그대 여우비가 내려요 난 아직 준비 안 됐지만 그댈 향한 이 맘 사랑인 것 같아요 혹 착각이 아닌지 또 내게 물어봐도 내 맘은 말하죠 이미 그댈 사랑을 한다고 난 벌써 시작해버렸죠 그댈 향한 이 맘 놓을 수가 없네요 난 착각이라 해도 난 이어 가볼래요 그댄 아니래도 이미 나는 사랑하고 있죠 활짝 갠 날, 갑자기 비가 잠깐 쏟아진다. 그렇게 내리는 비를 우리는 ‘여우비’라 한다. 옛이야기에 여우를 사랑한 구름이 여우가 시집가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을 ‘여우비’라고 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비구름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대기 높은 곳에서 강한 돌풍이 몰아쳐 그 탓에 맑은 곳까지 비가 온다고 얘기한다. 비를 표현하는 우리말 이름이 참 많다. 봄에는 ‘가랑비’, ‘보슬비’, ‘이슬비’, ‘모종비’, 모낼 무렵 한목에 오는 ‘목비’도 있다. 또 여름에 비가 내리면 일을 못 하고 잠을 잔다고 하여 ‘잠비’, 여름철 세차게 내리는 ‘달구비’, ‘무더기비’(폭우, 집중호우), ‘자드락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첫눈 오는 날 만나자 - 정호승 팔짱을 끼고 더러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가난한 아저씨가 연탄 화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목장갑 낀 손으로 구워 놓은 군밤을 더러 사 먹기도 하면서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눈길을 걸어가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첫눈을 기다린다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첫눈 같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직도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첫눈은 내린다 (‘첫눈 오는 날’ 일부) 지난 11월 22일은 첫눈이 온다는 소설이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小雪)’을 맞아, 우리떡과 민속놀이 전통나눔으로 양산시민들과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소설’을 맞아 낮 11시부터 우리떡을 나누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따뜻한 첫눈이 내리는 날, 소설(小雪)' 행사를 연 것이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전통떡(4종) 시식과 박물관 소장 민속문화재를 딴 미니 에코백(4종) 꾸미기 체험, 민속놀이인 윷놀이ㆍ투호ㆍ활쏘기ㆍ제기차기ㆍ팽이치기 체험 등을 했다고 한다. 소설 무렵은 한겨울에 든 것은 아니고 아직 따뜻한 햇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