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엿새 뒤에는 우리 겨레의 큰 명절 한가위입니다. 한가위는 음력 팔월 보름날로 추석, 가배절, 중추절, 가위, 가윗날 등으로 부릅니다. '한가위'라는 말은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지요. 또 '가위'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베짜기)인 '가배'에서 유래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라 유리왕 9년에 국내 6부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두 왕녀에게 그들을 이끌어 음력 열엿새 날인 7월 기망(旣望, 음력 16일)부터 길쌈을 해서 8월 보름까지 짜게 하였다. 그리고 짠 베의 품질과 양을 가늠하여 승부를 결정하고,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긴 편을 대접하게 하였다. 이날 달 밝은 밤에 임금과 백관 대신을 비롯해 수십만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녀와 부녀자들이 밤새도록 ‘강강술래’와 ‘회소곡(會蘇曲)’을 부르고, 춤을 추며 질탕하고 흥겹게 놀았다.“ 이 길쌈짜기를 그때 말로 ”가배“라 했는데 가배가 변해서 ”가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쓰는 ‘추석’이라는 말은 ‘예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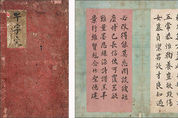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其四(기사) 士本四民之一也(사본사민지일야) 사(士)도 본래 사민 가운데 하나일 뿐 初非貴賤相懸者(초비귀천상현자) 처음부터 귀천이 서로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네 眼無丁字有虗名(안무정자유허명)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헛된 이름의 선비 있어 眞賈農工役於假(진가농공역어가) 참된 농공상(農工商)이 가짜에 부림을 받네 이 시는 조선 후기 시ㆍ서ㆍ화 삼절(三絶)로 일컬어진 문신ㆍ화가이며, 서예가인 자하(紫霞) 신위(申緯)가 1820년 나이 52살에 춘천부사(春川府使)에서 물러나 경기도 시흥의 자하산장(紫霞山莊)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을 노래한 것 가운데 한 수다. 신위는 초계문신으로 발탁될 만큼 촉망받았다. 초계문신은 37살 이하의 당하관(정3품 아래의 벼슬아치) 가운데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뽑아 규장각에 위탁 교육하고, 40살이 되면 졸업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던 제도다. 신위는 1815년 곡산부사로 나갔을 때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확인하고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정에 세금을 탕감해달라는 탄원을 하였으며, 1818년에 춘천부사로 나갔을 때는 그 지방 토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맞서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지난 8월 18일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 구산동 고인돌(경상남도기념물) 상석의 주변부에서 문화층 일부(20cm 가량)가 떨어져 나간 것이 확인되었으며, 정비사업터 내 저수조ㆍ관로시설ㆍ경계벽 설치 터는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인돌 군락지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하다가 발굴된 경상남도기념물 제820호 김해 구산동 고인돌은 상석(받침돌 위에 올려진 돌) 무게만 350톤에 이르며,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615m나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인돌은 김수로왕의 가락국 탄생 비밀이 담긴 유물이어서 더욱 종요로운 문화재였습니다. 그런 종요로운 유적은 2022년 7월 김해시가 토목업체를 동원해 구산동 고인돌 묘역의 정비ㆍ복원 작업을 벌이다 무덤의 대형 덮개돌인 상석(上石) 아랫부분의 박석을 비롯한 묘역 대부분을 갈아엎은 것으로 확인됐지요. 특히 이 정비ㆍ복원을 하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도 없었고, 고고학자 등 전문가의 입회도 없었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젓갈에 관한 우리나라 첫 문헌 기록은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1145년에 완성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에 나옵니다. 신라 신문왕이 8년(683년)에 김흠운의 작은딸을 왕비로 맞을 때 비단, 쌀,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포 따위와 함께 해(醢) 곧 젓갈 135수레를 주었다고 되어있어 이때 이미 궁중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젓갈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늘 먹던 음식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고려 사람들의 젓갈 사랑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신라 때 궁중음식이었던 젓갈이 고려 때 백성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는데 이는 수입해왔던 소금을 고려 태조 때, 도염원(都鹽院)이란 기구를 설치해 나라에서 직접 소금을 만들어 판 소금 전매제 정책 덕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1236년)》에는 젓갈을 담그는 방법에 소금에만 절이는 ‘염해법(鹽醢法)’과 젓갈 재료에 소금과 누룩, 술을 혼합한 독특한 방법의 ‘어육장해법(魚肉醬醢法)’이 있었고, 젓갈과 절인 생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강 - 도종환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간다 가장 더러운 것들을 싸안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천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간 어느 기슭에 몰래 손을 씻는 사람들아 언제나 당신들보다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흐른다 중국 역사에서 성천자(聖天子)라 추앙받는 요(堯) 임금(BC2356~2255)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자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능력이 모자랐다. 요 임금은 허유(許由)라는 어진 은자(隱者)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를 찾아가 자신의 뒤를 이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권세와 명예에 욕심이 없었던 허유는 정중히 사양하고는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강물에 귀를 씻었다. 그때 마침 소를 끌고 물을 먹이려고 온 소부(巢夫)는 허유가 그런 사연으로 귀를 씻었다는 말을 듣고는 더러운 귀를 씻은 물을 자신의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그보다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물을 먹였다는 고사가 있다. 이를 ‘세이공청(洗耳恭聽)‘ 또는 ’영천세이(潁川洗耳)‘라고 한다. 귀가 더럽혀졌다고 씻은 허유나 그 귀를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조선시대 때 세자를 가르친 것은 나중에 임금을 만들기 위한 영재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자를 가르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었지요. 물론 태조 때에는 그저 ‘세자관속(世子官屬)’이라 하여 관리만 두었는데 세조 때 드디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을 설립하였습니다. 시강원 설립 목적은 유학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임금인 세자에게 임금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문적 지식과 도덕적 자질을 기르기 위함이었지요. 이때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관들은 모두 당대의 실력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세자의 사부는 물론 가장 고위직인 영의정과 좌, 우의정이 맡았지요. 하지만, 이들은 나랏일로 바빴기 때문에 실제로 세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빈객(賓客) 이하의 전임관료들이었는데 주로 문과 출신의 30~40대의 참상관(參上官, 정3품에서 종6품 관료)으로 당상관 승진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종실록》 13년 12월 26일 기록을 보면 “시강관 박세희(朴世熹)가 아뢰기를, ‘대신(大臣)을 대하는 데는 반드시 예모(禮貌)로써 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불소지신(不召之臣)>이 있으니, 그에게 배운 다음에 그를 신하로 삼는다.’ 하였는데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모레 화요일은 24절기의 열넷째인 처서(處暑)입니다.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불볕더위도 처분하고 가을을 재촉하는 건들바람이 부는 때지요. 이즈음 옛사람들의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큰 일은 ‘포쇄(曝曬)’라고 해서 뭔가를 바람이나 햇볕에 말렸습니다. 부인들은 여름 장마에 눅눅해진 옷을 말리고, 선비들은 책을 말렸는데 책을 말리는 방법은 우선 바람을 쐬고(거풍, 擧風), 아직 남은 땡볕으로 말리며(포쇄)하며, 그늘에 말리기도(음건, 陰乾) 합니다. 처서 무렵 우리에게 익숙한 꽃은 한해살이풀 코스모스인데 토박이말로는 ‘살사리꽃’이라 부르지요.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로 1910년 무렵 건너왔다고 하며,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하늘거리는 모양이 참 아름답게 보여 ‘살사리꽃’이라고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아름다운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코스모스의 잘못된 이름” 또는 “코스모스의 비표준어”라고 나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때쯤 생각나는 토박이말 가운데는 ‘가을부채’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여름을 나지만, 옛사람들은 부채로 여름을 견뎠지요. 그런데 그 부채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기 도 - 김현숙 가을에는 한 알의 여문 알곡과 단 과육에서 천지가 고루 익혀낸 빛과 향기를 맛보게 하옵소서 여름날, 밖으로 범람하던 생각도 안으로 깊이 여울지는 맑고 고요한 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차례 바람이 불면 세상을 채우던 열매들을 다 내어주고 더 멀고 외로운 길 떠나는 행자들의 가벼운 발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침묵으로 믿음이 되는 산과 비어있음으로 평온한 들판을 오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틀 뒤엔 24절기 ‘처서’가 있다.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만큼 “處暑”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더위를 처분한다.”라는 뜻이 되어 여름은 가고 본격적으로 가을 기운이 자리 잡는 때다. 불볕더위와 무더기비로 몸살을 앓던 올여름을 처분하는 계절인 것이다. 이때쯤 농촌에서는 땡볕에 고추 말리는 풍경이 수채화처럼 곱기도 하다. 또 옥수수 이삭 위를 날아다니는 빠알간 고추잠자리도 가을을 부르는 손짓으로 보이는 때다. 한가위 명절을 코앞에 둔 들녘, 노란 벼이삭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지난여름, 시련의 무더위를 용케도 견뎌내고 이제 튼실한 알곡을 선사할 시간이다. 어쩌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1894년 1월 봉건적 수취체제의 모순에 대항하여 고부 농민 봉기로부터 시작된 ‘동학혁명운동’은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동학난’이라고도 부릅니다. ‘동학혁명운동’은 조선 후기 농민항쟁을 통한 농민들의 각성과 성장을 바탕으로,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여 봉건제도의 모순과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반대한 대규모 반제ㆍ반봉건투쟁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전봉준ㆍ송두호 등 농민지도자 20여 명이 11월 초순 모여 방 가운데 백지를 펼치고 백지 가운데에 큰 사발을 엎어 놓고 사발을 중심으로 각자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고부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고, 서울로 올라가자”라는 글을 써넣었습니다. 이를 ‘사발통문’이라 하는데 이때 만든 사발통문은 고부의 이집강(관가의 일에 협조하는 마을 책임자)에게 돌렸지요. 그런데 이들은 왜 사발을 엎어놓고 둥글게 각자의 이름을 썼을까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름을 걸고 권력에 맞서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했고, 실패했을 때는 능지처참이 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발통문에 이름을 쓸 때는 주모자를 숨기면서 동시에 참여자 모두가 주모자가 되어 똑같이 책임을 나누어지겠다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내일은 복날의 마지막 말복(末伏)입니다. 복날은 원래 열흘 만에 오지만 이번에는 중복이 지난 20일 만에 와서 ‘월복(越伏)’이라고 하지요. 입추가 지났어도 아직 조금만 움직이면 땀으로 뒤범벅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 겨레는 이즈음 이열치열 뜨거운 탕으로 몸을 보호했습니다. 또 지나친 체열의 손실과 많은 땀을 흘린 탓에 체액과 나트륨 손실이 있어서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우리 겨레는 수박화채에다 소금을 뿌려 먹었으며, 복숭아에 소금을 쳐서 끓여 받친 즙으로 지은 밥인 ‘반도반(蟠桃飯)’을 먹었습니다. 또 여름엔 땀으로 몸 안의 질소가 많이 나오므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데 콩국수는 이에 좋은 음식입니다. 한편 여름철은 청량음료를 너무 많이 먹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장애가 심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식초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식초는 산성화 체질을 막아주며, 여름철 음식 변질에 따른 식중독도 미리 막아주고, 물갈이로 배탈 설사가 나지 않게 하거나 손쉽게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넣은 미역냉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이 밖에도 팥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