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말복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지만 11일의 날씨는 찌는듯하여 가로수의 녹음마저 더위에 지친 듯 꼼짝도 안하고, 관상대에 의하면 이날 최고기온은 33도나 되어 예전보다 약간 높은 편. 길가를 지나는 살수차의 포말도 한결 가을을 재촉하는 듯이 이글이글한 아스팔트 위를 적셔주고 있다.” 이는 동아일보 4293년(1960년) 8월 12일 치 기사 내용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고비로 치닫는다는 말복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입추와 말복 무렵이 되면 날씨가 좋아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벼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복 나락 크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고 하여 귀가 밝은 개는 벼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땡볕도 지나쳐서 아예 벼가 타들어가기에 농민들이 애가 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복날을 “서기제복(暑氣制伏)”이라 하여 “더위를 꺾는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 하여 더울 때 뜨거운 것을 먹었지요. 여름이 되면 사람 몸은 밖의 높은 기온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7월 말, (사)서도소리보존회와 광명시 공동주최로 제17회 <서도소리 경연대회>가 열렸다는 이야기, 서도소리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한 느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서도소리란 38이북 지역으로 서해바다에 인접해 있는 황해도와 평안도지방에서 불리는 소리를 가리키며 달리, 관서(關西)지방의 소리라고도 부른다는 이야기를 했다. <서도소리>의 범주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민요, 한시(漢詩)를 읊어 나가는 <관산융마>와 같은 시창(詩唱), 초한가, 영변가와 같은 좌창(坐唱), 씩씩하고 활달한 입창(立唱), <추풍감별곡>이나 <적벽가>와 같은 송서(誦書), <배뱅이굿>과 같은 창극조(唱劇調)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대회는 초중고 학생부와 신인, 일반, 명창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도소리의 올바른 전승과 확산이 목적이며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부터는 서도소리의 보존이나 전승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관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서도소리를 전승하고 보존해야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울산국악협회(회장 박진)가 주최했던 제21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 울산은 옛 신라시대 처용의 도시로 이와 관련한 문화제를 열고 있다는 이야기,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이야기, 이와 함께 국악경연대회도 도시의 전통문화를 구축하고 산업과 예술의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일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심사 총평에서 필자는 장단(長短)의 중요성과 연주 자세를 강조하였다. 또한 습관적으로 마이크에 의지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 울산대회가 더더욱 권위 있는 대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념공연을 할 때에 시민들을 초대하라는 주문, 일반부 경연 분야를 확대하라는 주문, 상의 훈격이나, 상금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주문, 시상식에는 울산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격려를 해주도록 협조하라는 주문 등을 하였다. 본 대회는 명품 대회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지난 7월 말,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토요일이었다. 당일의 날씨도 폭염의 기세는 보통이 아니었으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서도소리 경연대회>가 광명시 소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울산 국악협회(회장 박진)가 주최한 제21회 전국국악경연대회(이하 울산대회)관련 이야기로 이어간다. 울산(蔚山)시가 근대 한국의 산업을 이끈 공업도시이지만, 처용가무(處容歌舞)나 처용설화의 도시라는 이야기, 처용설화란 신라 헌강왕(憲康王)이 지금의 울산인 개운포(開雲浦)에 행차하였다가 처용을 만나게 되어 벼슬을 주고 예쁜 여자로 아내를 삼게 하였는데, 역신이 아내를 탐해도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으로 대하니 역신이 감복해 하며 도망을 했다는 이야기를했다. 또 울산에서는 해마다 <처용문화제>가 열리며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 울산의 또 다른 문화행사가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인데,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고 각 부문의 대상은 심사위원 전원의 채점으로 선정하며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벌였다는 이야기 등을 지난주에 하였다. 최근 문체부는 문화도시의 지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서 국내 어느 도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가 하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도시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충남지방의 무형문화재인 아래내포시조와 위내포시조를 소개하였다. 위내포시조의 보유자, 박선웅은 서산의 유병익 사범에게 배웠고, 서울의 박기옥에게 석암제 시조, 홍원기, 김경배에게 가곡과 가사까지 배웠다는 점, 그는 제2회 백제예술제 시조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굴지의 시조대회에서 심사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서산지방에서 윗내포제시조 강습회와 정가발표회 등을 열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 전승과정은 유환경-이종승-이문교-유병익-박선웅으로 이어지며, 이 창제는 창법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곡태(曲態, 음악의 표현 기법) 또한 유연하다는 점, 노랫말이 구수하게 변모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장단수가 경제에 비해 짧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옛 선비의 기개와 멋을 느끼게 되는 시조창이란 점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번 주에는 지난 7월 7~8일에 울산광역시 국악협회(회장 박진)가 주최한 제21회 전국국악경연대회(이하 울산대회) 관련 이야기를 한다. 울산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듣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근대 한국의 산업을 이끈 공업도시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공업특정지구로 결정되어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충남지방의 무형문화재인 아래내포시조와 위내포시조를 소개하며 서산지방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서산제시조>는 넓은 의미의 위내포제 시조에 속한다는 점, 박선웅(예명-인규)이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어 있다는 점, 시조인들은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지역의 시조를 안내포시조, 부여, 청양, 공주, 금산 지역을 외내포시조로 구분해 왔으나 이병기의 《가람문선》에는 위내포제, 아래내포제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서산제시조의 계보라든가 전승 현황 등이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는 박선웅 예능보유자가 서산제시조와 맺게 된 인연이라든가, 전승계보, 그리고 음악적 차이 등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한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 참고) 충청지방의 시조는 내포제시조라고 부른다. 내포제는 위내포제와 아래내포제로 구분되는데, 서산 지방의 시조가 위내포제 시조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서산지방의 시조를 달리 <서판제>, 혹은 <스판제>라고 불러왔다. 위내포시조의 예능보유자 박선웅이 부르는 시조가 바로 서판제시조인 것이다. 그는 충남 서산읍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소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충남 부여에서 열린 2018년도 시조강습회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 내포제 시조보존회는 7-80대가 주축이고 이론과 실기 강습회를 30년째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계기로 회원 전원의 발표무대도 가졌다는 점, 시조창은 유행가의 의미로 가곡(歌曲)을 축소한 노래이며, 정제된 형식이나 선율의 유장미, 표현의 절제미, 발성의 장중미 등, 음악적 분위기가 유사하다는 점, 그래서 지식인이나 선비계층에서 즐겨 불렸다는 점을 얘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 등 여러 형태로 다양해 졌고 지역의 특징을 살린 <경제>, <내포제>, <영제>, <완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다는 점, 충청지방의 내포제 시조창은 창법이나 말붙임, 부분적인 가락, 시김새, 표현법 등이 경제 시조와는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일전에 있었던 강습 개회식에서 동료와 함께 곡조를 즐기고, 시조시를 암기하며 악보읽기를 배우는 시조창 부르기 운동이 노인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주에는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다른 지방의 시조창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임종복의 <가야금병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병창이란 창자(唱者)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단가나 민요, 또는 판소리의 눈 대목 등을 부르는 연창의 형태라는 점, 성악은 선율악기의 반주로 음정이나 장단을 맞추기 용이하므로 가야금 반주는 음정, 선율, 연결, 강약, 흐름, 장단의 도움이 크다는 점, 장월중선류 가야금병창은 그 소리제가 점점 위축되어 왔으나 문화재 제도의 마련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종복을 위시한 전승자들이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 장월중선은 김채만-박동실로 이어지는 고제(古制)의 소리와 <유관순 열사가>와 같은 창작 판소리도 불렀던 명창이란 점, 큰 선생의 유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소리 공부에 진력하는 임종복의 모습이 진지하며 모범적이라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는 충남 부여에 자리 잡고 있는 <내포제시조보존회>가 주최한 2018년도 시조강습회 관련 이야기로 이어간다. 충청남도에는 시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내포제시조보존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시조회관에 모여 열심히 시조창을 부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경북 포항에서 오랜 기간 가야금병창 분야의 연주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임종복의 활동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가야금병창>이란 소리꾼이 가야금을 스스로 연주하면서 단가나 민요, 또는 판소리의 눈 대목 등을 부르는 연창의 형태라는 점, 임종복은 장월중선(張月中仙, 본명-순애)의 소리제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승의 유음을 가다듬기 위해 스승의 장녀인 정순임 명창에게 소리전반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애기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판개-장월중선-정순임으로 3대째 이어지는 집안을 판소리의 명가(名家)로 지정하였으며 장월중선은 1960년대 초부터 경주에 정착하여 판소리, 가야금산조와 병창, 아쟁산조, 민속춤 등, 다양한 장르를 전승시켜 왔다는 점, 경상북도는 장월중선의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경주시에서는 판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창극공연과 전국 국악경연대회, 학술행사 등을 매해 열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노래는 혼자 부를 때와 반주악기가 곁들여 질 때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선율악기의 반주가 있다면 음정을 가늠할 수 있고, 선율의 흐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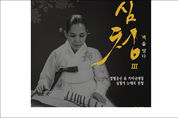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살풀이춤>으로 객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노혜경의 이야기를 하였다. 살풀이 춤이란 살풀이장단에 맞추어 수건을 들고 춘다고 해서 수건춤, 또는 즉흥무라는 이름이 있다는 점, 기(技)의 극치로 예(藝)에 이르는 춤으로 정중동의 신비스러움과 자유스러움, 환상적인 춤사위는 예술적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점, 원래는 살(煞)을 푼다는 의미로 시작되었고 이를 가다듬어 교방에서도 추었으나 현재는 무대화된 전통춤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도살풀이, 살풀이, 동살풀이와 같은 말들은 시나위권에서 불리는 살풀이를 두고 달리 부르는 이름이란 점, 100년 전 화보에 살푸리춤이라는 명칭 소개가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1930년대 후반, 한성준(韓成俊)이 <조선음악무용연구회> 이름으로 공연을 한 이후라는 점, <한국예인열전> 무대에서 노혜경은 이매방류 살풀이춤으로 객석의 열띤 호응을 받았는데,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마음이 고와야 춤이 고운 법”이라는 스승의 전언을 떠 올린다는 점, 그는 무용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흔치 않은 학구파 춤꾼이란 점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번 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