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추 분 - 정양 밤이 길어진다고 세월은 이 세상에 또 금을 긋는다 다시는 다시는 하면서 가슴에 금 그을수록 밤은 또 얼마나 길어지던가 다시는 다시는 하면서 금 그을수록 돌이킬 수 없는 밤이 길어서 잠은 이렇게 짧아지나 보다 어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秋分)이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추분을 중용(中庸)의 도를 생각하게 하는 날로 받아들인다.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해가 진 뒤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빛이 남아 있어서 낮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진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추분 이후부터 동지까지 양기보다는 음기가 점점 더 성해져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따뜻한 모닥불을 지펴나가야만 한다. 추분 무렵 고구마순은 물론 호박고지, 박고지, 깻잎도 거둔다. 또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벼를 거두고 그 밖에 잡다한 가을걷이도 한다. 이때 농촌을 가보면 붉은 고추, 노란 호박고지, 검은깨 등을 말리느라 색색이 아름답다. 또 추분이 지나면 날이 쌀쌀해지므로 예전엔 이불솜을 트기 위해 솜틀집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겨울나기 채비를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아직도 햇볕이 쨍 내리쬐는 한낮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여름의 끝자락에 명창 정광수를 기리는 <제2회 정광수 전국판소리경연대회(대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이 주최하고 (사)정광수제판소리보존회(이사장 정의진)가 주관하여 9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성황리에 열린 것이다. 과연 ‘정광수’는 어떤 분인가? 정광수(丁珖秀, 1909년 ∼ 2003년)는 철종ㆍ고종 때의 명창 정창업의 손자로, 15살 때 국창 김창환에게 ‘춘향가’를 공부하면서 소리에 입문했고, 28살 때 유성준 명창에게 ‘수궁가’와 ‘적벽가’를, 정응민 명창에게 ‘심청가’를, 이동백 명창에게 ‘적벽가’ 가운데 ‘삼고초려’ 대목을 공부했다. 한때 대동가극단에 참여해 임방울ㆍ이화중선ㆍ박초월 명창과 함께 활동했으며, 1939년 동일창극단에 참가하기도 했으나, 판소리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노력을 버리지 않았다. 8·15광복 뒤 광주에서 광주국악원을 창설하고 후진을 양성하다가, 1964년 유성준제 ‘수궁가’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74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해마다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가 열립니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조선 후기에 시작하여 전주 지역에서 펼쳐지는 전통 예술 잔치를 말하는데 전주부성의 통인들이 예인들을 초청해서 판소리를 들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영정조 시대에 체계화되었으며, 전국의 명창과 소리꾼들이 모여 겨루었지요. 1975년에 재현되어 판소리명창부, 농악부, 기악부, 무용부, 민요부 등 10개 분야 예인들의 기량이 펼쳐지고 있는데 권위 있는 경연대회로 손꼽힙니다. 며칠 전엔 우연히 텔레비전을 돌려보다가 이 전주대사습놀이가 재방송되는 반가운 장면을 보았지요. 그런데 기악부에서 결선에 오른 경연자가 백인영류 아쟁산조를 연주할 때 결선에 오른 연주자의 다짐이 자막으로 떴는데 “소리의 잘생김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젊은 연주자의 멋짐을 본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쓸데없이 ‘파이팅!’이란 문구 하나가 덧붙여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파이팅(fighting)”이란 말은 본래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출처가 모호한 가짜 영어입니다. ‘파이팅’은 호전적인 뜻으로 ‘싸우자’, '맞장 뜨자’라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해님의 의상 - 차홍렬 진종일 중노동을 한 해님이 귀가하면서 벗어놓은 의상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도회지 빌딩 숲에도 서울역사 지붕 위에도 걸어놨네 객지에서 가난을 짊어지고 떠도는 사람 명절에도 부모 형제 있는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 입고서 금의환향(錦衣還鄕)하라고 햇빛 가운데 가시광선은 여러 가지 빛깔로 되어 있지만, 모든 색의 빛이 거의 균일한 세기로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백색광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백색광 가운데서 비교적 파장이 짧은 푸른색 계열이, 파장이 긴 붉은색보다 산란이 더 잘 되는데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그러나 해가 지평선 부근에 있을 때는 햇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경로가 길어져서 산란이 잘 되는 푸른빛은 도중에 없어지고 붉은빛만 남는다. 이 빛이 아래층의 구름 입자 때문에 흩어지면서 구름이 붉게 보이는 현상을 ‘노을’이라고 한다. 온 나라에는 전라남도 영광의 노을전시관, 충청남도 아산의 선장포노을공원, 충청남도 태안의 노을지는갯마을, 충청남도 보령의 노을광장, 경상남도 통영의 평인 노을길 등 환상적인 노을을 볼 수 있는 명소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나 여기 치홍렬 시인은 그의 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아래위를 눌러 납작해진 공 모양의 몸통에 좁은 목과 넓게 되바라진 아가리를 가진 ‘사슴장식 구멍단지’가 있습니다. 어깨 쪽에는 짧고 통통한 몸통에 짧은 다리 네 개와 작은 머리를 붙인 사슴 두 마리가 붙어 있지요. 머리에는 아주 큰 뿔을 달았는데 왼쪽 사슴의 뿔은 온전하나 오른쪽 사슴의 뿔은 하나가 떨어져 아쉬움을 줍니다. 그런데 왜 5세기 가야시대에 빚은 이 단지에는 사슴이 붙어 있을까요? 사슴은 북방 아시아 여러 민족이 신성시한 동물로서 신앙 대상이었습니다. 또 사슴은 인류의 중요한 식량 자원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북 제천 점말동굴에서 사슴 머리뼈가 발굴되어 구석기시대부터 사슴 사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요. 잘 알려진 국보 285호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들 가운데 사슴 그림은 36점으로 약 15%나 차지합니다. 인물이나 동물 그리고 특정한 물건을 본떠 만든 토기를 상형토기(象形土器)라고 하는데 사슴 역시 상형토기의 주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소가야에서 만든 이 사슴 장식 구멍단지도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자 권위의 상징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誰斷崑山玉 그 누가 곤륜산의 옥을 잘라서 裁成織女梳 직녀의 얼레빗을 만들어주었던고 牽牛離別後 견우님 떠나신 뒤에 오지를 않아 愁擲壁空虛 수심이 깊어 푸른 하늘에 걸어 놓았네 황진이가 지은 영반월(詠半月, 반달을 노래함)이란 한시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황진이는 하늘에 걸린 반달을 보고 직녀가 견우를 기다리다 지쳐 얼레빗을 하늘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다림이 사무치던지 얼레빗을 하늘에 걸어 견우에게 손짓합니다. 그런가 하면 황진이, 신사임당과 더불어 조선 3대 여류 시인으로 꼽히는 강정일당(姜靜一堂)도 가을을 노래합니다. “어느덧 나무마다 가을빛인데(萬木迎秋氣) / 석양에 어지러운 매미 소리들(蟬聲亂夕陽) / 제철이 다 하는 게 슬퍼서인가(沈吟感物性) / 쓸쓸한 숲속을 혼자 헤맸네(林下獨彷徨)“ 이 한시는 강정일당의 <청추선(聽秋蟬, 가을매미 소리)>입니다. 황진이는 임을 기다리기나 하지만, 강정일당은 그저 쓸쓸한 숲속을 혼자 헤맵니다. 기다려야 할 임도 없는 처지인가 봅니다. 강정일당에 견주면 황진이는 기다릴 임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귀뚜라미가 애간장을 끊으러 왔다는 가을! 차라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알 밤 - 유가형 공기가 꼬들꼬들 마르니 고추잠자리 군무에 가을하늘 노을이 빨갛게 군불 지핀다. 고슴도치들이 밤나무에 주저리 주저리 떨어질듯 무겁게 붙어있고 지금 고슴도치의 해산 준비로 분주하다 하얗게 자궁문이 열리나 보다 호동그렇게 놀란 감나무 수백 개의 등불이 일제히 켜졌다 임박한가 보다 외마디 소리에 나는 눈을 짝 감았다 툭! 툭! 일란성 세쌍둥이다! 바닥에 검붉은 가을빛이 쏟아진다 저 해산의 황홀함이라니... “어디선가 밤꽃 향기가 물씬 난다. / 강렬한 생명의 냄새 / 나도 모르게 불쑥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한 시인은 밤꽃의 향기를 이렇게 노래한다. 6월이 되면 벌들을 유혹하는 밤꽃의 향기가 물씬 나고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란다. 그런데 그 향기에 견주면 그 열매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범할 수 없다. 밤송이는 날카로운 가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과실이 오히려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동물들을 유혹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다른 과실들은 그 안에 씨앗을 품고 있어서 동물들이 먹고 뱉은 씨앗이 자신의 또 다른 과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은 달콤한 향기도 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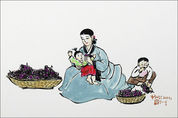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꼬리가 긴 남은 더위도 차츰 물러가고 산양에는 제법 추색(秋色, 가을빛)이 깃들고 높아진 하늘은 한없이 푸르기만 하다. 농가 초가집 지붕 위에는 빨간 고추가 군데군데 널려 있어 추색을 더욱 짙게 해주고 있는가 하면 볏논에서는 어느새 ‘훠이 훠이’ 새를 날리는 소리가 한창이다.” 위는 “秋色은 「고추」빛과 더불어 「白露」를 맞으니 殘暑도 멀어가”란 제목의 동아일보 1959년 9월 8일 치 기사 일부입니다. 오늘은 24절기의 열다섯째 <백로(白露)>인데 백로 즈음의 풍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로는 “흰이슬”이란 뜻으로 이때쯤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힌다는 뜻이지요. 백로부터는 그야말로 가을 기운이 물씬 묻어나는 때입니다. 이때쯤 보내는 옛 편지 첫머리를 보면 “포도순절(葡萄旬節)에 기체만강하시고…….” 하는 구절을 잘 썼는데, 포도가 익어 수확하는 백로에서 한가위까지를 <포도순절>이라 하지요. 또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때 <포도지정(葡萄之情)>을 잊었다고 하는데 이 “포도의 정”이란 어릴 때 어머니가 포도를 한 알, 한 알 입에 넣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고려말-조선초의 학자 목은 이색이 쓴 《목은고(牧隱藁)》에는 이웃 사람들의 윷놀이를 구경하면서 쓴 시가 나옵니다. 이 윷놀이를 할 때 던져서 나온 윷가락의 이름은 하나를 도, 둘을 개, 셋을 걸, 넷을 윷, 다섯을 모라 부르는데, 이 도ㆍ개ㆍ걸ㆍ윷ㆍ모는 원래가 가축의 이름을 딴 것으로 봅니다. 곧 도는 돼지[豚]를, 개는 개[犬]를, 걸은 양(羊)을, 윷은 소[牛]를, 모는 말[馬]을 가리킵니다. 먼저 도는 원말이 ‘돝’으로 어간(語幹) 일부의 탈락형인데 돝은 돼지의 옛말로 아직도 종돈(種豚)을 ‘씨돝’이라 부르고, 또 일부 노인들 사이에는 돼지고기를 ‘돝고기’라 부르지요. 개는 지금도 개[犬]이며, 걸은 지금 양(羊)이라 부르는 가축의 옛말입니다. 또 윷은 소[牛]로 소를 사투리로는 “슈ㆍ슛ㆍ슝·ㆍ중ㆍ쇼”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슛”이 윳으로 변하였다가 윷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는 말[馬]인데 사투리에 몰ㆍ모ㆍ메라는 말이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들 가축은 옛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이었는데 그 가축의 이름과 함께 몸의 크기를 윷놀이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몸 크기의 차이를 보면 개보다는 양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사동 코트 갤러리 3층에서는 한글 전시 <➗:나눔과 나뉨>이 열렸다. 23명의 여성 청년 작가들(대표 문지예ㆍ이지은)은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하며, 청년들의 생각을 알리고 동시에 사라져가는 글자 4자를 재조명하기 위해 인사동에 모였다. 사실 그동안 한글운동은 말이나 글자 자체에는 소홀히 하고 그저 한글 자체에만 몰두했다. 그러니 절름발이 운동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종이 뜻한 진정한 운동이 되려면 한글에 앞서서 토박이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세종이 창안한 훈민정음 전체 28글자의 아름다움을 알려내야 한다고 말이다. 전시의 이름은 <➗:나눔과 나뉨>이다. 이들은 이렇게 전시 이름을 지은 까닭을 “나누기는 긍정의 뜻인 나눔과 부정의 뜻인 나뉨의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다. 저희는 다양한 까닭으로 점점 더 나뉘는 세상에서 나눔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나눔과 나뉨>으로 이름을 지었다. 더하여 나누기의 형태는 기하학적이어서 땅ㆍ하늘ㆍ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글의 천지인 사상과 닮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한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