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의 열다섯째 절기인 ‘백로(白露’)입니다. 이때쯤이면 밤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지요. 원래 이 무렵은 맑은 날이 계속되고, 기온도 적당해서 오곡백과가 여무는데 더없이 좋은 때지요.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내리쬐는 하루 땡볕에 쌀이 12만 섬(1998년 기준)이나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을장마 탓으로 농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때 편지 첫머리에 `포도순절(葡萄旬節)에 기체만강하시고...' 하는 구절을 잘 썼는데, 백로에서 추석까지 시절을 포도순절이라 했지요. 그 해 첫 포도를 따면 사당에 먼저 고한 다음 그 집 맏며느리가 한 송이를 통째로 먹어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달린 포도알은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의미이고, 조선백자에 포도 무늬가 많은 것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처녀가 포도를 먹고 있으면 망측하다고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지요.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때 ‘포도지정(葡萄之情)’을 잊었다고 개탄을 합니다. ‘포도의 정’이란 어릴 때 어머니가 포도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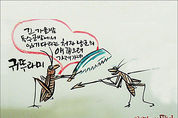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의 14번째인 처서(處暑)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여 처서라 부르는데 낱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더위를 처분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서 때는 여름 동안 습기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아직 남아있는 따가운 햇볕에 말리는 ‘포쇄(曝:쬘 폭ㆍ포, :쬘 쇄)’를 합니다. 또 극성을 부리던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해충들의 성화도 줄어듭니다. “처서에 창을 든 모기와 톱을 든 귀뚜라미가 오다가다 길에서 만났다. 모기의 입이 귀밑까지 찢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귀뚜라미가 그 사연을 묻는다. ‘미친놈, 미친년 날 잡는답시고 제가 제 허벅지 제 볼때기 치는 걸 보고 너무 우스워서 입이 이렇게 찢어졌다네.’라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모기는 귀뚜라미에게 자네는 뭐에 쓰려고 톱을 가져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귀뚜라미는 ‘긴긴 가을밤 독수공방에서 임 기다리는 처자낭군의 애(창자)를 끊으려 가져가네.’라고 말한다.” 남도지방에서 처서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단장(斷腸), 곧 애를 끊는 톱 소리로 듣는다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복날의 마지막 말복(末伏)입니다. 올해는 초복과 중복이 열흘 만에 온 것과 달리 중복과 말복은 스무날(20일) 차이인데 이를 우리는 월복(越伏)이라고 합니다. 1614년 이수광이 펴낸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책 《지봉유설(芝峰類說)》에 보면 복날을 '양기에 눌려 음기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날'이라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음양오행’에 따르면 여름철은 '화(火)'의 기운, 가을철은 '금(金)'의 기운인데 가을의 '금‘ 기운이 땅으로 나오려다가 아직 '화'의 기운이 강렬하므로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엎드릴 '복(伏)'자를 써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지요. 또 최남선이 쓴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복날을 '서기제복(暑氣制伏)'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서기제복에서 ‘복(伏)’은 꺾는다는 뜻으로, 복날은 더위를 꺾는 날 곧, 더위를 피하는 피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입추와 말복 무렵이 되면 날씨가 좋아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 많아서 벼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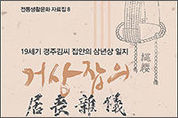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관내 소장품 《거상잡의(居喪雜儀)》를 뒤쳐(번역) 상세한 주석을 붙인 전통생활문화자료집 제8호 《19세기 경주김씨 집안의 삼년상 일지-거상잡의(居喪雜儀)》(최순권 역주)를 펴낸다. 이 책은 관내 소장자료 연구의 결과를 담은 성과물로 국립민속박물관은 이 같은 우리관 소장자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예법은 엄격하게 지켜졌을까? 원칙과 현실 사이의 고민, 《거상잡의》 《거상잡의》는 상중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례를 빠짐없이 기록한 일지로, 조선 후기에 실제 상을 당한 사람이 어떠한 의례를 행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다만, 불행하게도 저자와 작성 연대 등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1년 동안 조사, 연구를 통해 저자가 경주김씨 계림군파 김준영(金準永, 1817~?)이고, 아울러 김준영이 한양 집과 화성의 묘소를 오가며 그의 아버지 김규응(金奎應, 1779~1846)이 죽은 1846년(헌종 12) 9월 12일부터 1848년 11월 5일까지, 그의 어머니 한산이씨가 죽은 1859년(철종 10) 1월 21일부터 1861년 4월 5일까지 삼년상에서 실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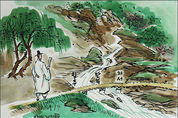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열셋째 입추(立秋)다. 입추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인데 이날부터 입동(立冬)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한다. 《고려사》 권84 「지(志)」38에 “입추에는 관리에게 하루 휴가를 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입추는 곡식이 여무는 시기여서 이날 날씨를 보고 점친다. 입추에 하늘이 맑으면 만곡(萬穀)이 풍년이라고 여기고, 이날 비가 조금만 내리면 길하고 많이 내리면 벼가 상한다고 여겼다. 또한 천둥이 치면 벼의 수확량이 적고 지진이 있으면 다음 해 봄에 소와 염소가 죽는다고 점쳤다. 다만, 가을이 들어서는 때라는 입추가 왔어도 이후 말복이 들어 있어 더위는 아직 그대로인데 입추가 지난 뒤의 더위를 남은 더위란 뜻의 잔서(殘暑)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위를 처분한다는 처서에도 더위가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왜 입추를 말복 전에 오게 했을까? 주역에서 보면 남자라고 해서 양기만을, 여자라고 해서 음기만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조금씩 중첩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계절도 마찬가지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우리 겨레가 즐겼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두(流頭 : 음력 6월 15일)입니다. 유두는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의 준말인데 신라 때부터 있었던 풍속이며, 가장 원기가 왕성한 곳인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날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액을 쫓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유두를 신라 때 이두로 '소두'(머리 빗다), '수두'라고도 썼다고 합니다. 수두란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옛말)로 '물맞이'라는 뜻인데 요즘도 신라의 옛 땅인 경상도에서는 유두를 '물맞이'라고 부른다지요. 유두의 대표적인 풍속은 유두천신(流頭薦新)입니다. 이는 유두날 아침 유두면, 상화떡, 연병, 수단 등의 음식과, 피, 조, 벼, 콩 따위의 여러 가지 곡식을 참외나 오이, 수박 등과 함께 사당에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지요. 옛날에는 새 과일이 나도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돌아가신 조상에게 올린 다음에 먹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참외나 기다란 생선 따위로 음식을 장만하여 논의 물꼬와 밭 가운데에 차려놓고 농사신에게 풍년을 비는 고사를 지내며, 자기의 논밭 하나, 하나마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지상엔 온통 더위 천지 광한전(달나라에 있다는 궁전) 월궁으로 달아날 재주 없으니 설악산 폭포 생각나고 풍혈 있는 빙산이 그리워라” 이는 조선 전기 문신 서거정이 시문을 모아 펴낸 《동문선(東文選)》이란 책에 나오는 시입니다. 온통 더위 천지에 설악산 폭포와 풍혈(늘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나오는 바위틈)이 있는 빙산이 그립다고 노래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절정에 올라 어제는 중복(中伏)이었고, 오늘은 24절기의 열두째 대서(大暑)입니다. 이때는 무더위가 가장 심해서 "더위로 염소뿔이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지요. 그런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한여름 지금보다 훨씬 더 무더위와 힘겹게 싸웠습니다. 함부로 의관을 벗어던질 수 없는 법도가 있었으니 겨우 냇가에 발을 담그는 탁족(濯足)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더위를 멀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대자리 위에서 솔바람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명 조식 같은 사람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리산에 올랐고, 추사 김정희는 한여름 북한산에 올라 북한산수순비 탁본을 해올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남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初伏)이다. 초복은 삼복의 첫날인데 하지 뒤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뒤 첫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이를 삼경일(三庚日) 또는 ‘삼복’이라 한다.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천간(天干)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12지지(地支)에서 하나씩 붙여 해(年)와 달(月) 그리고 날(日)을 말하는데 날에 경(庚)이 붙은 날을 경일(庚日)이라 한다. 올해를 보면 오늘 곧 2021년 7월 11일은 셋째 경일 곧 경신(庚申)으로 초복이며, 7월 21일 넷째 경일은 경오(庚午)로 중복, 입추 뒤 첫 경일 곧 8월 10일은 경인(庚寅)으로 말복이다. 복날은 열흘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처럼 해에 따라서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 되기도 하는 경우 이를 월복(越伏)이라고 한다. 삼복 기간은 한해 가운데 가장 더운 때로 이를 '삼복더위'라 하는데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 내라는 뜻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표(氷票)를 주어 관의 장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 가게 하였다. 복중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도롱이 접사리며 삿갓은 몇 벌인고 모찌기는 자네 하소 모심기는 내가 함세 들깨 모 담뱃 모는 머슴아이 맡아 내고 가지 모 고추 모는 아기 딸이 하려니와 맨드라미 봉선화는 내 사천 너무 마라 아기 어멈 방아 찧어 들 바라지 점심 하소 보리밥 찬국에 고추장 상추쌈을 식구들 헤아리되 넉넉히 능을 두소” 위는 조선 헌종 때 정학유(丁學游)가 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가운데 5월령 일부로 이 음력 오월 망종ㆍ하지 무렵 농촌 정경을 맛깔스럽게 묘사했습니다. “모찌기는 자네 하소 모심기는 내가 함세 / 들깨 모 담뱃 모는 머슴아이 맡아 내고”라며 모내기에 바쁜 모습을 그려내고, “보리밥 찬국에 고추장 상추쌈을 식구들 헤아리되 넉넉히 능을 두소”라며 맛있는 점심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오늘은 24절기의 열째 “하지”입니다. 이 무렵 해가 가장 북쪽에 있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夏至點)이라 합니다.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 14시간 35분이나 되지요. 한해 가운데 해가 가장 오래 떠 있어서 지구 북반구의 땅은 해의 열을 가장 많이 받아 이때부터 날이 몹시 더워집니다. 그런데 하지는 양기가 가장 성한 날입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명절 단오입니다. 단오는 단오절, 단옷날, 천중절(天中節), 포절(蒲節:창포의 날), 단양(端陽), 중오절(重午節, 重五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말로는 수릿날이라고 하지요. 단오의 '단(端)'자는 첫째를 뜻하고, '오(午)'는 다섯이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합니다. 수릿날은 조선 후기에 펴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이날 쑥떡을 해 먹는데, 쑥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란 이름이 붙었다고 했으며, 또 수리란 옛말에서 으뜸, 신(神)의 뜻으로 쓰여 '신의 날', '으뜸 날'이란 뜻에서 수릿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에 세 번 신의 옷인 빔(비음)을 입습니다. 설빔, 단오빔, 한가위빔이 바로 그것이지요. 단오빔을 ‘술의(戌衣)’라고 해석한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 할주(割註, 본문 바로 뒤에 두 줄로 잘게 단 주)에 따르면 술의란 신의(神衣), 곧 태양신을 상징한 신성한 옷입니다. 수릿날은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지요. 단옷날 쑥을 뜯어도 오시(午時)에 뜯어야 약효가 가장 좋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태양신[日神]을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