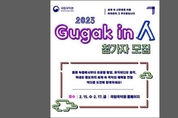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진경 문화평론가]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스키장에 다녀오게 되었다. 겨울에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이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에 도착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맞는 난이도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기초부터 시작하면 초급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어디로 가야 초급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슬로프를 타고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에서 내려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한다. 다른 스키장에 비해 규모가 제법 커서 스키장 안내소도 두 곳이나 있는 이곳의 난이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각 슬로프의 이름도 난이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우스는 신들의 신이니 가장 상급일 줄 알았지만, 난이도가 초급에 해당하였다. 벽에 붙은 난이도 안내지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슬로프 입구에서 확인하고 되돌아가야만 한다. 만약, 확인 못하고 슬로프를 타면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까지 올라갈 판이다. 지난해, 스키 강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스키를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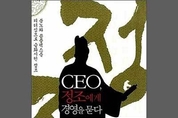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조선 국왕은 모두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였다. 그리고 정조는 썩 훌륭한 최고경영자(CEO)였다. 조선 임금들 가운데서도 나라를 잘 경영했다고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군주다. 물론 어느 임금이나 그렇듯 정조 치세도 명(明)과 암(暗)이 있지만, 그가 조금 더 살아서 조선을 지탱했더라면 조선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책, 《CEO, 정조에게 경영을 묻다》는 정조의 국가경영 방식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오늘날 경영자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주는 책이다. 경영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정조의 경영방식 가운데는 오늘날에도 취할 것들이 꽤 많다. 그의 경영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그는 기본적으로 적을 강하게 키워 적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상생경영을 펼쳤다. 조선시대 많은 당쟁의 역사에서 보듯 ‘나 살고 너 죽자’ 식으로 반대편의 씨를 말리는 그런 섬멸전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호적수’를 만났다 싶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크게 키워 견제세력으로 활용했다. 이는 어찌 보면 적이 강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자신의 의견에 순응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소나기 내리는 날 예쁜 여학생이 책을 가슴에 품고 비를 피해 도서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몸은 젖었고 마스카라는 번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때 초로의 교수가 묻습니다. "자네 괜찮나?" "네. 몸이 젖고 화장이 번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아니 자네 말고 자네 책 말일세…." 공자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구간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이때 하인이 들어와 말하지요. "큰일 났습니다. 마구간에 큰불이 났습니다." 그때 공자님은 묻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가?" 마구간의 불 소식을 듣고 말의 안부가 아니라 사람의 안부를 묻는 공자의 모습을 봅니다. 책의 안부를 묻는 교수와 대조적이지요.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린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지요. 옛날 종교가 중요한 잣대로 세상을 지배했을 때를 신본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물질 만능을 구가하는 시대를 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에 관한 것을 가장 중히 여기는 인본주의로의 회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는 이러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문화신문= 윤지영 기자] 계묘년 토끼해가 밝은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길고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소식을 알리는 입춘이 다가온다. 입춘인 2월 4일의 하루 전날인 2월 3일, 일본에서는 절분(세츠분, 節分)이라는 풍습이 있다. 절분은 한해에 일어날 나쁜 액운을 막고 행운과 행복을 비는 날로 일본인들은 절분날에 집 가까운 신사(神社)나 절을 찾아가서 액막이 기도회를 갖고 콩뿌리기(마메마키) 행사를 한다. “복은 들어오고 귀신은 물러가라 (후쿠와 우치, 오니와 소토 ‘福は內、鬼は外’)라고 하면서 콩을 뿌리고 볶은 콩을 자기 나이 수만큼 먹으면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감기도 안 걸리며 모든 악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다. 절분 행사는 예전에 궁중에서 했는데 《연희식(905년)》에 보면 색색으로 물들인 흙으로 빚은 토우동자(土牛童子)를 궁궐 안에 있는 사방의 문에 걸어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인형은 대한(大寒) 전날 밤에 만들어 입춘 전날 밤에 치웠다. 토우동자 풍습은 헤이안시대(794-1185)의 귀신을 물리치는 행사 츠이나(追儺)와 밀접한데 이는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로 내려오면 토우동자의 장식은 사라지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신성시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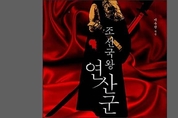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시인 연산군! 흔히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연산군에게, 시인이라는 표현은 좀 낯설다. 조선에서 글을 배운 선비라면 누구나 필수 교양으로 시를 짓곤 했지만, 임금은 좀 달랐다. 이성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군주에게 감성적인 시 짓기는 그다지 권장되는 덕목이 아니었다. 그래서 임금이 어제시(御製詩)를 지을 때마다 신하들은 삼갈 것을 권하곤 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달랐다. 그는 보위에 오른 뒤에도 80여 편에 달하는 어제시를 지을 만큼 시를 좋아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감상적이고 즉흥적이며 자기애가 충만한 것들이었으나, 때로는 피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살벌한 시도 있다. 연산군은 자신이 지은 시를 비서실 격인 승정원에 내리고, 승지들에게 답시를 지어 올리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 책, 《조선국왕 연산군》은 ‘88편의 시로 살피는 미친 사랑의 노래’라는 부제에 걸맞게 연산군이 남긴 88편의 시로 그의 내면에 흐르는 광기와 고독,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다. 소설과 해설을 절묘하게 섞어 쓰는 작가의 필력 덕분인지 재밌게 술술 읽힌다. 중간중간 들어가는 어제시가 연산군의 심리 상태와 광기를 잘 드러낸다. 연산군은 잘 알려진 것처럼 조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열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 좋은 사람입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주 : 나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할 수 있소 양양 : 당신은 처첩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작은 밭조차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면서 무 슨 말이요? 양주 : 아무리 어린 목동이라도 하더라도 양 치는 일은 임금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이요. 호미와 쟁기의 쓰임이 다르듯이 사람도 됨됨이에 따라 쓰임새가 다른 법이라오 쟁기만 옳고 호미는 그르다는 주장은 옳지 않소. 참으로 큰 인물은 노는 물과 하는 역할이 남달라야 하는 법이라오.”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오지요. 탄주지어 육처즉 불승루의 呑舟之魚 陸處則 不勝螻螘 "수레바퀴를 삼켜버릴 큰 짐승도 산에서 내려오면 그물에 걸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고 배를 삼킬만한 큰 물고기도 휩쓸려 물을 잃으면 개미에게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이는 익숙한 거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사람들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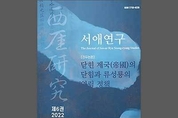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임진왜란의 최대 공신을 뽑으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신으로는 이순신 장군, 문신으로는 서애 류성룡을 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애는 당연히 1등 공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등 공신으로밖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말기에는 주화오국(主和誤國) 곧 왜란과 호란 당시 적국과의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누명을 쓰고 삭탈관직 되었습니다. 《서애연구》 6권에 실린 논문 <임란 극복의 주역, 류성룡 축출 과정과 그 배경>에서 류을하 박사가 이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저도 덕분에 서애 선생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과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벽하는 서애학회의 상임위원이기도 하지요. 군역에서 빠진 양반도 병역의무를 지게 해 서애는 전시(戰時) 재상으로 오로지 나라를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기존 인습이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제도를 유연하게 변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전시개병제를 도입하여 군역에서 빠진 양반이나 천민도 모두 병역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민들도 공을 세우면 면천(免賤)뿐만 아니라 벼슬까지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물작미법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윤동주 시인의 연구를 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오무라 마스오 교수님의 자료를 활용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터인데 그는 일본 내에서 윤동주 연구의 일인자로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오무라 교수님은 1985년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중국 조선족문학연구를 위해 1년간 연구 교수로 있을 때 윤동주(1917~1945) 시인의 무덤을 찾아낸 분이고,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尹東柱 自筆 詩稿 全集)》을 펴내는 등 윤동주 연구에 쏟은 시간과 정성은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있는 도다 이쿠코 씨가 펴낸 《동주의 시절》 책을 보내와 우편으로 자택에 보내드렸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던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오무라 교수님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이는 평생 윤동주 시인을 포함한 한국문학 연구에 일생을 바치고 지난 1월 15일, 세상을 뜬 일본 학자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89살) 와세다대 명예교수에 대한 야나기하라 야스코 씨의 말이다. 야나기하라 야스코(楊原泰子) 씨는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릿쿄 모임(詩人尹東柱を記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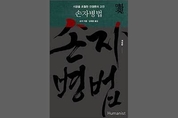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2,500여 년 전 손무와 손빈은 《손자병법》이란 책을 완성합니다. 그 글에는 ‘무소불비 무소불과(無所不備 無所不寡)’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부족한 곳이 없도록 하려 한다면 부족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모든 곳을 대비하면 모든 곳이 소홀해진다는 뜻입니다. 곧 한정된 군사를 모든 곳에 배치하면 각처마다 수가 적어져서 각개격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운용상의 효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나 군사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이 중요합니다. 적이 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소수의 군사로 대군을 이기려면 ‘무소불비 무소불과’를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지요. 어쩌면 한 사람이 가지는 일생의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는 삶은 누구에게도 오지 않는다." 세상엔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

[우리문화신문= 이윤옥 기자] 메이지시대 (1868~1912)부터 약 140년 동안 일본에서 성인의 연령은 20살로 민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1일부터 성인 연령이 20살에서 18살로 바뀌었다. 문제는 20살 때 치르는 ‘성인식’의 나이도 18살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1월 9일(월)은 일본의 성인 나이가 18살로 바뀐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인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성인의 나이를 18살로 낮추었다는 것일 뿐, 해마다 열리는 성인식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입증하듯 NHK(1월 9일 보도)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성인식 나이를 몇 살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NHK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문의한 결과 전국에서 3개 시와 마을에서만 ‘18살 나이’를 따를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종전대로 20살을 대상으로 했다고 응답했다. 18살을 성인식에 참여시키지 못한 이유는 ‘수험생’이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종래대로 20살을 대상으로 성인식을 치렀다.”고 보도했다. 단, 18살을 대상으로 성인식을 기획한 오이타현 쿠니토시(大分県国東市), 미에현 이가시(三重県伊賀市), 미야자키현 미사토